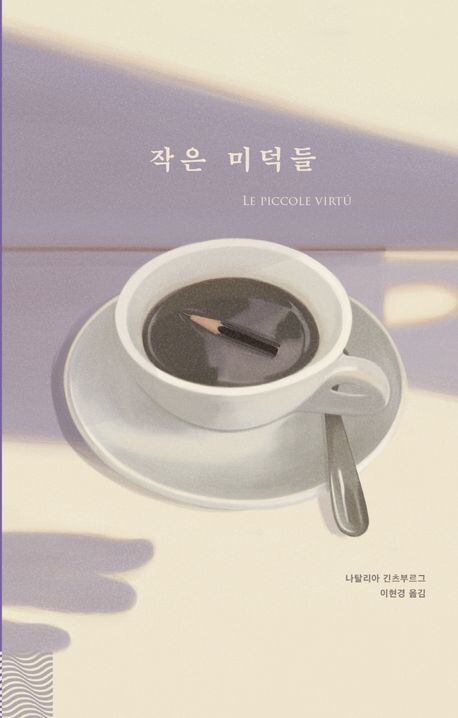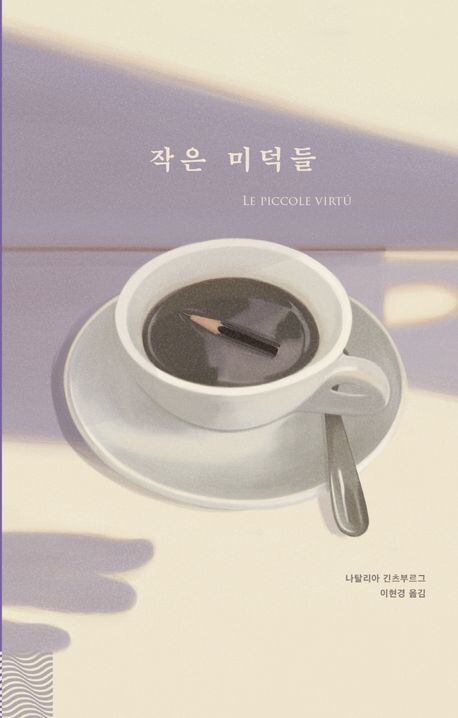작은 미덕들
나탈리아 긴츠부르그 지음, 이현경 옮김 l 휴머니스트(2023)
이탈리아 팔레르모의 유대계 가문에서 태어난 작가는 같은 유대인이자 반파시스트 활동가이며 에이나우디 출판사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레오네 긴츠부르그와 결혼하고, 2년 후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 아브루초 지방으로 추방된다. ‘아브루초에서의 겨울’은 그곳에서 보낸 3년간의 유형(망명) 생활을 기록한 글이다. 우리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마을 사람들의 근황을 접하고 작가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가 난로가 있는 방에 모여 쉰다. 전후 사정을 모르면 유형 생활이라고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작가는 에세이 말미에 이곳을 떠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 3년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에세이 ‘낡은 신발’은 아이들을 지방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로마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출판사 동료와 같은 방을 쓰며 밤마다 낡고 허름한 신발을 침대 아래 벗어놓는 두 사람이지만 작가는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신발을 신을 수 있길 바라는데, 그 이유가 ‘어쩌면 나중에 낡은 신발을 신고 걷는 법을 배우려면 어린 시절에는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을지도’ 몰라서다. 젖은 신발, 낡은 신발, 허술한 신발을 신어본 사람이라면 작가의 이 소망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발원하는지 짐작하고 마음이 일렁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작가가 이토록 아이들 생각에 애틋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간의 자식’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세대 사이 건널 수 없는 심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는 이전 세대 부모가 했듯이 자식 세대에게 똑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도망을 가거나 피신을 해야 해서, 또는 하늘을 찢을 듯한 요란한 공습 사이렌 소리 때문에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혔던 아이들에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가족 안의 사랑을 어떻게 일그러뜨리는지 보여주는 절절한 문장이다.
한때 ‘남자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기 힘들었고 글에서 내가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웠던’ 작가는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글 속 인물과 소재가 생기를 잃고 납작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작가로서도 성장과 분투를 나란히 겪은 이 여성이자 어머니이자 작가는 “이제 나는 남자처럼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토마토소스와 관련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담담히 진술한다.
에세이와 회고록 작가의 전범 비비언 고닉은 나탈리아 긴츠부르그의 ‘작은 미덕들’을 자신의 작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는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이 책을 처음 접한 고닉은 특히 수록 에세이 ‘나의 일’이 작가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었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어른인 이유는 우리 등 뒤에 죽은 사람이 조용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책 속 문장을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읽고 쓰는 여성인 이유는 우리 등 뒤에 긴츠부르그 같은 여성 작가가 조용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혜 소설가·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