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다프트 펑크가 될 수는 없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 <에덴: 로스트 인 뮤직>은 꽤 가혹한 실패담이다.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에덴: 로스트 인 뮤직
에덴: 로스트 인 뮤직
나는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다. 디제이들이 만드는 전자음악을 말하는 거다. 혹은 당신은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한 줄기인 ‘테크노’라는 이름으로 이 장르 전체를 총칭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렉트로니카는 춤추기 위한 음악이다. 당연히 클럽신과도 연관이 있다. 내가 일렉트로니카 음악에 빠진 건 영국에 살던 시절부터였다. 하우스메이트 중 두 명이 초보 디제이들이었고,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는 모조리 디제이들이었다. 그들을 따라 클럽에 갔다가 오감을 모조리 열어젖히는 음악적 세례에 도취된 나는 그렇게 주말마다 디제이들을 따라다니며 춤을 췄다.
특히 나와 친했던 디제이는 하우스메이트인 토마스였다. 그는 턴테이블과 엘피(LP)로 가득 찬 좁은 방에서 매일매일 디제잉을 연습했다. 낮에는 피자 배달을 하던 그의 꿈은 당연히 유명한 디제이가 되어 돈도 벌고 포르셰도 사고 중산층 동네에 집을 짓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죽을 때까지 파티를 즐기는 거였다. 나는 꼭 그러라고 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의 방에 가서 트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닥거려줬다. 그게 2002년이었다.
<에덴: 로스트 인 뮤직>은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첫 전성기를 맞이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20여년의 세월을 훑고 현재로 당도하는 영화다.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한 장르인 ‘개라지’를 좋아하던 주인공 폴은 친구 스탄과 ‘치어스’라는 이름의 디제이 듀오로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 일렉트로니카 음악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거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프트 펑크’의 데뷔 앨범이 나오면서 일종의 뉴웨이브를 열어젖히고 있었다. 치어스 역시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에 금세 질린다. 폴은 별로 벌어둔 돈도 없다. 그렇게 20년이 지난다.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어조로 20년을 ‘스윽’ 훑어나가는 <에덴: 로스트 인 뮤직>은 꽤 가혹한 실패담이다. 함께 친구의 하우스파티에서 음악을 틀던 ‘다프트 펑크’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슈퍼스타가 된다. 치어스는 여전히 2류 클럽에서 입에 풀칠할 돈만 받고 20년 전과 똑같은 음악을 튼다. 클럽 주인이 말한다. “이제 너네가 하는 음악은 구려. 좀 다른 장르를 해봐.” 폴은 고집이 세다. 그럴 생각이 없다. 자신의 재능을 믿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는 사실 재능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학교와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다. 어쩌면 당신의 서재에는 맬컴 글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어>가 꽂혀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1만 시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책이다. 정말?
몇해 전 잭 햄브릭 미시간주립대 연구팀은 노력과 재능의 관계를 조사한 88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놀랍다. 공부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겨우 4%였다. 이 수치를 보면서 나는 아침이고 밤이고 코피를 흘리며 공부를 하는데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쳐서 극장에 가곤 하던 나보다 언제나 성적이 형편없이 낮던, 그래서 나를 종종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고3 시절 친구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생각났다(이게 너무 오만하게 들리지 않기 위해, 나도 그리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걸 고백한다). 음악에서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21%, 스포츠는 18%였다. 결국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하다는 연구인데, 이쯤에도 나는 또 모차르트를 질투한 살리에리의 비명이 떠오르는 것이다. “신이시여!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디제이가 되고 싶어 낮에는 피자 배달을 하고 밤에는 클럽 한쪽에서 음악을 틀던 친구 토마스는 10여년을 디제이로 일하다가 몇년 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 그는 몇해 전 아이를 낳았고, 재작년 이혼을 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나는 얼마 전 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디제이는 계속할 생각 없어? 너는 음악 트는 걸 제일 좋아했잖아.” 답변이 돌아왔다. 글은 없었고, 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다. 아마도 ‘이제 딸을 키워야 하는 가장인데 답이 없는 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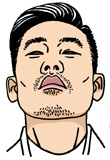 솔직히 말하자면 그 친구는 재능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음악을 틀던 클럽에 꼬박꼬박 가서 춤을 췄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절대 유명한 디제이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솔직히 말하자면 그 친구는 재능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음악을 틀던 클럽에 꼬박꼬박 가서 춤을 췄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절대 유명한 디제이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