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페킨파의 <어둠의 표적>이 시골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손톱만큼도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미개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동물적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어둠의 표적
어둠의 표적
호러 영화 속 시골은 지옥이다. 호러 장르에는 ‘시골 호러’라고 불러도 좋을 하부 장르가 하나 존재한다. 대도시에 살던 주인공들이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지역민, 혹은 시골에 숨어 사는 살인마에게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담는 장르다. 1970년대 슬래셔(난도질) 영화의 서막을 열어젖힌 <텍사스 전기톱 대살륙>과 웨스 크레이븐의 <왼편 마지막 집>이 대표적이다. 시골로 이주했다가 원초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는 지역민들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영화들도 꽤 있다. 샘 페킨파의 <어둠의 표적>과 존 부어먼의 <서바이벌>은 아마도 이런 장르에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끼친 영화일 것이다.
<어둠의 표적>의 주인공인 대도시 출신 더스틴 호프먼은 아내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다가 아내를 노리는 시골의 무식하고 포악한 남자들에 맞서서 총을 든다. <서바이벌>의 주인공들은 래프팅을 갔다가 지역 남자들에게 강간당하고 살육당한다. 이 두 영화가 시골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손톱만큼도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미개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동물적이다.
왜 하필 시골이냐고? 그건 1960~70년대 당대의 할리우드, 그리고 영화를 소비하는 도시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세계는, 특히 미국은 거의 완벽할 정도의 도시화를 마무리지었다. 미디어에 도시의 삶은 찬양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시골은 여전히 과거에 발을 묶인 미개와 비이성의 세계였다. 문명의 무의식은 언제나 매체에 그대로 반영된다. 할리우드는 영화를 소비하는 도시의 관객들에게 그들 무의식 속의 공포를 건드려 비즈니스를 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영화의 이야기 또한 당대 예술가들의 무의식의 반영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할리우드 ‘시골 호러’ 장르의 관습은 한국 장르 영화들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영화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주인공 여자는 섬 공동체에서 성적으로 짓밟히다가 결국 낫을 들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한다. 여기서 김복남의 낫이 향하는 곳은 그를 잔인하게 유린하던 남자들뿐만이 아니다. 그녀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방관하던 시골 할머니들도 처단의 대상이다. <구타유발자들>이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장르 영화들에서도 도시에서 찾아온 주인공은 시골 공동체, 혹은 시골에 숨어 사는 비이성적인 무리의 인간들과 맞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전남의 한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보며 시골 호러 장르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공개된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중 많은 비난은 기묘하게도 ‘섬’이라는 지역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있었다. 물론 그건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섬의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서울서는 묻지마 살인도 있는데, 그럴 거면 우리 섬에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섬 이미지 나빠진다”…. 이 말들은 뉴스를 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문제의 섬마을은 기괴한 공동체의식으로 뭉친 미개한 섬이 됐다. ‘시골 호러’ 장르의 살아 있는 무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하지만 방송은 결국 가장 귀에 꽂히는 발언들을 골라서 편집해 보여주는 통제된 미디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혐오를 찾아내야 한다면 그것은 지역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거나하게 술을 마시며 성폭행과 강간을 공모하는 악마들과 구타유발자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당연히 최근 성폭행 사건의 표적이 특정 지역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 사건의 표적은 도시와 시골에 관계없이 여성을 성적인 포식의 대상으로 삼는 남성들의 더러운 공모에 맞춰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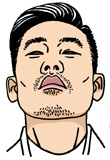 동시에, 나는 시골을 무대로 한 할리우드 호러 장르에 대해서도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둠의 표적>을 예로 들자. 시골 남자들에 맞서 싸우던 주인공은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샘 페킨파는 이 영화를 미개한 시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는다. 당신도 이 무시무시한 인간들과 결국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말하듯이, 영화에는 죄가 없다. 영화는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그 분노의 표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되어야 마땅하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동시에, 나는 시골을 무대로 한 할리우드 호러 장르에 대해서도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둠의 표적>을 예로 들자. 시골 남자들에 맞서 싸우던 주인공은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샘 페킨파는 이 영화를 미개한 시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는다. 당신도 이 무시무시한 인간들과 결국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말하듯이, 영화에는 죄가 없다. 영화는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그 분노의 표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되어야 마땅하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