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자동차는 2만9683대(완성차 5개 업체 기준)로 전년(2만9441대)과 거의 비슷했다. 전체 승용차 판매량(129만2850대)의 2.6% 수준이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은 10만대로 추정된다. 10년 전 정부가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내놓을 때만해도 전기차 시대는 매우 빠르게 올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는 언제쯤 열릴까?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각국의 환경 규제를 피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시장에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성장세가 매우 가팔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 조처는 각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을 ㎞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g당 95유로(약 12만3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기계공학부)는 “대폭 강화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규제로 일부 업체들은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수익 대부분을 내연기관차 판매로 충당해온 차 업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2년 앞당기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8만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량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폴크스바겐 쪽은 개의치 않은 태도다. 폴크스바겐은 전체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목표 비율을 지난해 1%대에서 올해 4%, 2025년 2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도요타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e-TNGA’ 플랫폼을 기반으로 6종의 순수 전기차를 선보이는 등 2025년까지 전 차종에 전동화 모델을 내놓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현대·기아차도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전기차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 10만대가량의 전기차를 팔아 점유율 7%로 테슬라(19%), 비야디(BYD·11%)에 이어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3위에 올랐다. 주요 업체들의 전기차 계획을 보면, 대체로 2025년을 목표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양한 차종의 출시와 시장 경쟁 구도 형성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내 전기차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회전시켜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친환경차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떠오른 차다. 무거운 배터리 중량과 긴 충전 시간, 일반 자동차의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 등 편의성과 경제성 문제로 보급이 더뎠을 뿐이다.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완성차 업체들의 개발 경쟁 등을 종합할 때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와 단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메이커의 전기차 개발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매년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완속충전기 지원금 폐지, 한전 특례요금 할인 종료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전 인프라도 아직 미흡하다. 최근 정부가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 기대치에 맞추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기술 진전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신차들의 등장은 전기차 시장의 무한확장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기술적 단점들이 개선되고 다양한 메이커의 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전기차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충전의 용이함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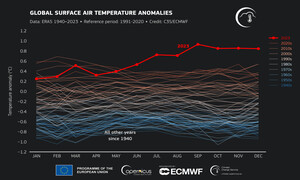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