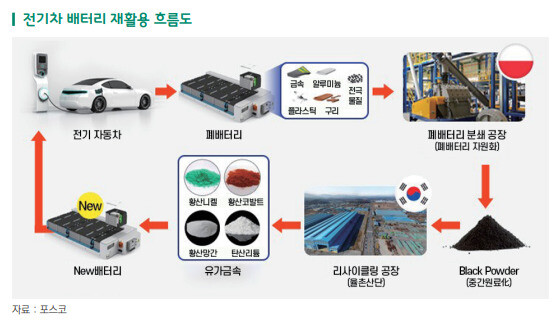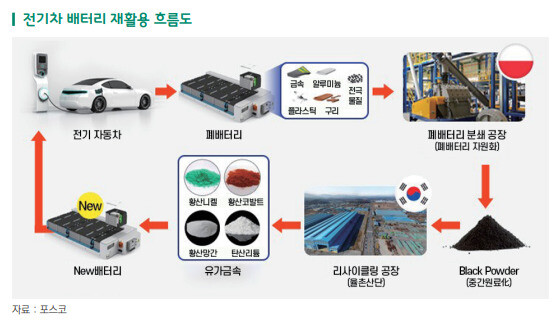전기차 ‘코나’에서 떼어 낸 배터리 모듈. 굿바이카 제공
유럽연합(EU)은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예고해놓고 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12%를 폐배터리에서 회수해 제조하도록 하는 식이다. 리튬·니켈 비율은 4%로 잡혀 있다. 2035년부터는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높아진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재활용 방식과 절차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배경의 하나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그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방식·절차 표준화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아우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꾸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참여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선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표준화 대응 방안과 국내외 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추적성 검증 방법을 포함해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전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김희영 연구위원은 이달 들어 펴낸 보고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서 “2011년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폐배터리 회수·처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며 “폐배터리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김 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능력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로 재활용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한 예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폐배터리에서 핵심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 97%를 회수 목표로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국에선 배터리 재활용 등록 기업이 4만개사를 웃돌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터리 규격·등록·회수·포장·운송·해체 등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시장조사 기관 에스엔이(SNE)리서치 추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폐기되는 전기차(BEV+PHEV)는 2025년 54만대에서 2030년 414만대, 2035년 1911만대, 2040년 4636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을 다한(초기 용량 대비 70~80%) 폐배터리는 2025년 42GWh에서 2030년 345GWh, 2040년 3455GWh로 8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