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중앙은행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리는 기후정책 입안자(climate policymaker)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직접 대처하는 정책 결정은 선출된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 명확한 입법 없이는 녹색경제를 촉진하거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이나 감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1일 새벽(한국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중앙은행에서 열린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콘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이 연설문은 연준 웹사이트에도 실려있다. 그는 또 “우리는 현행법이 부여한 목표와 권한을 고수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일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법에 근거한 목표·권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헤매지 말고 우리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가들의 몫이며, 연준의 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이다.
파월의 말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영란은행·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 수단에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을 표방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유럽을 선두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점차 기후변화 요소를 정책수단에 반영하는 추세다. 유럽중앙은행·영란은행은 녹색채권 매입을, 일본·싱가포르 중앙은행은 기후 관련 여신제도 신설을, 스웨덴·스위스 중앙은행은 자산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확대하고, 헝가리중앙은행도 금융기관 감독체계에 기후 요소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자국 금융·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주요 금융불안 요인’ 조사에서도 기후 리스크는 5대 불안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중앙은행법에 기후위기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대부분은 중앙은행 내부 규정이나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의결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금융·경제전문가 72명에게 물은 결과 ‘주요 금융불안 요인’으로 기후 리스크를 꼽은 비중은 2.8%에 그쳤다. 하지만 한은도 2021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대응 역할 강화’를 대내외에 거론해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에 낸 ‘2023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신제도(대출·담보 등)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2021년 10월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토 수단으로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 대상에 녹색채권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공개시장운영(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 담보 대상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이에스지 주식·채권 투자 확대 지속 등이 언급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은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공식 언급한 일은 없다. 다만 그는 지난해 4월 총재 후보자로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고,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대출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은 (운용)목표에 기후 위기 해결을 삽입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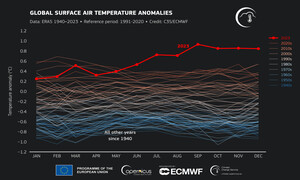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