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들의 배신이 시작됐다.”
‘무료서비스’를 앞세워 이용자들을 불러 모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최근 요금제를 개편하며 수익 개선에 나서자, 이용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진 무료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기존 요금제 단가를 높이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것이다. 수익을 떠나 ‘경험적 가치’를 판다던 플랫폼 기업들이 갑자기 ‘수금 본색’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최근 연이어 이용자들을 ‘배신’했다. 첫 번째는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출시해 ‘콘텐츠 품질을 위해 광고 없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경영 원칙을 깬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권장해온 계정 공유를 단속해 과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불거진 ‘넷플릭스 위기론’과 연관이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상반기 구독자가 117만명(1분기 20만명, 2분기 97만명)이 감소했다. 이 업체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11년만에 처음이었다. 구독자 감소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월 말 넷플릭스 주가는 하루 만에 약 35% 폭락하며 위기론이 고조됐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정책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였다. 1시간짜리 영상을 본다고 가정하면, 4~5분 분량의 광고를 보는 대신 ‘반값 요금’을 내는 조건이다. 한국 기준 요금은 월 5500원으로, 기존 스탠다드 요금제의 월 정액요금 1만3500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이 요금제로 4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766만명 증가하는 등 깜짝 효과를 봤다. 광고 없는 콘텐츠 운영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요금제 선택권이 늘어난 것이어서 큰 반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계정 공유 단속 예고에 대한 여론은 사뭇 달랐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계정(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며 공유를 권장해오다 갑자기 계정 공유를 단속해 과금을 물리겠다는 변심에 이용자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가구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유자 인증을 통해 계정 공유자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 가구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가상사설망(VPN)으로 아이피 주소를 속이는 편법도 있어 실제 단속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넷플릭스 이용자 중 42.5%가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답해 구독자 이탈 위험도 크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빅테크 플랫폼들의 비용 인상이 가속화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누리집 갈무리
아마존이 이 달 말부터 유료 ‘프라임 회원’의 배송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도 이용자들에겐 충격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유료 회원의 월 이용료를 12.99달러에서 14.99달러(연 기준 139달러·한화 약 17만원)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회원들의 배송요금까지 인상하며 수익 극대화에 나선 것이다.
요금 조정안의 핵심은 유료 회원의 식료품 주문 금액이 150달러(18만4천원) 미만이면 요금액수에 따라 최소 3.95달러부터 최대 9.95달러(5천~1만2천원)의 배송비를 따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미국 뉴욕 기준으로 주문액이 50달러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였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구매해도 4.99달러의 배송비만 지불했다. 1년 사이 연이어 진행된 요금제 개편으로 유료 회원들의 월 이용료와 배송비가 동시에 오르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된 꼴이다. 아마존이 밝힌 전 세계 프라임 회원 수는 약 2억 명이다.
이런 행보는 플랫폼 업계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져온 “사용자에게 이윤창출의 본색을 드러낸 플랫폼은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용자와 판매자를 잇는 양면 시장의 특성상 판매자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겐 색다른 경험을 강조하며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부른 글로벌 경제 위기와 플랫폼 성장세 둔화 분위기가 겹쳐지며 이런 불문율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아마존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막강한 시장 영향력이 꼽힌다. 아마존은 고객 주문을 예측해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구축해 미국이란 광활한 지역에서도 이틀 안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왔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이 4690억달러(574조 5천억 원)로,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41%를 점유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수많은 플랫폼이 완전 경쟁을 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점유율이 30% 고지에 오르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엣지 바이 에센셜(Edge by Ascential)’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미국 소매 환경 보고서’를 보면, 2026년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아마존의 소매시장 점유율이 14.9%로 ‘오프라인 절대 강자’ 월마트의 점유율 12.7%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온라인 소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아마존을 대체할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필연적인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이용자에게 호출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비를 인상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아마존과 비슷한 길을 간다고 평가받는 쿠팡은 지난해 유료 멤버십 비용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 인상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5만 9880원에 달한다.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에는 커지는 시장 영향력과 해마다 적자 폭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려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뒤 매 분기 매출 기준 20% 안팎의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 오면서도, 분기마다 2천억원 내외의 적자를 냈다. 주가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적극적인 실적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했다. 물론 경쟁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익일배송 서비스 때문에 금액을 올려도 회원 수 이탈이 적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쿠팡은 동시에 판매 수수료를 높이는 전략도 썼다. 배송 비용 인상 같이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 대신 반대 쪽의 판매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높여 수익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아마존과 달리 국내에선 네이버·에스에스지(SSG)닷컴 등과 경쟁 중이어서 이용자 부담을 직접 높이는 건 위험 부담이 컸다. 그 결과 지난해 판매자들 사이에서 쿠팡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명목의 판매장려금 강요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카카오티(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이용자에게 호출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비를 인상했다. 택시 기본요금에 3천원의 호출비가 붙는 방식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비의 절반을 가져간다. 심지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이 비싼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심결을 앞두고 있다.
배달 앱 시장의 60%가량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상반기,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판매자들의 반발을 샀다. 건당 주문 수수료 1천원과 배달료 5천원을 받던 ‘정액제’에서 음식값의 6.8%와 고객이 지급한 배송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포장 주문을 했을 때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올해 3월까지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플랫폼 수수료 인상의 여파가 도리어 음식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할인 프로모션’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으로 승자독식 우려가 크다. 10여 년 전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아마존과 이베이의 매출 격차는 30배 이상 벌어졌고, 국내 인기 플랫폼 쿠팡·배달의민족·무신사·카카오티 등의 점유율도 각각 2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비용 인상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유럽연합 등의 규제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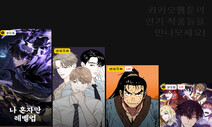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