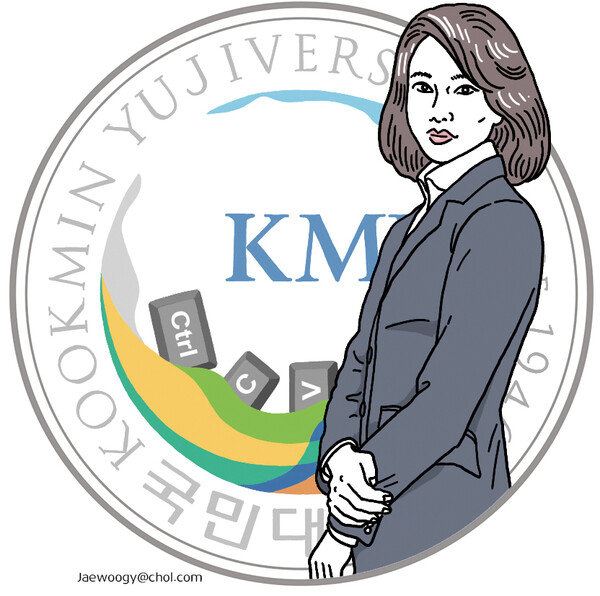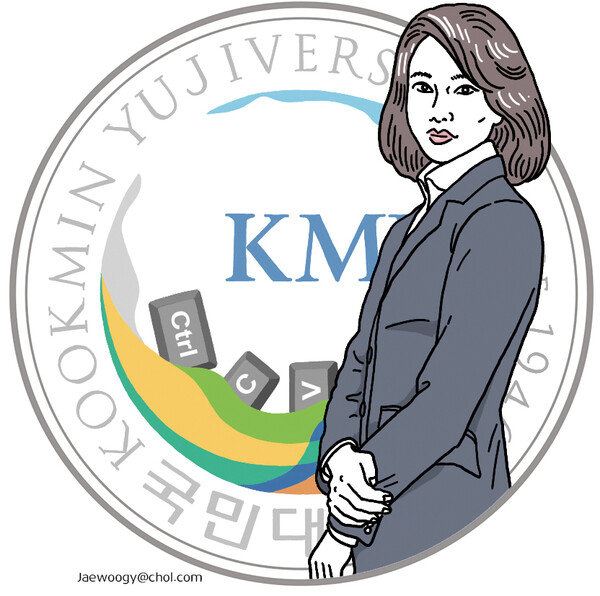미 육군 소속의 데니스 포크너는 테네시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이 대학의 우주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항공우주국(NASA·나사), 육군 등에 소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했다. 포크너의 학위 논문이 상당 부분 진척됐을 때,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가 정부의 기밀 사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포크너는 논문을 다른 주제로 새로 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지도교수인 프로스트 박사는 자신의 연구물을 내주며 이를 바탕으로 새 논문을 쓰도록 제안했다. 포크너는 이 연구물을 인용 없이 가져다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년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수의 문제 제기로 대학 당국은 포크너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포크너는 지도교수의 제안을 따랐을 뿐인데 학위를 취소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에게 표절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포크너가 자신의 능력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게 아님은 명백하다. 포크너는 교수를 방패막이 삼아 곤경을 피하려고 하지만 교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들의 유감스러운 실수는 쓰디쓴 열매를 맺고 말았다.”(테네시주 항소법원, 1994)
나아가 정부는 프로스트 교수와 포크너 등을 기소했다. 표절한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 등이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지적했다. “자격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것은 학위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 특히 학교의 명성을 해침으로써 학생을 모집하는 데 장애를 겪게 된다. 교수는 대학에 이 같은 손실을 끼치지 않을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제6연방항소법원, 1997)
이 사례는 아무리 원저자가 허락했더라도 표절은 표절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준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도 이 원칙을 상기시킨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김 여사 논문이 ㅇ사의 특허 사업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베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도 9천만원을 지원했다. 앞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국민대는 “특허권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크너 사례처럼 지도교수가 허락한 표절조차 표절로 판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학교 밖의 특허권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대학 쪽의 판단은 터무니없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