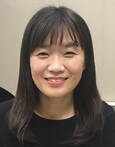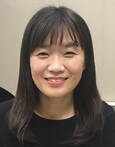은유 ㅣ 작가
필라테스 강습 시간에 선생님이 나에게 지구만한 고무공을 건네주며 말했다. “팔을 쫙 펴서 남편분 안듯이 꽈악 끌어안으세요.” ‘네? 아니, 왜요, 그다지 그러고 싶지 않….’ 운동기구에 누워 복부 근육에 힘을 주느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간 공을 놓칠 뻔했다. 나이 든 여성이라도 남편과 자식이 없기도 하다. 저 사랑 넘치는 이성애 가족 판타지를 대체할 표현이 없을까. 고양이? 나무? 베개 안듯이? 그냥 두 팔을 최대치로 늘이라고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다.
무심코 쓰는 일상어에 차별과 배제가 배어 있다. 청소년은 무조건 학생이고 고3이면 묻지도 않고 ‘수험생’이다. “공부하느라 힘들겠다”는 말을 위로로 건넨다. 탈학교 청소년, 비진학 학생, 특성화고생은 안중에 없는 존재다. 성인은 결혼-출산이란 이성애 생애주기로 초기값이 설정돼 있다. 나부터도 그랬다. 여성에겐 남친 있냐, 남성에겐 여친 있냐 무람없이 묻곤 했다. 이젠 상대의 성정체성을 고려해 ‘애인’ 있는지 묻거나 호구조사를 삼간다.
글쓰기 수업에서 성소수자 학인들과 깊게 만나면서 생긴 변화다. “나는 서른살 레즈비언입니다. 이 말을 하는 데 30년이 걸렸다”는 첫 문장의 좋은 사례로 기억한다. 연인이 동성이면 바깥에서 손을 잡거나 “자기야” 같은 친밀한 호칭으로 부를 때 눈치를 봐야 했다. 배우자가 아플 때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고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다. 내가 이성애자로 살면서 고민한 적 없는 성정체성 서사는 놀랍게도 나의 좁은 세계관과 한국의 낙후된 인권과 제도, 섬세하지 못한 언어와 표현의 문제를 드러냈다.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한 친구는 부모의 몰이해와 탄압을 글로 썼다. 네가 전에는 남자를 사귀었으니 여자를 만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 관계 맺는 성소수자가 딸이라면 부모의 충격도 이해가 간다. 성소수자가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두려움은 판단을 흐린다. 잘 모르면 얘기를 듣고 공부하며 알아가는 게 순리지만 이해는 멀고 분노는 가까워 대개는 자기 불안을 혐오로 방어한다.
글쓰기의 관점에서 나는 부모가 걱정하는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 치열한 과거가 보였다. 글로 써서 남들 앞에서 읽기까지 생각의 뒤척임, 단어 선택의 신중함, 자기부정과 인정의 반복을 견뎠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랑을 하는가. 자기를 알아가는 노력은 답도 없고 돈도 안 되고 힘에 부친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전문가에게 사는 법을 물어본다. ‘양성애자’라는 오염된 표상이 아니라 그 말이 편견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그가 발휘한 힘과 용기, 자기 배려의 의지를 생각하면 자식이 자랑스러울 일이다. 영화 <벌새> 주인공 은희도 양성애자인데 이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은희에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감독은 말했다.
섞여 살아야 배운다. 사랑도, 용기도, 글쓰기도.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평등권 차별의 침해행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삭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저기 지하철역 앞에는 성소수자 혐오 방송이 요란하다. 참 열심히들 혐오를 조장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꿋꿋하게 사랑을 살아낸다. 그 용기에 감화받고 전염된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글쓰기 수업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체감한다. 성정체성을 서슴없이 밝히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여자 학인의 ‘남친’이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최근엔 한 청년이 동성 애인을 소개했다. 이런 포부를 전하는 친구도 있다. “쌤, 저는 돈 많이 모을 거예요. 최초로 커밍아웃한 교사가 될 거예요. 잘릴 때를 대비해서 먹고는 살아야죠.(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