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티브이 ‘홍카콜라’에 출연한 홍준표 의원. ‘홍카콜라’ 갈무리
엠제트(MZ)세대는 기성 정치권이 청년 이슈를 대하는 ‘꼰대적 태도’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러면서 ‘솔직함’과 ‘호쾌함’을 내세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를 대할 때 ‘보여주기’에만 신경쓴다고 여겼다. 2후남1은 “정치권이 노인이나 여성, 지역 주민들을 대할 때는 타기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표를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는데 유독 청년을 대할 때는 태도가 다르다.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의 이목을 끈답시고 대학생 박성민씨를 최고위원에 지명했는데, 이 처사가 ‘답답하면 너희가 한번 해보든가’라는 식으로 보여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3초남3은 “청년 인재 발탁을 보면 정치권의 사고방식이 보인다. ‘요즘 젊은 애들 뭐 좋아해?’ 하고 물어서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 뽑아봐’ 그러고, 또 ‘요즘 애들 뭐 많이 해?’ 해서 ‘게임 많이 한다’고 하면 프로게이머 출신을 뽑고 그런다”며 “그렇게 뽑힌 젊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저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그냥 꼰대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홍준표 의원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도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홍 의원이 자신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찾아오는 등 청년을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후여6은 “홍 의원이 3~4년 전부터 2030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려고 유튜브 티브이(TV) ‘홍카콜라’를 하고, 최근에는 ‘버블’도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버블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티 계열사인 ‘디어유’가 지난해 2월 선보인 앱으로, 아이돌과 팬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다. 2초여1은 “홍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각종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댓글도 많이 달면서 청년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초남3은 “나이만 젊다고 청년 정책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20대가 짧고 직관적인 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여서 홍 의원의 평소 화법과 쉽게 조응할 수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2후여3은 “지금 10대나 20대 초반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 쇼츠, 틱톡 등과 같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영상을 쓱쓱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라서 쉽고 재밌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며 “홍 의원이 직관적으로 딱 와닿고 꽂히는 멘트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매체를 찾아서 활용하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는데, 홍 의원의 직설적인 스타일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2초남2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게 있는데,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선적이고 젠틀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다른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꼰대여도 좀 재미있는 꼰대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3초남5는 “호쾌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적어도 이 사람은 뒤통수는 안 치겠다 생각하게 됐다”며 “막말도 많이 하지만 그런 모습들에서 솔직함을 봤다. 정치에 대한 회의가 생겼는데, 그 솔직함이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집권 세력에 대한 강한 반감이 홍 의원 지지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여럿 나왔다. 2초남4는 “대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해 진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고, 2초남5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이들이 정권 교체라는 2030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홍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후여4는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들에게 맞불을 놓으려면 홍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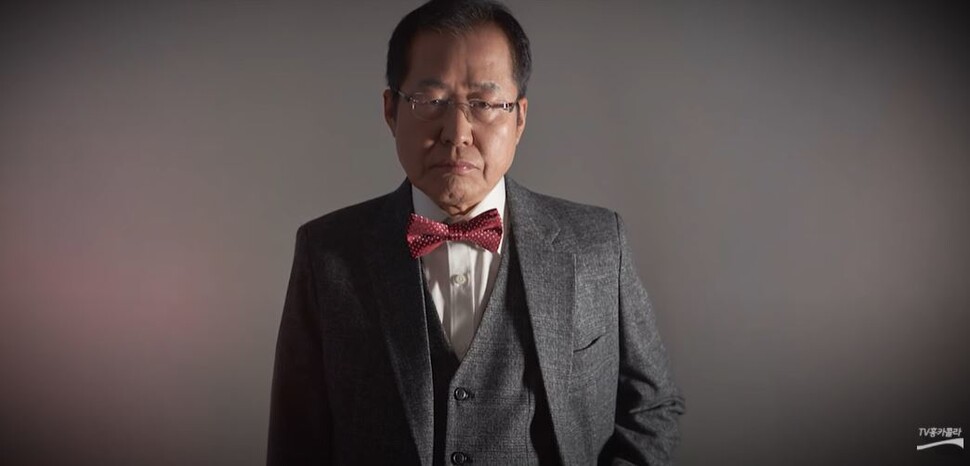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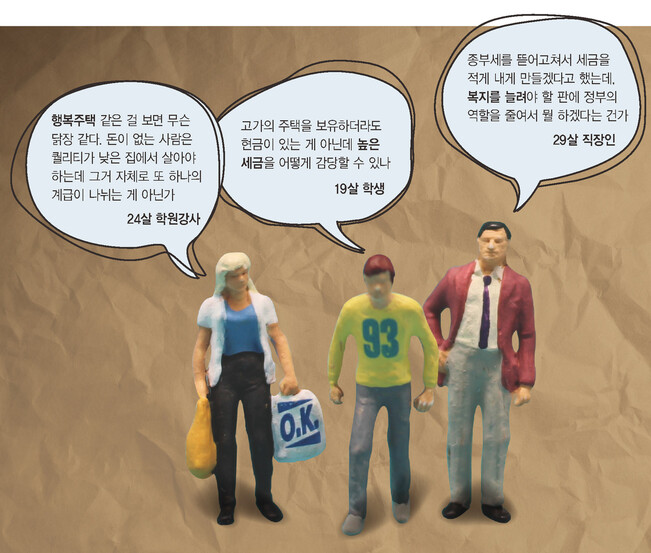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