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자신만만하게 제기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표류하고 있다. 채 총장 아들을 낳았다고 지목된 임아무개씨가 10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제 아이는 채 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기에 더 그렇다. 임씨는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했다.
사안 자체가 조선일보 칼럼이 비난한 바 있는 ‘하수구 저널리즘’의 소재냐 아니냐의 판단은 잠시 미뤄두자. 조선일보는 6일치 1면 첫 보도에서는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단정했고,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고 제목을 달았다.
 언론계에서는 치명적인 기사를 당사자들한테 확인하거나 반론을 받지 않고 실은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이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다. 조선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아이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이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다고 고백했다. 누구나 궁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 말이라면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언론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그 주장을 배척할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임씨의 항변을 ‘되치기’ 소재로 이용했다. 11일치 3개 면에 걸쳐 이 사건을 다루며 임씨 주장을 “비상식적”이라고 표현했다. 오히려 “임씨의 편지를 통해 본지의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채 총장과의 친분을 확인해줬다는 말이다.
‘한 법조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 썼다고 보기에는 편지의 문장이나 논리가 정연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기사에는 “아들의 아버지 채모씨 맞다”는 제목으로 임씨가 의혹을 시인한 것처럼 읽히도록 만들기도 했다. 11일에도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식구들에게도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임씨의 편지 내용을 머리기사 제목으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유전자 검사를 놓고도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였다. 결백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더니 채 총장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응수하자, 10일에는 “실현 가능성 불투명”, “법조계 ‘채, 대외 선전효과 크겠지만 실제론 시간 끌기용’”이라고 했다.
의혹 정도의 일을 사실로 단정하고,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아니라면 당신이 입증해보라’고 하고, 억울하다는 호소를 역공의 수단으로 삼는 게 언론의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 인터넷에서는 ‘채 총장의 아이’라는 사진이 나돈다.
언론계에서는 치명적인 기사를 당사자들한테 확인하거나 반론을 받지 않고 실은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이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다. 조선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아이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이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다고 고백했다. 누구나 궁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 말이라면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언론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그 주장을 배척할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임씨의 항변을 ‘되치기’ 소재로 이용했다. 11일치 3개 면에 걸쳐 이 사건을 다루며 임씨 주장을 “비상식적”이라고 표현했다. 오히려 “임씨의 편지를 통해 본지의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채 총장과의 친분을 확인해줬다는 말이다.
‘한 법조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 썼다고 보기에는 편지의 문장이나 논리가 정연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기사에는 “아들의 아버지 채모씨 맞다”는 제목으로 임씨가 의혹을 시인한 것처럼 읽히도록 만들기도 했다. 11일에도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식구들에게도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임씨의 편지 내용을 머리기사 제목으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유전자 검사를 놓고도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였다. 결백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더니 채 총장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응수하자, 10일에는 “실현 가능성 불투명”, “법조계 ‘채, 대외 선전효과 크겠지만 실제론 시간 끌기용’”이라고 했다.
의혹 정도의 일을 사실로 단정하고,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아니라면 당신이 입증해보라’고 하고, 억울하다는 호소를 역공의 수단으로 삼는 게 언론의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 인터넷에서는 ‘채 총장의 아이’라는 사진이 나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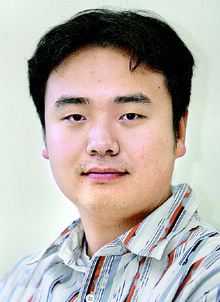 11일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 출연자는 “아이 사진을 봤다”며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생각날 정도로 채 총장을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신문의 대표 논객인 김대중 고문은 2009년 칼럼에서 탤런트 장자연씨의 죽음에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풍문에 대해,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부터가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최원형 기자circle@hani.co.kr
11일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 출연자는 “아이 사진을 봤다”며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생각날 정도로 채 총장을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신문의 대표 논객인 김대중 고문은 2009년 칼럼에서 탤런트 장자연씨의 죽음에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풍문에 대해,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부터가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최원형 기자circle@hani.co.kr
조선일보 9월6일치 1면
최원형 기자
연재현장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