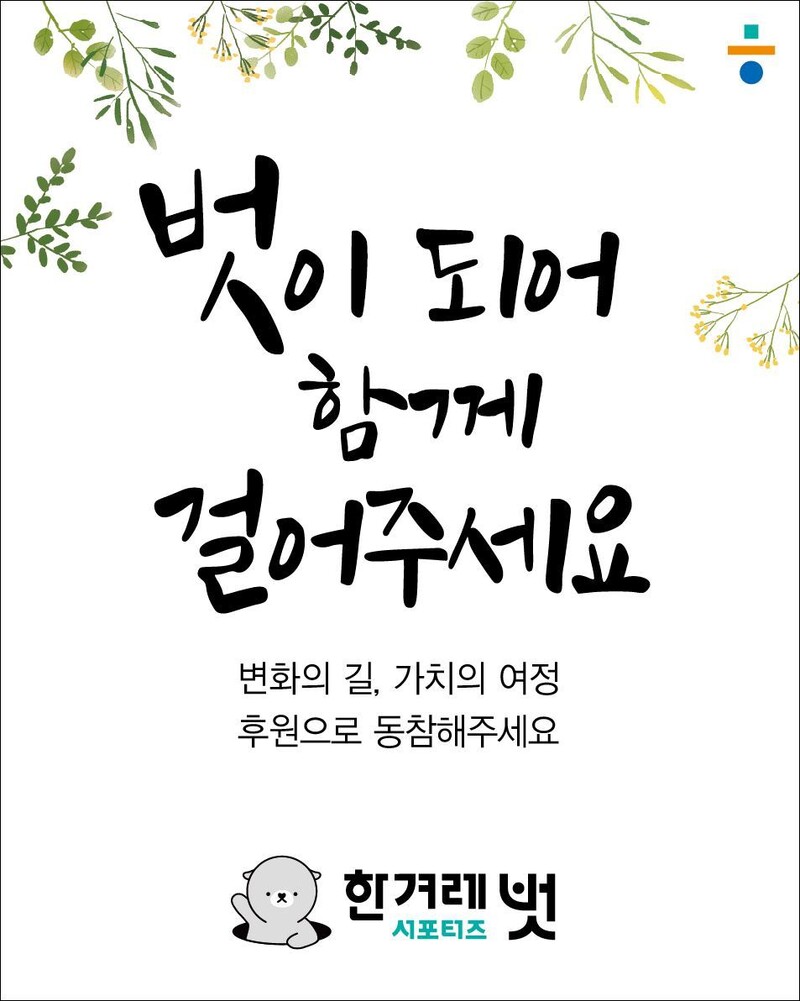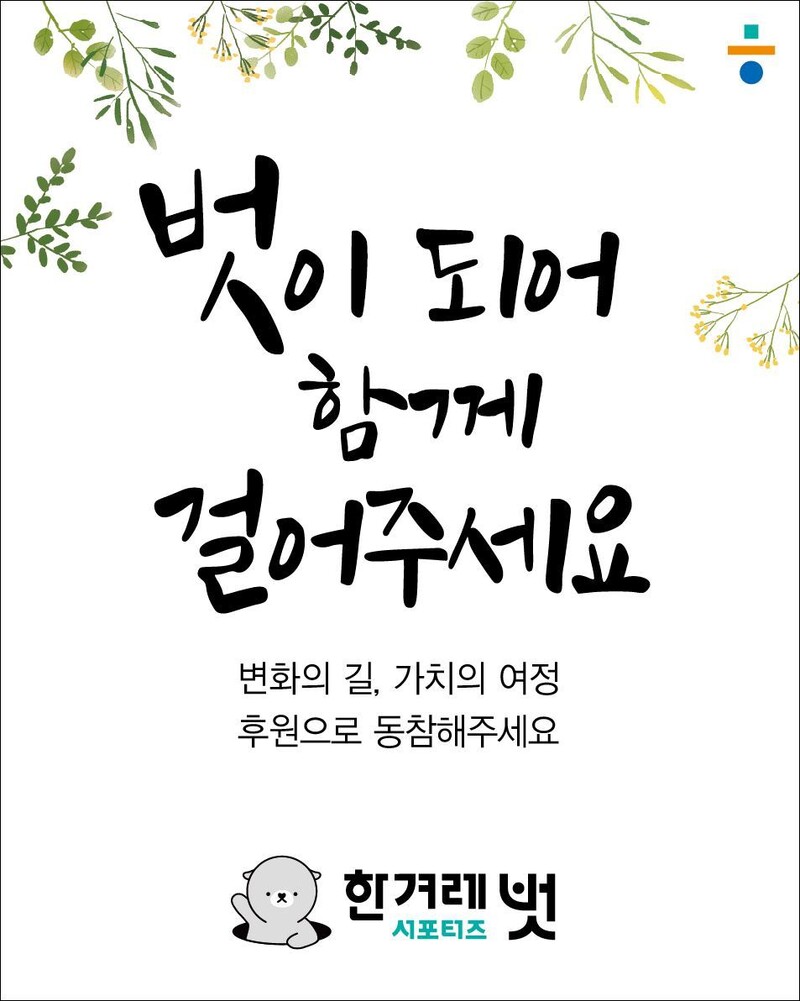<한겨레> 후원회원 벗과 통화합니다. 우리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 말이 빌 법한 공간에 여지없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로 채웁니다. 무엇이 고마운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구태여 말하긴 어딘지 멋쩍고, 이미 나누는 말 마디마다 녹아 있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때. 대여섯번쯤 고마움을 나누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서야 전화를 놓습니다. 마음은 역시 뭉클합니다. 또한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겨리입니다. <한겨레> 후원회원 서포터즈 벗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벗의 벗’이라고 자칭합니다. 아직은 겨리도, 서포터즈 벗도 낯선 독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겨레>가 후원회원제를 합니다. 정기후원, 일시후원, 주식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과 동시에 <한겨레> 누리집에서 후원회원이 됩니다. 후원회원은 누리집에서 후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자와 이슈를 지정해 더 쉽게 디지털 구독도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으로 (거의 매일) 소통합니다. ‘겨리노트’(다이어리)와 ‘한겨레 탐사보도작품집’을 드립니다. 번개 치듯 마련하는 행사(요즘은 6월19일 김수영 시인 집터 답사 신청을 받아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은 그러므로 <한겨레>와 벗이 좀 더 친해지는 일입니다. ‘뭐 해?’ 툭 던지듯 메시지 보내고, ‘보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처럼. 그래서 벗, 입니다.
후원회원제를 열며 줄곧 생각했던 건 그런 ‘친교’의 의미였어요. 언론사와 독자, 무엇보다 디지털 독자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 아시겠지만 <한겨레> 기사는 대개 덜 달고 덜 짭니다. 몇 개월의 시간과 적잖은 자원을 들여 내놓은 대표 콘텐츠는 복잡하고 답하기 쉽지 않은 현장의 모습과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숱한 기사가 급하게 쏟아지고 빠르게 사라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눈에 덜 띕니다. 생존을 고민합니다. 사실 <한겨레>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진지한 저널리즘을 고민하는 세계 모든 언론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자극적으로 쓰자!’는 시민 모금으로 만든 공공재 언론 <한겨레>의 길일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5월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 후원회원제(한겨레 서포터즈 벗)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우열 경남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이봉현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다시 시민, 디지털 독자를 제대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독자와 주주 13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현안을 장기취재한 심층보도, 이슈의 맥락을 짚는 해설기사를 가장 보고 싶은 콘텐츠로 꼽았어요. 속보를 선택한 비중은 가장 낮았고요.(
<한겨레> 5월17일치 9면)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 여전히 그런 독자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혐오와 냉소를 한사코 거부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싶은 독자, 오늘 내가 느낀 기쁨과 슬픔이 실은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한 독자, 예민하게 이웃과 지구의 안녕을 생각하는 독자. <한겨레> 서포터즈 벗은 그런 디지털 독자를 찾아나서는 일입니다. 같이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고 짓기 위해 애쓰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서포터즈 벗을 두고 “저널리즘의 본질에 충실한 고백”(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라고 평가(
<한겨레> 6월1일치 8면)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서포터즈 벗을 시작하고 아직은 짧은 시간, 벌써 꽤 많은 벗이 각자의 후원 이유를 적고 벗이 됐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언론이 되어달라”고, “다양성과 유연성을 겸비해달라”고, “클릭 낚시질하지 않는 언론으로 남아달라”고 바라며 후원한 벗들이 있었습니다. 바라줘서 고맙습니다. 바람을 안고 <한겨레>는 더 나은, 그러니까 같이 선 것만으로도 뿌듯할 정도로 멋있는 저널리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밥 제때 먹으라”고 걱정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해준 벗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멋쩍음과 ‘말 안 해도 알잖아’ 같은 마음을 견디고, 벗한테 고마운 이유를 적고 말았습니다.
겨리 기자
supporter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