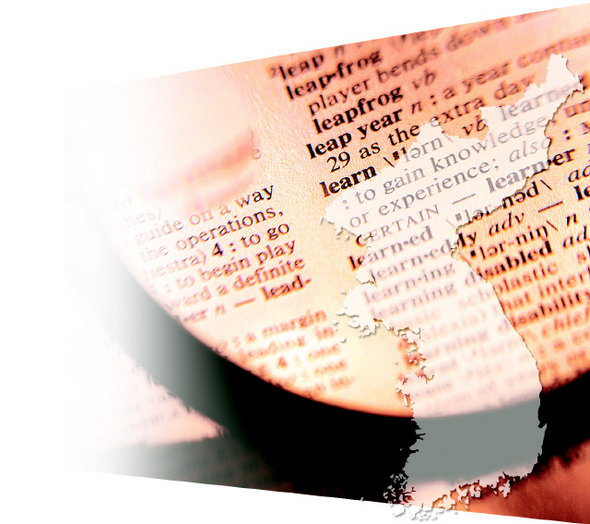
‘영어=국력’ 정말 그럴까?
“통상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이 차이가 난다.” 지난달 31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이다. 하루 전날 발표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는 영어 실력이 곧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그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책의 정당성을 ‘국가경쟁력’에서 찾는 모양새다. 정말 그런가?
■ 영어, 국가경쟁력인가?=새 정부 영어 교육 정책의 문제는 영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영어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에 둔다는 데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영어 공용화론이 한창이던 90년대 후반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중국이 급부상하고 세계 곳곳에서 신흥강국이 생겨난 지금은 대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어보다 현지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낸 ‘주요 지역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02년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던 미국은 2003년부터 중국에 밀렸다. 2002년에 아시아ㆍ중남미 지역과 북미ㆍ유럽 지역의 수출액 차이는 229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810억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형근 유엔미래포럼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시장이 크면서 영어 공용화론이 쑥 들어갈 정도로 영어의 영향력이 줄었다”며 “영어를 국가경쟁력이라고 보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낡은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영어 교육 정책이 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 노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중국인들처럼 한자를 발음하려던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실용적이기보다 이념적인 성격이 짙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은 “영어 구사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겠느냐”고 되물었다.
① 국제적 위상변화…영어보다 현지어 필요성 커져
② 생활영어 수준 대화 한다고 ‘글로벌’ 인재’ 되나
③ 말하기 집중정책 문제…읽기·쓰기 중요성 간과 ■ 생활영어가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나?=영어 교육의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말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어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인수위가 밝힌 것은 ‘모든 학생이 고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다. 진중권 교수는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안부를 묻는 수준의 회화를 한다는 게 국가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SERI) 연구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한 뒤 “인수위의 영어 교육 정책은 국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관광객을 만났을 때 무리 없이 대화할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며 “국제무대를 누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발표와 토론 등 생각과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급 회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인수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영어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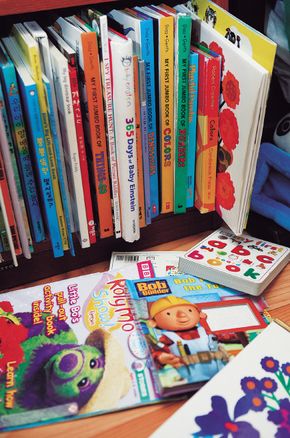 ■ 말하기가 경쟁력의 전부인가?=외국인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교육을 ‘단죄’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영어교사모임 이동현 사무국장은 “외국인을 만나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영어로 된 문헌을 읽는 게 더 요긴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수업이 뿌리내린 것도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더구나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만큼 읽기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수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이충현 교수는 “고급 정보는 영어로 된 게 많아서 읽기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며 “읽기ㆍ듣기ㆍ말하기ㆍ쓰기 등 언어 기능 넷 모두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영어 교육의 개선을 위해 4조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에 초점을 둔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말하기가 경쟁력의 전부인가?=외국인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교육을 ‘단죄’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영어교사모임 이동현 사무국장은 “외국인을 만나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영어로 된 문헌을 읽는 게 더 요긴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수업이 뿌리내린 것도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더구나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만큼 읽기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수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이충현 교수는 “고급 정보는 영어로 된 게 많아서 읽기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며 “읽기ㆍ듣기ㆍ말하기ㆍ쓰기 등 언어 기능 넷 모두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영어 교육의 개선을 위해 4조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에 초점을 둔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② 생활영어 수준 대화 한다고 ‘글로벌’ 인재’ 되나
③ 말하기 집중정책 문제…읽기·쓰기 중요성 간과 ■ 생활영어가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나?=영어 교육의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말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어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인수위가 밝힌 것은 ‘모든 학생이 고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다. 진중권 교수는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안부를 묻는 수준의 회화를 한다는 게 국가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SERI) 연구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한 뒤 “인수위의 영어 교육 정책은 국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관광객을 만났을 때 무리 없이 대화할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며 “국제무대를 누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발표와 토론 등 생각과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급 회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인수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영어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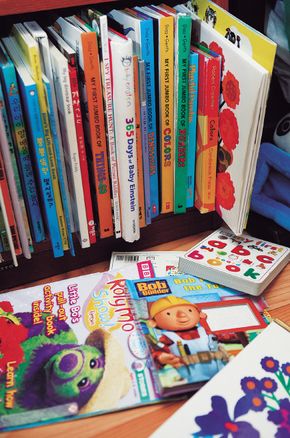
‘영어=국력’ 정말 그럴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