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함께하는 교육] 우리말 논술 /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난이도 수준-고2~고3]
1871년, 일본 외무장관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으로 떠났다. 여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48명의 관료가 끼어 있었다. 하나같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높은 관리들이었다. 게다가 무리에는 59명의 유학생들까지 따라붙었다. 이들은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들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그 후, 이들은 일본을 서구열강에 버금가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다. <대국굴기>는 왠지 이와쿠라 사절단의 ‘중국판 현대 버전’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책은 중국 국영 중앙 방송국(CCTV)의 다큐멘터리를 글로 풀어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전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위대한 신문화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글머리에서부터 책은 비장함을 풍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각국,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여 그들의 경험을 거울삼고 교훈을 얻어야 한’단다. 한마디로, 중국이 우뚝 서려면(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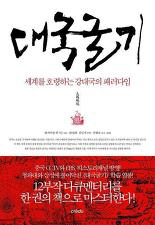 起),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영’ 방송국은 각 나라의 어떤 점을 인상 깊게 바라보았을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가장 먼저 바다를 차지하고 세상을 주름잡았던 나라다. <대국굴기>는 그들의 장점을 ‘자유로운 인력 시장’과 ‘막힘 없는 돈의 흐름’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보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나라는 에스파냐다. 하지만 정작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배를 다루는 기술은 포르투갈에서 배웠다. 항해에 드는 돈은 어땠을까? 에스파냐 왕실이 밑천을 대기는 했지만, 이는 제노바 상인들이 빌려준 것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곳 야구장에는 미국인들만큼이나 외국인 선수들로 넘쳐난다. 사람과 돈의 자유로운 흐름은 최고를 이끌어 내곤 한다. 개혁개방에 힘을 쏟는 중국에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사례는 솔깃할 수밖에 없겠다.
起),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영’ 방송국은 각 나라의 어떤 점을 인상 깊게 바라보았을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가장 먼저 바다를 차지하고 세상을 주름잡았던 나라다. <대국굴기>는 그들의 장점을 ‘자유로운 인력 시장’과 ‘막힘 없는 돈의 흐름’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보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나라는 에스파냐다. 하지만 정작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배를 다루는 기술은 포르투갈에서 배웠다. 항해에 드는 돈은 어땠을까? 에스파냐 왕실이 밑천을 대기는 했지만, 이는 제노바 상인들이 빌려준 것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곳 야구장에는 미국인들만큼이나 외국인 선수들로 넘쳐난다. 사람과 돈의 자유로운 흐름은 최고를 이끌어 내곤 한다. 개혁개방에 힘을 쏟는 중국에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사례는 솔깃할 수밖에 없겠다.
네덜란드 또한 중국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나라다. 작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누르고 세상을 주름잡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이유를 ‘국가의 강력한 지도력’에서 찾았다. 1500년대, 네덜란드 상인들은 해외 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제 살 깎아먹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네덜란드는 상인들의 자잘한 재산을 모아 커다란 기업을 만들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 회사는 각자가 내놓은 돈만큼 이익을 가르는 최초의 주식회사이기도 했다. 국가는 동인도회사에서 번 돈에서 세금을 거두어갔다. 그러니 회사의 운명과 국가의 발전을 따로 떼놓기 어려웠다. 온 나라가 나서서 무역이 커나가도록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또 어떤가. 19세기 후반, 일본은 ‘웅비해외론’(雄飛海外論)을 앞세웠다. 이는 ‘만 리의 파도를 뚫고 나가 온 세상에 국위(國威)를 드높인다’는 뜻이다. 아시아를 차지하려고 서양의 힘센 국가들이 몰려들던 시절, 일본은 ‘각국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세워야만 했다. 먹히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은 일본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 테다. 러시아는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로 우뚝 선 경우다. 1927년, 소련의 스탈린은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1년에 평균 9% 이상 경제를 키워서 강대국이 된다는 벅찬 계획이었다. 스탈린은 모든 힘을 공장을 짓고 무기를 만드는 데 쏟았다. 소련 곳곳은 커다란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스탈린그라드(지금의 볼고그라드)에는 불과 10개월 만에 트랙터 공장이 들어서고, 언 땅에 숲밖에 없던 쿠즈네츠크에 1000일 만에 철강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 그 결과, 소련은 10여년 만에 세계 2위의 공업국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국굴기>에 소개된 나라 가운데는 이미 무너진 나라들도 적지 않다. 여전히 잘나가는 국가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다. 책은 실패의 이유도 꼼꼼하게 챙기며 생각하도록 이끈다. 에스파냐는 왜 무너졌을까?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허세’ 탓이다. 에스파냐는 유럽의 가톨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때문에 자기 땅에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는 사실을 참지 못했다. 결국,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에스파냐 밖으로 쫓겨났다. 그 후 에스파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랍인과 유대인들은 장사에 뛰어난 이들이었다. 이들이 사라지자 상거래는 삐걱댔다. 해외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에 이만큼 큰 손해도 없다. 일본은 결국 ‘각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매달리다가 망하고 말았다. 일본은 군사력을 끊임없이 키웠다.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은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쟁은 더 큰 싸움을 부를 뿐이었다. 일본 경제는 다툼에서 진 나라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식으로 굴러갔다. 하지만 ‘전쟁중독’의 끝이 좋았을 리는 없다.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의 기초가 허약한데 공장만 많이 지으면 뭐하겠는가. 이미 스탈린 시절에도 ‘세계 2위 공업국가’ 소련에는 굶주리는 이들로 넘쳐났다. 농사짓는 데 드는 일품과 자원을 공업으로 빼돌린 탓이었다. 권력 가진 이들에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 불행한 시민들이 모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경우는 없다. 소련은 ‘진흙 발을 한 거인’에 지나지 않았다. 흙더미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태어난 지 벌써 61년이 되었다. 새로운 중국은 이미 굴기한 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빠르게 자라나는 중이다. 역사를 되씹으며 교훈을 찾는 자세는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다. 중국인들은 앞서 흥하고 망했던 나라들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할까? 중국의 미래가 궁금하기만 하다. 시사브리핑 201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61번째 맞는 건국일이었다. 이날 중국은 달 탐사선 ‘창어 2호’를 발사하는 등 커진 국력을 뽐내며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1871년, 일본 외무장관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으로 떠났다. 여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48명의 관료가 끼어 있었다. 하나같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높은 관리들이었다. 게다가 무리에는 59명의 유학생들까지 따라붙었다. 이들은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들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그 후, 이들은 일본을 서구열강에 버금가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다. <대국굴기>는 왠지 이와쿠라 사절단의 ‘중국판 현대 버전’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책은 중국 국영 중앙 방송국(CCTV)의 다큐멘터리를 글로 풀어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전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위대한 신문화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글머리에서부터 책은 비장함을 풍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각국,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여 그들의 경험을 거울삼고 교훈을 얻어야 한’단다. 한마디로, 중국이 우뚝 서려면(굴기:
〈대국굴기〉왕지아펑 등 지음/김인지, 양성희 옮김 /크레듀
네덜란드 또한 중국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나라다. 작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누르고 세상을 주름잡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이유를 ‘국가의 강력한 지도력’에서 찾았다. 1500년대, 네덜란드 상인들은 해외 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제 살 깎아먹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네덜란드는 상인들의 자잘한 재산을 모아 커다란 기업을 만들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 회사는 각자가 내놓은 돈만큼 이익을 가르는 최초의 주식회사이기도 했다. 국가는 동인도회사에서 번 돈에서 세금을 거두어갔다. 그러니 회사의 운명과 국가의 발전을 따로 떼놓기 어려웠다. 온 나라가 나서서 무역이 커나가도록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또 어떤가. 19세기 후반, 일본은 ‘웅비해외론’(雄飛海外論)을 앞세웠다. 이는 ‘만 리의 파도를 뚫고 나가 온 세상에 국위(國威)를 드높인다’는 뜻이다. 아시아를 차지하려고 서양의 힘센 국가들이 몰려들던 시절, 일본은 ‘각국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세워야만 했다. 먹히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은 일본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 테다. 러시아는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로 우뚝 선 경우다. 1927년, 소련의 스탈린은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1년에 평균 9% 이상 경제를 키워서 강대국이 된다는 벅찬 계획이었다. 스탈린은 모든 힘을 공장을 짓고 무기를 만드는 데 쏟았다. 소련 곳곳은 커다란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스탈린그라드(지금의 볼고그라드)에는 불과 10개월 만에 트랙터 공장이 들어서고, 언 땅에 숲밖에 없던 쿠즈네츠크에 1000일 만에 철강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 그 결과, 소련은 10여년 만에 세계 2위의 공업국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국굴기>에 소개된 나라 가운데는 이미 무너진 나라들도 적지 않다. 여전히 잘나가는 국가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다. 책은 실패의 이유도 꼼꼼하게 챙기며 생각하도록 이끈다. 에스파냐는 왜 무너졌을까?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허세’ 탓이다. 에스파냐는 유럽의 가톨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때문에 자기 땅에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는 사실을 참지 못했다. 결국,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에스파냐 밖으로 쫓겨났다. 그 후 에스파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랍인과 유대인들은 장사에 뛰어난 이들이었다. 이들이 사라지자 상거래는 삐걱댔다. 해외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에 이만큼 큰 손해도 없다. 일본은 결국 ‘각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매달리다가 망하고 말았다. 일본은 군사력을 끊임없이 키웠다.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은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쟁은 더 큰 싸움을 부를 뿐이었다. 일본 경제는 다툼에서 진 나라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식으로 굴러갔다. 하지만 ‘전쟁중독’의 끝이 좋았을 리는 없다.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의 기초가 허약한데 공장만 많이 지으면 뭐하겠는가. 이미 스탈린 시절에도 ‘세계 2위 공업국가’ 소련에는 굶주리는 이들로 넘쳐났다. 농사짓는 데 드는 일품과 자원을 공업으로 빼돌린 탓이었다. 권력 가진 이들에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 불행한 시민들이 모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경우는 없다. 소련은 ‘진흙 발을 한 거인’에 지나지 않았다. 흙더미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태어난 지 벌써 61년이 되었다. 새로운 중국은 이미 굴기한 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빠르게 자라나는 중이다. 역사를 되씹으며 교훈을 찾는 자세는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다. 중국인들은 앞서 흥하고 망했던 나라들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할까? 중국의 미래가 궁금하기만 하다. 시사브리핑 201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61번째 맞는 건국일이었다. 이날 중국은 달 탐사선 ‘창어 2호’를 발사하는 등 커진 국력을 뽐내며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