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네 살 아래 누이인 백인순(가운데)씨가 계성여고 2학년 때 동무들과 교정에서 찍은 사진.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피난 생활로 어릴 적 사진이 한 장도 없는 필자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학창시절 사진이다. 그나마 학비를 다 내지 못해 졸업장은 받지 못했다.
백기완-나의 한살매 12
나는 요즈음도 한밤이건 새벽이건 전화를 드는 버릇이 있다. 일흔이 넘은 계집애 애루(동생)한테 “야 인순아 나야, 한가락 뽑으라우!” 그러면 “알았어!” 하고는 전화로 노래를 부른다.
거의가 ‘오빠생각’이다. 내가 ‘푸른 하늘 은하수’, 애루가 ‘봄날은 간다’, 내가 ‘으악새’, 애루가 ‘일송정’을 부르고자 ‘일~송~’ 그러기만 하면 내 두 볼에서는 어느덧 냇물이 줄줄줄 ….
인순이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 초등학교 때 이흥렬 선생이 “너는 소리를 타고났다” 그랬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인순이가 1학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운동회가 있던 날이다.
“오빠, 나 오늘 달리기 으뜸 할 거그든, 그러면 뭐 사줄래?” “뭐든지지.” “그럼, 나 곡마단 보여줘, 솜사탕도 하나?” “그거야 뜸꺼리(문제)도 아니지!” 그랬는데 이런 날떨구(날벼락)가 있을까. 참말로 으뜸을 해갖고 나를 찾아온다.
운동장 왼쪽으로 오면 나는 바른쪽, 바른쪽으로 오면 나는 왼쪽. 마침내 오빠를 부르며 목메어 운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때가 왔다. 곡마단을 알리는 말뚝을 메고 다니면 거저 보여준다는 것이다. 잽싸게 둘러메 곡마단은 보여주었다. 그런데 솜사탕은 어쩐다? 또 냅다 달아났다. 애루는 울면서 따라오고.
그러던 애루를 두고 서울로 오던 날이다.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우리 오빠 맨발로 서울 가시며/ 축구선수 돼 가지고 오신다더라.’
어머니가 도토리묵도 못 싸주고 풋대추 세 알만 주시는 걸 갖고 서울엘 와 나는 사랑하는 애루를 목메어 부르곤 했는데 갸가 38선을 넘어 서울엘 왔단다. 1947년이었다.
달려갔더니 우리 인순이가 “오빠!” “엉 인순아!” 한참 껴안고 울며 불렀다. 그런데 인순이가 웬 애를 업고 있다. “그 어린애는 누구지?” 할머니네 애란다. 그때 남대문 뒷골목에는 마음씨 고운 백씨 할머니가 계셨다. 글파(공부) 잘하는 금순이 고모도 있고. 갈 데가 없는 언니(형)가 애루를 그 할머니네 집엘 맡겼는데 “오빠, 아버지는 어디 계셔? 나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며 울먹인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 따졌다. “야 아바이, 인순이가 왔는데 그래도 눌데(방) 하나 못 얻네.” “고마이 있으라우.” 또 그러시기를 한 달. 우리 집은 남북으로 갈리다가 서울에서도 또 넷으로 갈리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것보다 먼저 내 힘으로 눌데를 하나 얻으려고 닥치는 대로 막일을 했다. 얼마 만에 돈 만원을 만들어 쪼매난 눌데를 얻었다. 내 힘으로 뿔뿔이 헤어졌던 우리가 하나 되던 날, 인순이와 나는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모른다. ‘우리 오빠 맨발로 서울 가시며~’ 하지만 그 집도 몇 달 만에 쫓겨나고 정릉 왕씨 집에 빌붙었을 적이다. 아버지도 언니도 보름이 지났는데도 오시질 않았다. 아버지를 찾던 인순이가 꺼떡꺼떡 존다. “너 배고프네?” 아침부터 굶었는데도 “아니!” “그럼, 너 엄마가 보고 싶으네?” “보고 싶어도 참아!” 그 말에 갑자기 왈칵, 안집에서 오이지 세나를 훔쳐다가 그 짠 것을 와작와작. 오빠, 어디 좀 다녀온다며 남산까지 와서 퍽 쓰러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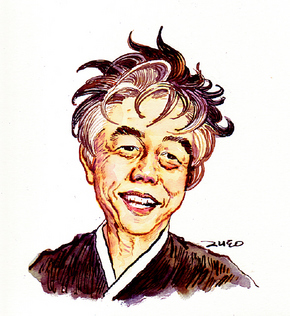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어느 중학생이 “저, 빌뱅이 보라”며 이죽댄다. 나는 누운 채로 “야, 빌뱅일 보려고 하면 똑똑히 봐 임마.” “어떻게 하면 똑똑히 보는 거냐”고 고개를 숙일 때 나는 대뜸 끌어안았다.
“빌뱅이한테는 나누어 먹는 거야 이 새끼야, 안 내놔!” “뭘?” “도시락이지 딴 거가.”
거기서부터 나는 ‘눈물의 주먹’이라는 덧이름(별명)이 붙고 말았다. 하루는 “눈물의 주먹한테는 견줄 놈이 없다드라”는 말을 듣고 힘꼴이나 쓰는 놈이 붙잔다. “그래, 좋다”고 일어서려다 한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눈물의 주먹, 아무것도 아니구먼. 야 임마, 눈물이나 보여!” 그런다. “내 눈물을 보고 싶다고, 여기 있잖아, 임마!” 그러자 “뭐가?” 그러는 때박(순간), 그냥 우지끈 “이게 내 눈물이야 이 새끼야” 하고 보낸 뒤 나발(소문)이 돌았다.
“남산 눈물의 주먹은 힘은 안 쓰고 눈물만 쓴다더라.”
나는 그때 참말로 주먹쟁이가 되고자 했다. 우리 인순이를 생각하면 모자 쓴 애들은 그저 몽땅 꼬꾸라뜨리는 깡패.
나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 외쳤다. “야 이 새끼들아, 다 나와!” 하지만 나하고 붙자는 애가 하나도 없는 게 그리 서운할 수가 없었다. 통일꾼
어느 중학생이 “저, 빌뱅이 보라”며 이죽댄다. 나는 누운 채로 “야, 빌뱅일 보려고 하면 똑똑히 봐 임마.” “어떻게 하면 똑똑히 보는 거냐”고 고개를 숙일 때 나는 대뜸 끌어안았다.
“빌뱅이한테는 나누어 먹는 거야 이 새끼야, 안 내놔!” “뭘?” “도시락이지 딴 거가.”
거기서부터 나는 ‘눈물의 주먹’이라는 덧이름(별명)이 붙고 말았다. 하루는 “눈물의 주먹한테는 견줄 놈이 없다드라”는 말을 듣고 힘꼴이나 쓰는 놈이 붙잔다. “그래, 좋다”고 일어서려다 한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눈물의 주먹, 아무것도 아니구먼. 야 임마, 눈물이나 보여!” 그런다. “내 눈물을 보고 싶다고, 여기 있잖아, 임마!” 그러자 “뭐가?” 그러는 때박(순간), 그냥 우지끈 “이게 내 눈물이야 이 새끼야” 하고 보낸 뒤 나발(소문)이 돌았다.
“남산 눈물의 주먹은 힘은 안 쓰고 눈물만 쓴다더라.”
나는 그때 참말로 주먹쟁이가 되고자 했다. 우리 인순이를 생각하면 모자 쓴 애들은 그저 몽땅 꼬꾸라뜨리는 깡패.
나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 외쳤다. “야 이 새끼들아, 다 나와!” 하지만 나하고 붙자는 애가 하나도 없는 게 그리 서운할 수가 없었다. 통일꾼
달려갔더니 우리 인순이가 “오빠!” “엉 인순아!” 한참 껴안고 울며 불렀다. 그런데 인순이가 웬 애를 업고 있다. “그 어린애는 누구지?” 할머니네 애란다. 그때 남대문 뒷골목에는 마음씨 고운 백씨 할머니가 계셨다. 글파(공부) 잘하는 금순이 고모도 있고. 갈 데가 없는 언니(형)가 애루를 그 할머니네 집엘 맡겼는데 “오빠, 아버지는 어디 계셔? 나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며 울먹인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 따졌다. “야 아바이, 인순이가 왔는데 그래도 눌데(방) 하나 못 얻네.” “고마이 있으라우.” 또 그러시기를 한 달. 우리 집은 남북으로 갈리다가 서울에서도 또 넷으로 갈리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것보다 먼저 내 힘으로 눌데를 하나 얻으려고 닥치는 대로 막일을 했다. 얼마 만에 돈 만원을 만들어 쪼매난 눌데를 얻었다. 내 힘으로 뿔뿔이 헤어졌던 우리가 하나 되던 날, 인순이와 나는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모른다. ‘우리 오빠 맨발로 서울 가시며~’ 하지만 그 집도 몇 달 만에 쫓겨나고 정릉 왕씨 집에 빌붙었을 적이다. 아버지도 언니도 보름이 지났는데도 오시질 않았다. 아버지를 찾던 인순이가 꺼떡꺼떡 존다. “너 배고프네?” 아침부터 굶었는데도 “아니!” “그럼, 너 엄마가 보고 싶으네?” “보고 싶어도 참아!” 그 말에 갑자기 왈칵, 안집에서 오이지 세나를 훔쳐다가 그 짠 것을 와작와작. 오빠, 어디 좀 다녀온다며 남산까지 와서 퍽 쓰러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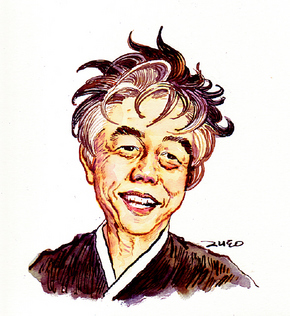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