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민정기 화백
백기완-나의 한살매 24
살아남기만 하면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한술 닿은 끈매(인연)는 달구름(세월)이 가고 또 가도 끊기질 않을 때가 있다. 이로 미루어 아주마루(영원)란 한갓된 더듬(관념)이 아니라 바로 사람 사는 여러 끈매가 아닐까. 그렇다, 아주마루란 저품(자연)의 있음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물끼의 샘, 그 갈마(역사)라는 것을 나는 겪은바 있다.
지난 20세기, 50년 허리께쯤이었을 게다. 래빛(진달래 빛) 쪽지 하나가 내가 빌붙어 사는 남의 집에 날아들었다.
“나야, 하제(내일) 낮 열한 때결(시)
창경궁 앞으로 나와.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안 나와도 난 기다릴 거야.
-알록알록-”
나는 그 녀석일 게 틀림없다고 신발끈을 조이고선 쪽지에 적힌 때결에 맞게 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녀석이 아니다. 목이 길어 슬픈 사슴처럼 늘씬한 여고생 알록이다. “웬 일이야?”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떡집이라도 들어갈 턱이 없어 알록이가 앞장을 서고 나는 따라가고, 고려대를 넘고 더 넘어가니 한창 익은 밀밭이 쭈욱 뻗어 있다. 그 사잇길로 앞서가는 알록이의 살빛이 맑은 하늘에 눈부시다.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말없이 보리밭 속으로 가다가 문득 서더니 마치 칼을 빼든 뚝쇠(우두머리)처럼 윗도리를 벗는다. 그때만 해도 젖가리개가 드물 적이라, 어깨에 걸친 속치마 걸개 속에서 불쑥 나온 앞가슴. 차마 눈여길 수가 없어 돌다서니 떨구(벼락)가 파르르 구른다. “언니(형), 나 언니한테 엥길 거야. 죽을 때까지 한손엔 호미를 들고 또 한손엔 우리네 애를 안고 언니와 함께 널마(대륙)를 일으키러 갈 거야” 그런다. ‘사람은 길을 잃었다고 발길을 돌리거나 무턱대고 앞만 보고 가지 마라. 천길 땅을 맨손으로 파서라도 길을 내라(만들라)’는 새김말을 모르는 내가 아니건만 그저 아득했다. 이때다. 바로 내 앞에 까만 보리 하나가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고 있다. “야, 너 이게 무엇인 줄 알아?” “몰라.” “이게 바로 깜부기야. 바람이 불면 고개부터 먼저 숙이고 또 바람이 잦으면 맨 먼저 고개를 들어 돋보이는 것 같아도 속이 썩어 싹을 못 틔우는 깜부기. 다만 먹으면 맛은 있지” 그러면서 앞서가니 “언니, 내가 깜부기인 줄 알아” 하고 소릴 지른다. 돌다서니 이참엔 어깨에 걸쳤던 속치마 떨방까지 내리면서 “난 한살매(일생)를 언니한테 매겼단 말이야” 뭉게구름처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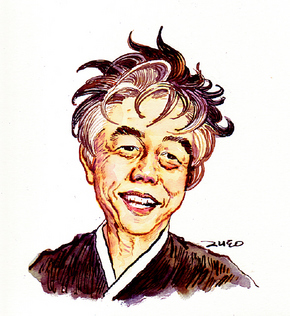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그게 꿈이 아니라 바투(현실)이니 어쩌는가. 나는 그저 앞장을 서서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를 부르면서 창경궁까지 와서 떡집도 못 들어가고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 뒤 그의 글월을 여럿 받았다. 다만 집데(주소)가 없어 어떤 때는 찻집, 어떤 때는 남의 손으로 받았다.
“언니, 나 오늘부터 바다의 횃불이 될 거야. 길 잃은 언니가 찾아오라고.”
“언니,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눈물? 아니야, 나그네야. 가도가도 멎을 데 없는 나그네.”
“언니, 눈물 뒤엔 무엇이 남는 줄 알아, 빈 껍줄? 아니야, 불덩어리야. 찬비를 맞을수록 타오르는 불덩어리.”
“언니, 난 어제 언니가 삼척 원동면에서 씨갈이꾼(농민)이 준 막걸리를 마시며 나는 한살매를 저 가난과 싸우리라고 다졌다는 글을 읽었어. 언니의 하기(실천) 그것이 바로 글이라는 것을 보고 깨우쳤어. 내가 언니를 사랑하는 게 곧 하기라는 걸 …. 난 기다리진 않아. 언니한테 갈 거야 죽어도.”
“언니, 날씨가 몹시 추워. 낙지볶음 좋아하지? 한 접시 시켰지만 하나도 안 먹고 울었어.”
“언니, 나 오늘은 언니한테 종아리를 맞고 싶어.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러더니 내 집데가 시원칠 않아 그의 글월을 더는 못 받았다. 이제 갸도 일흔이 넘었을 테지.
젊은이들이 “사랑이 무어냐”고 물어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무리 가차워도 계집사내는 한 뼘의 틈을 두고 사귀어야 한다. 다만 목숨보다 더 찐한 사랑을 할 때에는, 그래서 딱 한술에 한살매를 불지르고저 했을 적엔 단 한 눈금의 틈도 두어선 안 된다, 뽀드득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러면서 애꿎은 지난날을 깨물곤 한다. 통일꾼
그게 꿈이 아니라 바투(현실)이니 어쩌는가. 나는 그저 앞장을 서서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를 부르면서 창경궁까지 와서 떡집도 못 들어가고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 뒤 그의 글월을 여럿 받았다. 다만 집데(주소)가 없어 어떤 때는 찻집, 어떤 때는 남의 손으로 받았다.
“언니, 나 오늘부터 바다의 횃불이 될 거야. 길 잃은 언니가 찾아오라고.”
“언니,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눈물? 아니야, 나그네야. 가도가도 멎을 데 없는 나그네.”
“언니, 눈물 뒤엔 무엇이 남는 줄 알아, 빈 껍줄? 아니야, 불덩어리야. 찬비를 맞을수록 타오르는 불덩어리.”
“언니, 난 어제 언니가 삼척 원동면에서 씨갈이꾼(농민)이 준 막걸리를 마시며 나는 한살매를 저 가난과 싸우리라고 다졌다는 글을 읽었어. 언니의 하기(실천) 그것이 바로 글이라는 것을 보고 깨우쳤어. 내가 언니를 사랑하는 게 곧 하기라는 걸 …. 난 기다리진 않아. 언니한테 갈 거야 죽어도.”
“언니, 날씨가 몹시 추워. 낙지볶음 좋아하지? 한 접시 시켰지만 하나도 안 먹고 울었어.”
“언니, 나 오늘은 언니한테 종아리를 맞고 싶어.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러더니 내 집데가 시원칠 않아 그의 글월을 더는 못 받았다. 이제 갸도 일흔이 넘었을 테지.
젊은이들이 “사랑이 무어냐”고 물어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무리 가차워도 계집사내는 한 뼘의 틈을 두고 사귀어야 한다. 다만 목숨보다 더 찐한 사랑을 할 때에는, 그래서 딱 한술에 한살매를 불지르고저 했을 적엔 단 한 눈금의 틈도 두어선 안 된다, 뽀드득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러면서 애꿎은 지난날을 깨물곤 한다. 통일꾼
떡집이라도 들어갈 턱이 없어 알록이가 앞장을 서고 나는 따라가고, 고려대를 넘고 더 넘어가니 한창 익은 밀밭이 쭈욱 뻗어 있다. 그 사잇길로 앞서가는 알록이의 살빛이 맑은 하늘에 눈부시다.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말없이 보리밭 속으로 가다가 문득 서더니 마치 칼을 빼든 뚝쇠(우두머리)처럼 윗도리를 벗는다. 그때만 해도 젖가리개가 드물 적이라, 어깨에 걸친 속치마 걸개 속에서 불쑥 나온 앞가슴. 차마 눈여길 수가 없어 돌다서니 떨구(벼락)가 파르르 구른다. “언니(형), 나 언니한테 엥길 거야. 죽을 때까지 한손엔 호미를 들고 또 한손엔 우리네 애를 안고 언니와 함께 널마(대륙)를 일으키러 갈 거야” 그런다. ‘사람은 길을 잃었다고 발길을 돌리거나 무턱대고 앞만 보고 가지 마라. 천길 땅을 맨손으로 파서라도 길을 내라(만들라)’는 새김말을 모르는 내가 아니건만 그저 아득했다. 이때다. 바로 내 앞에 까만 보리 하나가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고 있다. “야, 너 이게 무엇인 줄 알아?” “몰라.” “이게 바로 깜부기야. 바람이 불면 고개부터 먼저 숙이고 또 바람이 잦으면 맨 먼저 고개를 들어 돋보이는 것 같아도 속이 썩어 싹을 못 틔우는 깜부기. 다만 먹으면 맛은 있지” 그러면서 앞서가니 “언니, 내가 깜부기인 줄 알아” 하고 소릴 지른다. 돌다서니 이참엔 어깨에 걸쳤던 속치마 떨방까지 내리면서 “난 한살매(일생)를 언니한테 매겼단 말이야” 뭉게구름처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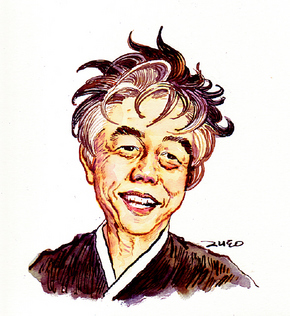
백기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