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유신헌법 공포 직전 도쿄로 건너온 김대중씨는 필자에게 일본과 미국의 정치권을 상대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데 활용할 신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무렵 김씨가 의원 신분으로 후지야마 이치로, 다가와 세이이치 등 일본 정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김종충씨 회고록 <현해탄 파도는 아직도> 중에서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52
1972년 김대중 선생과 두 차례 만나고 나서, 사람은 우선 겉모양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게 마련이고 김 선생이 그 정도로 나를 봤다 해도 굳이 탓할 수는 없노라고 나는 느꼈소이다. 내게 무슨 대학교수쯤의 직함이 있었다든지, 혹은 국회의원이라도 한 차례 지냈다는 경력이 있다면 또 모르되, 논어의 말마따나 나이 사십이 넘도록 무문이었으니 ‘부족외야’로 비쳤다 해도 무리는 아니었겠지요.
다음번 어느날 사무소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궁금도 하고 실례가 되지 않도록 말을 낮추면서 김 선생에게 물었소이다.
“선생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 대답은 ‘제2의 4·19’였소이다.
“내가 앞으로 일본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두 나라의 정계를 움직인다면 본국에서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는 내가 들어가서 혁명위원회를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4·19에 대한 김 선생의 인식이 틀린 것이 아닐는지, 약간 의아스러운 느낌이었소이다. 4·19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사실이나 빗발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학생들의 투쟁은 결코 민주당을 차기 정권의 담당자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4·19’의 시인 신동엽이 무어라고 부르짖었소이까?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4·19 학생혁명의 정신은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김 선생의 이해는 빗나간 것이 아닐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더구나 그가 ‘혁명위원회’를 운운하시니, 나는 쿠바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쿠바와 우리나라는 비록 역사적 배경이나 놓여 있는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나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절규에서는 4·19와 쿠바, 두 혁명의 정신은 공통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소이다. 그러면서 김 선생은 역시 한민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민당 정객임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한민당이란 김구 선생의 말투를 빌린다면, ‘적들이 항복하던 전야까지 그들의 본거지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바치던’ 인사들의 집단이 아니오이까. 그 한민당이 민국당, 민주당, 신민당으로 여러차례 간판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들의 사대주의 사고는 뿌리깊게 살아남아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소이까. 하기야 김 선생이 그런 흐름 속의 정치가 중에서는 한국 문제를 민족 차원에서 거론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쯤의 인식이 내게 없지는 않았소이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제2의 4·19를 일으켜 그것을 바탕으로 혁명위원회를 조직한다니, ‘연목구어’도 유만분수요,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만한 발상이 아니었소이다. 약간 화도 나고, 또 혁명을 운위한 김 선생 자신의 말도 있던 터라, 문득 쿠바혁명 때 볼리비아에서 총에 맞아 죽은 체 게바라가 떠올라 좀 격한 말투로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소이다. “김 선생, 나더러 신문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총을 쏘라고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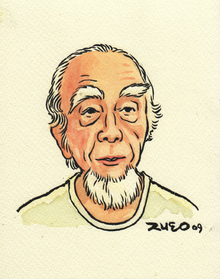 그런 며칠 뒤 이시카와 모라는 일본 사람이 김 선생의 심부름으로 집으로 찾아왔습디다. ‘정경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뜻이었겠지요. 그 사람을 적당히 다루어 보낸 다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디다. 김 선생께서 ‘정경모 당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으시다면 나를 불러 직접 묻든지, 삼고지례는 아닐망정 당신께서 나를 찾아오시든가 할 일이지, 아니 그래 민족운동을 같이 할 동지를 찾는 분이 일본 사람을 시켜 내 맘을 떠보게 하다니 그게 무슨 노릇이오이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정경모는 무정부주의자니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방 순회중의 김 선생께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러시더라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려오더이다.
옛날 진짜 무정부주의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으로 있던 이승만씨로부터 공산주의자로 혹심한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지만 김 선생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미움을 사고 있다면, 이제 나는 단재 선생과 같은 위상으로 사람값이 격상된 것이 아닐까 하고 쓴웃음을 웃었을 뿐이었소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그런 며칠 뒤 이시카와 모라는 일본 사람이 김 선생의 심부름으로 집으로 찾아왔습디다. ‘정경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뜻이었겠지요. 그 사람을 적당히 다루어 보낸 다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디다. 김 선생께서 ‘정경모 당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으시다면 나를 불러 직접 묻든지, 삼고지례는 아닐망정 당신께서 나를 찾아오시든가 할 일이지, 아니 그래 민족운동을 같이 할 동지를 찾는 분이 일본 사람을 시켜 내 맘을 떠보게 하다니 그게 무슨 노릇이오이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정경모는 무정부주의자니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방 순회중의 김 선생께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러시더라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려오더이다.
옛날 진짜 무정부주의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으로 있던 이승만씨로부터 공산주의자로 혹심한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지만 김 선생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미움을 사고 있다면, 이제 나는 단재 선생과 같은 위상으로 사람값이 격상된 것이 아닐까 하고 쓴웃음을 웃었을 뿐이었소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4·19 학생혁명의 정신은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김 선생의 이해는 빗나간 것이 아닐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더구나 그가 ‘혁명위원회’를 운운하시니, 나는 쿠바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쿠바와 우리나라는 비록 역사적 배경이나 놓여 있는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나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는 절규에서는 4·19와 쿠바, 두 혁명의 정신은 공통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소이다. 그러면서 김 선생은 역시 한민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민당 정객임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한민당이란 김구 선생의 말투를 빌린다면, ‘적들이 항복하던 전야까지 그들의 본거지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바치던’ 인사들의 집단이 아니오이까. 그 한민당이 민국당, 민주당, 신민당으로 여러차례 간판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들의 사대주의 사고는 뿌리깊게 살아남아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소이까. 하기야 김 선생이 그런 흐름 속의 정치가 중에서는 한국 문제를 민족 차원에서 거론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쯤의 인식이 내게 없지는 않았소이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제2의 4·19를 일으켜 그것을 바탕으로 혁명위원회를 조직한다니, ‘연목구어’도 유만분수요,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만한 발상이 아니었소이다. 약간 화도 나고, 또 혁명을 운위한 김 선생 자신의 말도 있던 터라, 문득 쿠바혁명 때 볼리비아에서 총에 맞아 죽은 체 게바라가 떠올라 좀 격한 말투로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소이다. “김 선생, 나더러 신문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총을 쏘라고 하시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