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8월 15일 도쿄에서 ‘납치 항의’ 기자회견을 하던 한민통 간부들이 이날 새벽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온 김대중씨와 통화를 한 뒤 ‘생환 환영’ 만세를 부르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배동호, 김재화, 정재준, 김종충씨.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59
<세카이>를 통한 나의 주장은 9월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스에의 요청으로 10월호에도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묻는다’라는 표제의 글을 발표하였소이다.
이 글에서 나는 우선 극단적으로 도덕성을 결여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본질을 폭로한 뒤 정치가 김대중씨로서는 망명이 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납치되어 박의 수중에 있는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생명의 위기를 호소했소이다. 역사적인 예로 든 것은 물론 이북과 내통했다는 죄로 이승만에게 처형당한 죽산 조봉암씨 사건이었지요.
조봉암씨에 대한 기소장에서 “피고는 북한 지령을 받은 괴뢰들과 합작하여 반국가 단체인 진보당을 결성하고 그 수괴에 취임하였으니”, 그 죄는 사형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돼있지 않소이까.
박 정권으로부터 반국가 단체로 지목되어 있는 ‘한민통’이 의장으로 추대할 예정이었노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김 선생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겠는가, 그 위기 상태를 일본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납치사건은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인데도 사건규명에 소극적일뿐더러 박 정권을 계속 지지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과 윤리성을 물었소이다.
동교동 자택에서 연금당하고 있던 김 선생이 사건 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73년 10월 26일이었는데, 김 선생은 그 기자회견에서 첫째 이번 사건으로 한-일 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둘째 ‘현상복귀’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것, 셋째 앞으로 정치활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 등 3가지 항목을 발표했소이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장면을 일본에서 텔레비전으로 들여다보다가, 섬뜩해지면서 생각난 것은 바로 전날 신문에 실린 최종길 교수 ‘자살 사건’이었소이다. 한국 중앙정보부 발표로는 최 교수가 어느 빌딩 4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고문으로 죽은 시체를 저희들이 창밖으로 내던진 ‘시체유기’ 사건이었으니, 이것이 김대중씨에 대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허튼수작을 하는 날에는 너도 이렇게 된다’는 협박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노릇이 아니오이까.
아무튼 납치사건 무마비로 일본돈 3억엔이 박으로부터 아무개, 아무개 손을 거쳐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한테 건네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김종필 총리가 사죄사로 도쿄에 나타나 다나카를 총리관저로 찾아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는 대신, 일본은 더는 사건을 문제삼지 않을뿐더러 경제원조도 재개하겠다는 이른바 ‘제1차 정치타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날은 김대중 기자회견이 있은 지 약 1주일이 지난 11월 2일이었소이다. 이런 꼴을 보면서 집필을 시작해 이듬해 1월호 <세카이>에 발표한 글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의 연대’였소이다.
사건 당시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소이다. 그날 현장으로 뛰어가 보니,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나타난 일본 경찰이 지문채취 등 현장검증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소이까. 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김동운의 지문이 밝혀진 것은 당일이었을 터인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항을 빠져나간 뒤 거의 한 달이 된 9월 5일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일본 정부는 그의 출두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소이다. 물론 그 요구는 거절되었으니, 처음부터 일본 정부는 사건규명 의사가 없었던 것이지요.
얼마 뒤 김 선생과도 가깝던 국회의원 우쓰노미야를 만났더니 “부끄럽소이다, 부끄럽소이다”라고, 부끄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더이다. 또 <아사히신문>(73년 10월22일치) 독자투고란 ‘고에’(聲)에도 “일본 정부가 김대중씨 인권회복에 성실치 못했던 것은 일본인의 총체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묻고, 이 문제는 일본 사회의 “윤리적 열성(劣性)”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탄하는 글도 나타났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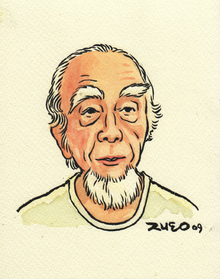 백주에 남의 나라 수도에서 정적을 납치해 가는 나라의 국민인 나는 물론 내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 중에도 자기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자못 감동적인 경험이었소이다.
제 나라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나와 같은 한국인과, 역시 제 나라 행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본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의 진정한 ‘제2의 해방’과, 일본의 거짓 없는 ‘제2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나는 거대한 꿈을 한 자리, 이 논고에서도 꾸어본 것이었소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백주에 남의 나라 수도에서 정적을 납치해 가는 나라의 국민인 나는 물론 내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 중에도 자기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자못 감동적인 경험이었소이다.
제 나라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나와 같은 한국인과, 역시 제 나라 행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본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의 진정한 ‘제2의 해방’과, 일본의 거짓 없는 ‘제2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나는 거대한 꿈을 한 자리, 이 논고에서도 꾸어본 것이었소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얼마 뒤 김 선생과도 가깝던 국회의원 우쓰노미야를 만났더니 “부끄럽소이다, 부끄럽소이다”라고, 부끄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더이다. 또 <아사히신문>(73년 10월22일치) 독자투고란 ‘고에’(聲)에도 “일본 정부가 김대중씨 인권회복에 성실치 못했던 것은 일본인의 총체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묻고, 이 문제는 일본 사회의 “윤리적 열성(劣性)”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탄하는 글도 나타났소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