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3월 27일 평양 주석궁에서 처음 대면한 문익환(왼쪽) 목사와 김일성 주석이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 목사에 이어 함께 방문한 필자도 김 주석과 첫인사를 나눴다.(오른쪽 사진)
정경모-한강도 흐르고 다마가와도 흐르고 106
그러니까 1989년 3월 27일 아침 10시쯤이었을까. 우리 일행은 숙소를 나와 주석궁이라는 곳을 향해 출발하였소이다. 주석궁에 도착한 일행이 안내를 받고 널찍한 홀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거기 주석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목사가 뚜벅뚜벅 걸어 다가서니 두 분은 순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껴안으시더이다. 수인사 같은 것을 나눌 겨를도 없었고요.
초면인 두 분이었건만 오랫동안 헤어져 만나지 못했던 두 형제처럼 어쩌면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애정 어린 자세로 포옹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돌이켜보아도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소이다. 분단시대의 암흑을 뚫고 섬광과 같이 강렬한 불빛을 발한 그 순간은 참으로 찬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소이다.
후에 문 목사는 “가슴으로 만난 평양”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그 포옹의 장면은 “가슴으로 만난 평양”을 상징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소이까.
아마 분단 시대가 끝나고 평화스러운 통일의 시대를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불행했던 암흑의 시대를 돌이켜볼 때,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서로 껴안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애태우며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까 가슴 깊이 기억해주리라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소이다.
이건 평양 방문의 일정을 다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긴데, 어느 유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몰래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하더이다. 텔레비전에서 그 사진의 장면을 보는 순간 하도 좋아 목이 메어 울면서 혼자 사는 하숙방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날 밤은 거의 뜬눈으로 새었노라고 말이외다.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라는 신동엽의 시가 있지 않소이까.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옆에는 네가 네 옆에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며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사랑이 사랑 앞에는 죽음이
아우성 죽이며 억(億)진 나날
넘어갔음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구두 밟힌 목덜미
생풀 뜯은 어머니
어둔 날 눈 빼앗겼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백년 한양
어리석은 자 떼 아직
몰려 있음을.
우리들 입은 다문다.
이 밤 함께 겪는
가난하고 서러운
안 죽을 젊은이.
눈은 포도 위
묘향산 기슭에도
속리산 동학골
나려 쌓일지라도
열 사람 만 사람의 주먹팔은
묵묵히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고을마다 사랑방 찌갯그릇 앞
우리들 두쪽 난 조국의 운명을 입술 깨물며
오늘은 그들의 소굴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물론 몰래 나를 찾아온 그 유학생이 내 앞에서 그 시를 읋어 준 것은 아니외다. 그러나 그 젊은 학생이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하고 있는 피 끓는 젊은이라는 것은 나는 알 수가 있었소이다. 문 목사의 평양 방문 결과 4·2 공동성명이 나오고, 또 그것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조인한 6·15 공동성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이미, 누구나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나,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도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서로 껴안은 그 한 장의 사진은 실로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었소이다. 그해 여름 8월, 나이 어린 여학생 임수경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 평양에 나타나 전대협기를 들고 혼자서 운동장을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에 있는 나의 시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소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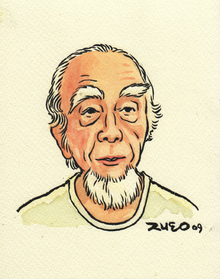 나는 수경이가 평양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 수도 없었거니와 그때 벌써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문 목사가 그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의논을 받을 까닭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문 목사와 김 주석이 부둥켜안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무언중에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을 것이 아니오이까.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때 앳된 처녀였던 수경이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우리 엄마는 통일의 꽃”이라고 재롱을 피우던 한 점 혈육인 재형이도 잃었소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지요.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해 갈 때 재형이의 넋도 같은 대열에 끼어 외칠 것이라는 것을. “밤은 길어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나는 수경이가 평양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 수도 없었거니와 그때 벌써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문 목사가 그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의논을 받을 까닭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문 목사와 김 주석이 부둥켜안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무언중에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을 것이 아니오이까.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때 앳된 처녀였던 수경이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우리 엄마는 통일의 꽃”이라고 재롱을 피우던 한 점 혈육인 재형이도 잃었소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지요.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해 갈 때 재형이의 넋도 같은 대열에 끼어 외칠 것이라는 것을. “밤은 길어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내 옆에는 네가 네 옆에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며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사랑이 사랑 앞에는 죽음이
아우성 죽이며 억(億)진 나날
넘어갔음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구두 밟힌 목덜미
생풀 뜯은 어머니
어둔 날 눈 빼앗겼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백년 한양
어리석은 자 떼 아직
몰려 있음을.
우리들 입은 다문다.
이 밤 함께 겪는
가난하고 서러운
안 죽을 젊은이.
눈은 포도 위
묘향산 기슭에도
속리산 동학골
나려 쌓일지라도
열 사람 만 사람의 주먹팔은
묵묵히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고을마다 사랑방 찌갯그릇 앞
우리들 두쪽 난 조국의 운명을 입술 깨물며
오늘은 그들의 소굴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물론 몰래 나를 찾아온 그 유학생이 내 앞에서 그 시를 읋어 준 것은 아니외다. 그러나 그 젊은 학생이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하고 있는 피 끓는 젊은이라는 것은 나는 알 수가 있었소이다. 문 목사의 평양 방문 결과 4·2 공동성명이 나오고, 또 그것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조인한 6·15 공동성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이미, 누구나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나,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도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서로 껴안은 그 한 장의 사진은 실로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었소이다. 그해 여름 8월, 나이 어린 여학생 임수경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 평양에 나타나 전대협기를 들고 혼자서 운동장을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에 있는 나의 시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소이까.
정경모 재일 통일운동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