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64년 6년제 과정의 대신학교 시절의 필자.(왼쪽 사진) 그 시절 학교에서 본 영화 <워터프론트>에서 부두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신부 레비(칼 말덴·오른쪽 사진 맨 왼쪽)의 모습은 필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
문정현-길 위의 신부 6
신학교의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와 수업의 반복이었고 규칙이 엄격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결코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터라 규칙을 어기는 일은 없었다. 신학교에서는 방학 때조차도 자신의 본당 신부 밑에서 절대 순종하며 지내다가 개학할 때 본당 신부의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방학도 엄격한 규칙 속에서 보내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엄격한 규칙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한눈을 팔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사제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시간이었다. 서품을 받고 신부가 돼서 사목활동을 하다 보면 자칫 중심을 잃고 생활이 흔들리고 방탕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은 지금까지도 나 자신을 추스르게 하는 힘이 된다.
당시 신학교에는 특별한 문화활동은 없고 학교에 있는 16㎜ 영사기로 가끔 영화를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영화는 부두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탄압하는 이들과 맞서는 이야기였다. 자막이 없어 영어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부두노동자들 편에 선 신부(칼 말덴)가 깡패들이 던진 눈덩이를 꿈쩍 않고 맞던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신부는 ‘저런 분이구나’ 상상했다. 그러나 제목도 몰랐다. 나중에 <문화방송>(MBC) 피디에게 이런 영화가 기억이 난다고 했더니 제목이 말런 브랜도 주연의 <워터프론트>(1954년)라고 알려줘 지금도 디브이디로 가끔 본다.
1958년 대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는 철학과 2년, 신학과 4년의 6년제 과정인데 당시는 교과서가 모두 라틴어였고, 철학은 강의도 라틴어로 진행됐다. 그리스말, 히브리말도 철학과의 필수과목이었고 영어, 불어는 선택과목이었다.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신학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학이 대부분이었다. 그 보수적인 신학이 바로 예수의 근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보적인 신학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신학교 생활은 그다지 특별한 게 없었다. 굳이 꼽자면 철학과 1학년 때부터 이문근 신부로부터 5년간 레슨을 받고 나중에 학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성가 할 때 ‘칸토르’라는 선창자 역을 맡은 정도였다. 신학교의 생활이라는 게 동아리 활동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줄지어서 미사보고 식사하고 강의받고, 그다음에 밥 먹고 또 기도하는 거라 사회의식 따위도 없었다. 그저 학교의 규칙 안에서 살면서 탈락하지 않고 서품 때까지 가기 위한 노력만 있었다. 평범한 신학생이었던 나는 성당에 오면 본당 신부님 말씀 잘 듣고, 그의 의견대로 그것을 읽어서 순종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나마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3학년 때 받았던 삭발례라는 예식이다. 삭발이라고 해서 스님처럼 머리를 완전히 깎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앞머리카락을 조금 깎는 것이다. 그때부터 성직자 반열에 서고, 성직자의 옷인 수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서품을 받는 것만큼이나 감격적이었다. 신학생들은 삭발례를 통해 기도생활과 성직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흐려지고 물러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각오가 사제의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삭발례 때 선후배들이 구타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성직자가 되면 함부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성타(聖打)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이다. 나쁜 관행이라고 교수 신부님들은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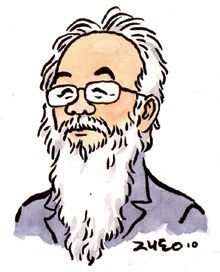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신학교는 보수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은 전무했다. 4·19 의거 때조차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가 피해를 볼까봐 보초를 서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쓰러지고, 하야 이후 허정 임시정부가 세워지던 때, 당시 학장 신부였던 한공열 학장 신부님이 라틴어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척 충격이었다.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의 문을 여는 불사조에 비유하며 ‘테데움’이라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적인 성체 강복을 했다. 그때 학장 신부님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정권이 세워진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다. 철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그곳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겪었지만 그때까지도 정치의식이 희박했던 나는 그냥 군사정변이 일어났나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2년 만에 복학을 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신학교는 보수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은 전무했다. 4·19 의거 때조차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가 피해를 볼까봐 보초를 서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쓰러지고, 하야 이후 허정 임시정부가 세워지던 때, 당시 학장 신부였던 한공열 학장 신부님이 라틴어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척 충격이었다.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의 문을 여는 불사조에 비유하며 ‘테데움’이라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적인 성체 강복을 했다. 그때 학장 신부님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정권이 세워진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다. 철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그곳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겪었지만 그때까지도 정치의식이 희박했던 나는 그냥 군사정변이 일어났나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2년 만에 복학을 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