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귀국 직전 남미 여행에 나선 필자가 산살바도르의 해방신학 사제인 로메로 대주교가 80년 사살당한 순교성지를 찾았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병원 안에 있는 경당에 로메로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사제복 등이 전시돼 있다.
문정현-길 위의 신부 53
남미 여행에서 내가 꼭 찾아가고 싶었던 곳은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가 순교한 곳이었다. 수도 산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로메로 신부는 1980년 3월24일 4명의 괴한에 의해 사살됐다. 로메로는 원래 보수적인 인사였다. 평소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혁적 사목 방침을 우려하는 전통주의자였으며, 해방신학을 ‘증오에 가득 찬 그리스도론’이라고 비판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77년 산살바도르 대교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민중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로메로 주교의 착좌식이 있은 지 3주 만에 오랜 친구인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아길라레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암살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란데 신부는 로메로 주교와는 달리 민중의 편에 서 있던 사제였다. 그란데 신부 추모미사를 집전하면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농민의 모습을 보게 된 로메로 대주교는 3년 뒤 괴한에 의해 살해될 때까지 농민과 빈민의 편에 섰다.
로메로 대주교가 숨진 자리는 수녀회에서 경영하는 가난한 호스피스병원 안에 있었다. 대주교가 평소 자주 그곳을 찾아가 기도를 한 까닭에 야전침대와 제의장이 마련돼 있었다. 그의 순교 실화를 담은 영화 <로메로>에서는 대주교가 살해될 때 경당에 군중들이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 당시 대주교는 수녀와 환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괴한은 경당 정문 밖에서 제대를 향해 총을 쏘고 사라졌다. 경당에는 로메로가 피격당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주교가 머물던 방에는 살해될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제의도 전시되어 있었다. 무덤덤한 성격의 리수현 신부가 대주교가 총탄에 쓰러져 피 흘린 바로 그 제단 앞으로 가서 입을 맞추었다. 나도 그를 따라 그대로 했다. 우리는 로메로 대주교의 삶과 죽음에 깊은 감흥을 받았다.
우리가 주로 교회나 성지를 둘러본 때문인지 여행 내내 남미 곳곳에서 체 게바라보다 로메로 대주교의 흔적이 더 눈에 띄었다. 로메로는 중남미 민중들의 가슴에 살아 있는 영성가였다. 그러나 로메로는 주교회의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에게 아직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산살바도르에서는 독재정권 아래서 사살당한 예수회 신부 4명과 주방에서 일하던 모녀까지 살해된 현장에 가보았다. 예수회에서는 신부들이 사살된 자리에 장미 동산을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서 유명한 해방신학자 소브리노를 만났다. 그는 동료 사제들이 살해당하던 때에 마침 대만으로 강의를 하러 떠나 있어 살아남았다. 소브리노와 함께 남미의 상황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엘살바도르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소수나마 복음정신으로 민중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만났고, 권력에 의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만났다. 그 어머니에게서 살아 있는 피에타를 보았다. 한국에서는 성직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어도 살해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멕시코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뒤 스페인에 점령당해 고유의 독수리 문화를 파괴당했다. 멕시코의 전통문화가 파괴된 자리에는 스페인식 바실리카 대성전이 들어섰다. 86년 바실리카 대성전이 갈라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성전 근처에서 독수리 문화의 유산이 솟아 나왔다. 그만큼 민중의 문화는 질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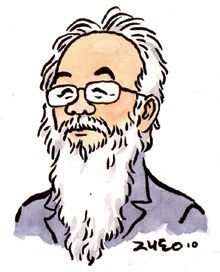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멕시코의 토속신앙과 가톨릭 문화의 결합은 과달루페 성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달루페의 성모는 1531년 12월 테페야크라는 언덕에서 인디언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증거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며 자신의 얘기를 멕시코 주교에게 전하라고 했다. 교회는 처음에는 인디언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모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과달루페 성모를 가톨릭의 전파를 위해 이용했다. 그 테페야크 언덕은 바로 인디언들이 믿던 아스테카 종교의 여신 ‘토난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인디오들은 아직도 과달루페 성모를 ‘토난친’이라고 부른다. 과달루페 성모는 지금까지도 토속신앙과 가톨릭이 뒤섞인 채로 민중을 위로하고 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멕시코의 토속신앙과 가톨릭 문화의 결합은 과달루페 성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달루페의 성모는 1531년 12월 테페야크라는 언덕에서 인디언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증거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며 자신의 얘기를 멕시코 주교에게 전하라고 했다. 교회는 처음에는 인디언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모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과달루페 성모를 가톨릭의 전파를 위해 이용했다. 그 테페야크 언덕은 바로 인디언들이 믿던 아스테카 종교의 여신 ‘토난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인디오들은 아직도 과달루페 성모를 ‘토난친’이라고 부른다. 과달루페 성모는 지금까지도 토속신앙과 가톨릭이 뒤섞인 채로 민중을 위로하고 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