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시절인 1994년 12월 겨울방학을 이용해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필자는 ‘작은 자매의 집’ 운영에 전념하고자 99년 초 성당 사목에서 은퇴했다.
문정현-길 위의 신부 55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사는 교우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교우들이 자기 자신과 이웃,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토론한 뒤, 기도를 통해 그 해답을 얻어 활동할 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과정 없이 그저 미사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한 기도와 위로는 폐쇄된 전례가 될 수밖에 없다. 전례 안에는 세상일, 개인적인 고뇌,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제 인생을 돌아보면, 전북 장수의 장계성당에서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당사목과 사회활동의 균형이 잡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군산 오룡동성당에서는 잘되지 않았다.
성당에서는 대부분 주임신부에 따라 교우들이 움직인다. 오룡동성당 신자들도 박창신 신부가 있던 1990년에는 동양제철화학의 티디아이(TDI) 군산공장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문제에도 함께 움직였다. 군산시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것은 티디아이가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티디아이 자체만이 아니라 티디아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포스겐·염소 등의 맹독가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유출되면 그 양에 따라 반경 수십 킬로미터 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던 것이다. 티디아이는 이미 1984년 인도 보팔시의 유니언카바이드사에서 누출사고로 1000여명이 숨지고 20여만명이 병마에 시달리게 한 메틸이소시안(MIC) 가스와 성분이 비슷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공장 쪽에서 아무리 공해대책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가스폭발 누출 등 사고 위험을 100% 방지할 수는 없다며 주택밀집지역에서 불과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단에 티디아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사목협의회가 나서서 공장 철거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운동에 오룡동성당 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내가 있을 때는 성당과 사회, 성당 안에 있는 노동사목이 따로 움직였다. 교우들과 노동사목의 노동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성당 안에 노동자의 집이 있는데도 성당에서는 관행적으로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물론 노동자의 집 쪽에서도 혹시나 성당 사목회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할까봐 걱정을 했다. 워낙 서로 생각이 달라 소통과 조율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성당마다 사목회의 임원 구성 자체가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했다. 따지고 보면 성당 사목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인간성 향상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질 않았다. 늘 노동자의 집이 가슴속에 있던 나로서는 사목회 같은 모임에 가면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반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목회와 가끔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오룡동성당에서도 노동자의 집 지도신부로서 나는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지역 노동운동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고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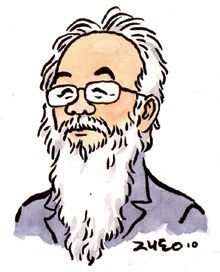 그 무렵 익산 ‘작은 자매의 집’에서 내가 할 일이 더 절실해졌다. 작은 자매의 집에 전념하고픈 마음이 든 나는 99년 2월 오룡동을 마지막으로 33년 만에 성당사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유신 이래로 새 성당에 부임할 때마다 그 지역, 그 시기의 상황에 따라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 사생활 같은 것은 누릴 틈도 없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룡동성당에서 3년 반은 내 사목활동을 마무리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다른 투쟁의 길로 들어선 출발점이기도 했다.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운동’이다. 그 시작은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일방적으로 민항기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발표한 97년 10월이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그 무렵 익산 ‘작은 자매의 집’에서 내가 할 일이 더 절실해졌다. 작은 자매의 집에 전념하고픈 마음이 든 나는 99년 2월 오룡동을 마지막으로 33년 만에 성당사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유신 이래로 새 성당에 부임할 때마다 그 지역, 그 시기의 상황에 따라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 사생활 같은 것은 누릴 틈도 없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룡동성당에서 3년 반은 내 사목활동을 마무리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다른 투쟁의 길로 들어선 출발점이기도 했다.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운동’이다. 그 시작은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일방적으로 민항기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발표한 97년 10월이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