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29일 ‘5·29 평택 평화축제’ 무대 위에서 ‘투쟁과 밥’(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밥을 해주며 지지한 청년들의 모임)이 공연을 하고 있다. 평화바람이 2003년 11월부터 7개월 가까이 전국을 유랑하며 만난 여러 단체의 펼침막과 행사 포스터를 엮어 무대배경을 꾸몄다.
문정현-길 위의 신부 81
2004년 3월17일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은 대구에서 미군기지 캠프 워커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 날은 영남대 앞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땅과 자유’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대구의 문화 예술인 단체와 함께 공연을 했다. 그 공연에서 내건 펼침막에는 운동권에서 흔히 쓰는 ‘박살내자, 분쇄하자’ 따위의 구호가 아니라, ‘고르게 가난하게 살자’ ‘생명, 평화’ 같은 말들이 쓰였다.
그 자리에는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도 참석해주었다. 김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치와 자립,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새로운 주제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개발과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르게 가난하게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 나는 그때부터 <녹색평론> 애독자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을 다니면서 온 산과 들, 물길이 개발로 시름시름 앓고 있음을 실감했다. 만약 내가 유랑을 하지 않고 한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보지 못했을 터이고 마음도 그토록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자체마다 개발이란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현장을 보면서 대구에서 깨달았던 ‘고르게 가난한 사회’에 대한 갈망은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대구를 떠나 안동~제천~원주를 거쳐 옥천에도 들렀다. 4월1일에는 ‘청주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백일기도회’에 참석했다. 청주 원흥동 방죽과 그 일대의 구룡산에는 두꺼비 서식지가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두꺼비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은 폭력이었다.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문화이고 역사인데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대추리도 마찬가지고, 원흥이 두꺼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삶의 위협을 느낀 두꺼비가 필사적으로 논과 밭을 넘어서 방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그 뒤 충북대를 거쳐 청주공단 내 월드텔레콤 노조의 파업 현장에 지지 방문을 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대학을 순례하고 아산 광해병원 노동자 투쟁장을 격려방문했다.
4월 말부터 5월에는 ‘생명평화마중물 창립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와 노동자들을 지지방문하고 이주노동자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축제에도 참여했다. 또 부안의 ‘새만금 생명평화연대 발족식’에 참가하고 제천의 간디학교 평화순례에도 함께했다. 간디학교 학생들을 만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토론할 줄 아는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훗날 ‘5·29 평택 평화 대행진’에 와서 의미있는 공연을 해주었다.
5월에는 주로 ‘5·29 평택 평화축제’를 준비하며 지냈다. 그러나 정말 막연했다. 어떤 이들이 얼마나 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축제 장소를 구하는 것도 몹시 어려웠다. 평택시나 경찰에서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방해를 했다. 여러 과정을 거친 뒤,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빌릴 수 있었다. 겨우 주차장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지만 평택시에서 전기·수도·화장실은 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전기는 발전기를 돌리기로 하고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을 빌려서 쓰기로 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평화축제 전단을 봤다며 간이화장실을 싼값에 사용하게 해주었다. 평택 도두리, 대추리가 고향인 가수 정태춘도 우리 취지를 알고 스스로 동참했다. 그리고 음향과 무대장치를 싼값에 지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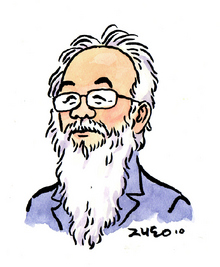 축제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는데 우리가 전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때부터 신이 났다. 오는 사람들마다 음식을 준비해 와 나눠 먹고, 어떤 이는 간이 생맥주 기계를 가져와 팔기도 했다.
최병수를 비롯한 미술가들은 백두대간을 표현하는 조형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만들고 노순택 사진작가는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도 열었다. 우리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날의 평화축제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인이 돼서 완성한 것이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아 그날 내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느라 목이 다 쉬어버렸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축제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는데 우리가 전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때부터 신이 났다. 오는 사람들마다 음식을 준비해 와 나눠 먹고, 어떤 이는 간이 생맥주 기계를 가져와 팔기도 했다.
최병수를 비롯한 미술가들은 백두대간을 표현하는 조형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만들고 노순택 사진작가는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도 열었다. 우리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날의 평화축제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인이 돼서 완성한 것이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아 그날 내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느라 목이 다 쉬어버렸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