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16월 평택 대추리·도두리의 주민들은 서울 종로구 효자로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 중단과 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정현-길 위의 신부 85
2004년 12월 평택 대추리에 직접 들어가서 들어보니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군이 들어와 군용 활주로 만든다고 쫓아냈다. 새로 마을을 일궈 정착하나 했더니 1952년 한국전쟁 때 다시 미군 활주로를 연장한다고 해서 쫓아냈다. 보상 따위를 꺼낼 수도 없는 시절이어서 미군들이 마구잡이로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그래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갯벌에다 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새로 땅을 만들어야 하니 일손이 모자라 도두2리에서는 네 살짜리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일하다가 아이가 도랑에 빠져 죽은 일도 있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황새울을 문전옥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대추리에는 그때 생겨난 ‘황새울영농단’이 있었다. 김지태 이장을 중심으로 김택균·신종원 세 사람이 나서서 마치 형제처럼 이심전심으로 일을 했다. 영농단에는 온갖 농기계와 연장이 다 갖춰져 있어 그 넓은 땅에 짓는 농사를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기계로 할 수 있고, 농기구도 스스로 고쳐 쓸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함께 일하며 밥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며 구수한 입담을 나누었다. 대추리만의 고유한 풍경, 오랫동안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와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평화였다. 그 평화를 빼앗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줄초상이 났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세 번이나 땅을 빼앗긴 노인들은 그 두려움과 좌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초상이 나면 온 주민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 삼일장 내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척척 일을 해냈다. 대추리에는 아직도 상여를 메고 나가는 전통예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군기지 울타리를 따라서 내리 입구에 선산이 있었다. 상여꾼을 굳이 모으지 않아도 수가 채워지고, 선창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관을 하고 봉묘를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했다. 대추리가 사라진다면 그런 아름다운 마을의 문화마저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문화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언어·관습·예술이 다 그렇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버리면 그 문화가 무너지는 것이다. 대추리에 들어가 살면서 비로소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았다. 대추리 노인들은 52년 쫓겨나기 이전 원래 마을의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소나무가 있었는지까지 훤히 다 그려냈다. 그런 노인들에게 또다시 대추리를 떠나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황새울영농단의 세 지도자는 이런 노인들의 아픔을 안고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애썼다. 이들은 2003년 7월1일 대추리·도두2리·안정리 주민들로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시 팽성읍 대책위원회’를 꾸려 줄기차게 투쟁했다. 그러던 2004년 9월1일, 주민 동의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특별법 공청회에서 항의하던 주민대표들과 평택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우리땅 지키기 팽성주민 촛불행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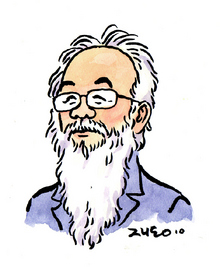 대책위 대표단 중 몇명은 대농이었다. 특히 김지태 위원장은 보상을 받고 떠나도 잘 먹고살 수 있었다. 그런데도 대추리를 지키겠다고 앞장서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고 뒷말을 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세태가 야속했다.
2004년 12월 정부의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자 대책위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조사에 응해 감정평가를 잘 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자는 사람들과, 조사에 응하게 되면 이미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땅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을 잃게 된다며 하지 말자는 사람들로 갈려 있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대책위 대표단 중 몇명은 대농이었다. 특히 김지태 위원장은 보상을 받고 떠나도 잘 먹고살 수 있었다. 그런데도 대추리를 지키겠다고 앞장서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고 뒷말을 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세태가 야속했다.
2004년 12월 정부의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자 대책위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조사에 응해 감정평가를 잘 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자는 사람들과, 조사에 응하게 되면 이미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땅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을 잃게 된다며 하지 말자는 사람들로 갈려 있었다.
구술정리/김중미 작가
문정현 신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