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1968년부터 74년까지 촉탁으로 발간 작업에 참여한 <동아연감-1967> 창간호 표지.(왼쪽) <동아연감-1970>에 실린 ‘근대적인 유학’(오른쪽)을 시작으로 필자는 한국 역사나 전통문화와 관련한 집필가로 나섰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24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자 1964년 <신동아> 복간 때부터 주필도 함께 맡고 있던 천관우 선생의 대범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한번은 <신동아>에서 중-소 국경 문제를 다룬 글 때문에 일어난 필화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게 됐다. 나를 불러 글이 실린 경위를 보고받던 그는 우동 두 그릇을 배달시켰다. 한 그릇은 내 몫인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했는데 연신 당부의 말을 하면서 혼자 두 그릇을 해치우고는 “언제 밥 얻어먹을지 모르지 않아?”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정보부원도 웃었다. 존경스러웠다.
<신동아>의 부록, ‘한국 고전 백선’ 작업도 천 선생에게 모든 진행을 보고했는데, 때때로 지시를 하거나 기고를 위해 써주는 글이 초서로 휘갈겨 아무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늘 내가 다시 정서를 해야 했는데 내용은 말할 나위도 없이 손댈 곳이 없었다. 그 뒤 몇해 동안 나는 출판부에 임시직원으로 나가 <동아연감> 출간 작업을 하고 봄여름의 공백 기간에는 을지로 입구에 있던 국립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했다. 한국학 또는 한국사 관련 책과 논문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동아일보사 조사부와 국립도서관의 책들은 나의 한국사 공부에 밑거름이 되었다.
69년 들어 동아일보사에서는 창간호부터 기사 색인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애초 연세대 도서관학과 이재철 교수가 맡고 있었다. 1년 뒤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기본 작업을 마무리하자 신문사에서는 손을 떼도록 종용했다. 이용만 해먹고 버린 꼴이다. 나는 조사부 소속의 색인실에서 촉탁 발령을 받고 이 색인 작업에 참여했다. 영인된 신문을 놓고 카드에 색인 항목을 분류하고 항목명을 적었다. 실무 책임자인 이두환 선배에게는 특별히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부에 늘 빨간 지각이나 결근 도장이 찍혀 인사고과는 나쁜 편이었다. 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다방에서 노닥거리느라 자리를 뜨기 일쑤여서 눈총을 받기도 했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꾸벅꾸벅 졸곤 했다. 5분 남짓 졸라치면 이 선배는 어김없이 “이화씨” 하고 불러 깨웠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능률이 배로 올라 다른 사람 작업량을 능가할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색인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한자 지식이 많은 덕분에 오자가 적었고 이해도 빠른 편이었다. 특히 <동아일보> 창간 직후인 1920년대의 갖가지 식민지 분위기와 사회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
보기를 들면 20년 초기 조선의 북방이나 만주지역 기사에 ‘비적 출현해 경찰과 교전’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항일 독립투쟁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또 총독부의 식민지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사고 기사를 통해 식민시대 사회 분위기와 근대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어느 대학의 사학과에서 이런 알찬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74년 어느날 아침 김상만 사장은 느닷없이 촉탁직원 10여명을 잘라버렸다, 색인집 1집을 낸 뒤였다. 우리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물러나왔다. 그때는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 직전이어서 신문사에 노조 같은 조직도 없던 시절이라 이 일방 해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나와 두세 사람만 몇달 더 남아 마무리 작업을 했다.
나의 6년 남짓 동아일보 생활을 다시 더듬어보면, 기한부 임시직에서 계약직인 촉탁에 이르기까지, 내내 주류에 끼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를 전전한 처지였다. 또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도 술 마시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많았다. 요즈음도 나는 이 시절을 두고 ‘학사과정을 마쳤다’고 말한다.
그 무렵 나는 <신동아>에 근무하는 김영일 등과 함께 무교동 낙지골목의 단골이었다. 독재정권을 지탄하고 정보정치를 향해 메아리 없는 소리를 질렀다. 술이 취하면 오기와 저항심에 젖어 길거리나 낙지집 장독대에 오줌을 갈기며 엉뚱한 분풀이를 하곤 했다. 또 툭하면 통행금지에 걸렸다가 기자라 둘러대서 풀려나기도 했으나 곧잘 경찰관의 모자를 벗기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서 즉결재판소에 넘겨지기도 했다. 연말 송년 파티 때 양주에 취해 김상만 사장이 탄 차를 발로 차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다. 출근 첫날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던 기억은 깡그리 잊어버렸다. 시대를 이기지 못한 ‘위장 레지스탕스’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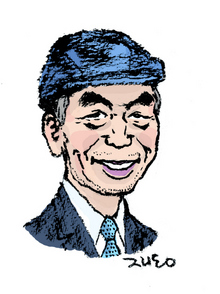 이때 사귄 사람들이 이부영, 이길범, 정동익, 정영일, 김양래, 이종욱 등이었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농간으로 벌어진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를 겪으며 자유언론 투쟁을 벌이다가 75년 3월 무더기 해직돼 고난의 길을 걷게 된 민주인사들이다. 그때도 박봉우 선배가 툭하면 술자리로 불러냈는데 술값은 당시 <동아일보> 차장이던 김중배 선배가 도맡아 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때 사귄 사람들이 이부영, 이길범, 정동익, 정영일, 김양래, 이종욱 등이었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농간으로 벌어진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를 겪으며 자유언론 투쟁을 벌이다가 75년 3월 무더기 해직돼 고난의 길을 걷게 된 민주인사들이다. 그때도 박봉우 선배가 툭하면 술자리로 불러냈는데 술값은 당시 <동아일보> 차장이던 김중배 선배가 도맡아 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