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7월호부터 필자의 글 ‘한국의 파벌’을 연재한다고 예고한 <월간중앙> 6월호의 목차.(왼쪽) 필자의 첫 학술지 발표 논문인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가 실린 <한국사 연구> 16집(77년 10월호).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28
1975년 한국사연구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부터 얼치기 연구자였던 나는 한국 사학계의 중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이때 발표한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논문은 <한국사 연구>(16집·1977년)에 수록됐다.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위정론자들은 첫째 정치적 의미로는 새로운 세력 또는 사조에 대해 탄압을 전제로 오도(유교)의 보존과 민족의 방위를 기약하려 했고, 사상적 의미로는 새로운 사상 또는 경향에 대해 거부하면서 기존 가치를 고수하려 한 탓으로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 한국사에 있어서 19세기라는 일대 전환기에 보수반동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내 논문으로 제기된 논쟁은 그 뒤에도 소장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보수적 관점이나 유신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척사위정론을 민족주의로, 진보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은 민족주의 관점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라졌다. 그 용어도 위정척사와 척사위정으로 구분되었다. 또 소장 학자인 연세대 김도형 교수는 북한의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까지 묶어 내 이론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춰 가장 객관적이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해주었다. 그 뒤 신용하 교수는 이 논문을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읽어야 할 논문 목록에 올리고 강독했으며, 이화여대 정외과에서도 진덕규·박충석 교수가 해마다 이 논문을 강독해주었다. 김정기 같은 소장들은 “당시 두 논문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어두운 구름을 헤치는 듯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고 찬탄해주기도 했다. 이와 달리 유승국 교수는 유학과 학생들에게 “빨갱이 논문은 인용하지 말라”며 아예 목록에서 삭제시켰다. 어쨌거나 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뒤 역사학계의 인정을 받았고, 국외자의 위치에서 진보학계에 입문한 셈이다.
이 무렵 나는 친구인 김용환과 함께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식견이 많고 날카로운 비평안을 지닌 지식인이었는데 내 여러 글을 읽어보고 자세한 평을 곁들인 조언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나는 신문이나 월간 잡지에 한국사 관련 글을 쓰며 집필가로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는 두어 가지 다짐을 했다. 무엇보다 한국사 관련 글만 쓰기로 결심했다.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는 뜻이었다. 또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논문만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한국사 소재 교양서를 써보기로 했다. 당시 이른바 순수학문을 한다고 표방한 인사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쓰는 글을 ‘잡문’이라 해서 쓰지 않는 것을 품위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교수’ 같은 전문 직업을 갖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원고료나 인세로 살아가야만 했으니 대중을 위한 글을 쓰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었다.
이런 속에서 76년 월간지 <뿌리깊은나무>가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광고 동창 한창기가 발행인, 후배 윤구병이 주간을 맡아 순한글 잡지로 꾸려 나갔다. 나는 고정 필자로 뽑혀 한국사 관련 글을 연재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편집부 기자들이 내 원고만 보면 단어와 문장을 한글 투로 마구 뜯어고쳤다. ‘이동했다’를 ‘옮겼다’라거나 ‘공헌했다’를 ‘이바지했다’로 고치는 따위였다. 나는 뜻이 변질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에 동의했다. 편집진과 나는 아무 마찰이 없었으나 많은 글쟁이들은 자주 마찰을 빚었다. 이 잡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당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신동아>나 <여성동아>를 능가하는 부수를 자랑했다. 독자층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었다.
<월간중앙>에도 76년 7월호부터 ‘한국의 파벌’을 연재했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애초 <중앙일보> 문화부에서 학술 담당을 하던 방인철 기자가 <월간중앙>으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장기 연재를 하자고 제의해서 시작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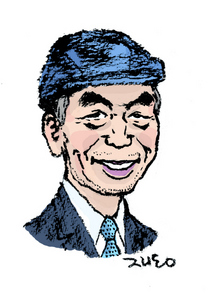 당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역사 관련 번역원고의 교열을 담당하던 조국원 선생은 당파·문벌 등의 계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 영호남의 지역갈등이나 파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조 선생을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는 아는 대로 차근차근 일러주었는데 다른 동료들은 이를 시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파·지벌·문벌·학벌 등으로 나누어 꼬박 1년간 연재한 ‘한국의 파벌’은 제법 인기를 끌었고, 당시 양아무개 주간은 그 덕분에 부수가 늘어났다고 고마워하기도 했다.
이이화 역사학자
당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역사 관련 번역원고의 교열을 담당하던 조국원 선생은 당파·문벌 등의 계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 영호남의 지역갈등이나 파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조 선생을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는 아는 대로 차근차근 일러주었는데 다른 동료들은 이를 시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파·지벌·문벌·학벌 등으로 나누어 꼬박 1년간 연재한 ‘한국의 파벌’은 제법 인기를 끌었고, 당시 양아무개 주간은 그 덕분에 부수가 늘어났다고 고마워하기도 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