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역사문제연구소의 신년하례회에서 김진균 당시 서울대 교수이자 참교육시민모임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등을 지내며 진보이론가이자 실천가로 활약했던 김 교수는 이듬해 암 진단을 받고 2004년 작고했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53
1989년 서울 필동 새사옥 시절부터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신년하례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례의 날에는 연구원 등 식구들은 물론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그리고 <역사비평> 필자들이 모두 참석했고, 훗날엔 한국사 교실 강좌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조직된 ‘바실모’ 회원들도 함께했다. 하례 때는 먼저 고사를 지내고 민주 실현과 학문 연구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재미있는 축문을 낭독한 뒤 돼지머리를 향해 절을 올렸다. 절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나 봉투를 돼지 입에 꽂는 게 관례였다.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고사 경비를 너끈히 뽑곤 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송건호·이효재·유인호·김진균·성대경·강만길·조동걸·리영희·김남식·박현서·이우성·이만열 등이, 연구위원으로는 강정구·심지연·안병욱·박호성·임형택·김시업·박석무·송재소·유초하·홍순권 등이 자주 참석했다. 재미 삼아 벌인 하례 행사가 끝나면 떡과 소주·맥주를 놓고 환담을 즐겼다. 이어 사무실 아래에 있는 ‘베를린호프’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뒤풀이를 했다. 그사이 고인이 된 분도 여럿이니, 지금 생각해보면 목가적 추억처럼 아련하다.
그 무렵부터 역문연에서는 본격적인 대중강좌와 역사기행을 벌였다. 한국사 교실은 여러 주제를 정해 정기적으로 강좌를 했다. 고순정·김백일·이광연 등이 모범생으로 참여했고, 수강생끼리 미진한 내용을 보충하려 별도로 ‘바늘과 실’의 뜻을 딴 바실모를 꾸려 방계조직과 같은 구실을 했다. 초기에는 주제도 참신하고 청강생도 많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역사기행도 계절마다 그 전보다 확대해서 진행했다. 역문연 구성원들, 한문서당팀, 바실모 회원들이 중심으로 참여했다. 대형 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를 모았으나 때로는 인원이 넘치기도 했다. 주제가 있는 기행이어서 각자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교사·회사원·연구자 등 참여자들의 직업도 다양했다. 우리 식구를 비롯해 가족 단위로도 참가했다.
그때만 해도 강원도 강릉이나 홍천, 전라도 남쪽의 해남이나 강진, 경상도 남쪽의 진주나 하동이 목적지일 때는 편도로만 4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다. 그래서 차 안에서 먼저 참여자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으레 노래 부르며 여흥을 즐겼다. 그러면 자연스레 ‘운동권 가요’가 등장하기 마련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날이 오면’ ‘타는 목마름으로’ ‘아침이슬’ ‘불나비’ 그리고 ‘죽창’ 등이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참여자들은 그 시절 거리에서 한가락 하던 이들이었다.
특히 은행원인 김종익은 ‘죽창가’를 너무나 잘 불렀다. 내가 이 노래 듣기를 좋아해서 앙코르를 외치면 서슴없이 곡조를 뽑았다. 또 민중운동사 모임이나 한문강좌에 열성으로 참여했던 고려대 대학원의 조민(박사과정)과 박한용(석사과정)은 재미있는 얘기를 아주 잘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주 설득력 있게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술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특히 박한용은 사회를 맡기면 잘도 풀어갔지만 사회가 아닐 때도 민중가요를 불러가며 자연스럽게 모임을 이끌었다. 또 역문연 소장을 지낸 연세대 방기중(작고) 교수의 부인이자 연구자였던 이지원 교수는 가요든 유행가든 모두 잘 불러서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일행이 현지에 도착하면 늘 안내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지 주민이나 지역 대학의 전공 교수들도 있었다. 진주에서는 경상대의 김준형 교수, 김제에서는 원평의 최순식 선생, 고창에서는 문화원장인 이기화 선생 등이 맞아주었는데 삼남농민봉기나 동학농민혁명이나 정여립의 유적지, 선운사의 미륵상 등에 대해 구전·전설을 곁들여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다. 때로는 현지의 토속음식과 전통주를 맛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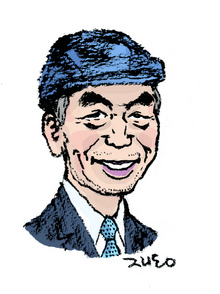 이렇게 1박2일의 기행을 다녀오면 역사 지식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참여자들은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했다. 역문연의 기행은 한길사 기행과 함께 ‘테마가 있는 기행’의 보기로서 80년대 우리 사회 기행문화를 한 단계 성숙하게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90년대에는 동학농민전쟁 기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1박2일의 기행을 다녀오면 역사 지식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참여자들은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했다. 역문연의 기행은 한길사 기행과 함께 ‘테마가 있는 기행’의 보기로서 80년대 우리 사회 기행문화를 한 단계 성숙하게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90년대에는 동학농민전쟁 기행으로 이어졌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