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북-중 국경선은 1962년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비밀리에 맺은 ‘베이징 국경조약’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백두산에 세워진 ‘경계비 4호’(왼쪽 사진). 70년 평양을 방문한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김 주석이 개고기를 접대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인민일보 보도)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60
이 대목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1962년 북한과 중국이 맺은 국경조약(조중변계조약)을 살펴보자.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는다’고 기록해 놓았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령이 되는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길림성 당국에서는 토문강을 도문강 곧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억지를 부렸고 여러 차례 조선 관리를 불러 강변했다. 하지만 조선의 감계사인 이중하 등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변했다. 그러자 1908년 청은 멋대로 백두산 정계비보다 훨씬 남쪽을 국경으로 가르고는 이듬해 일본과 간도신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리해서 삼지연 바로 위쪽까지가 국경선이 되었다. 일제는 그 대가로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개발권을 거머쥐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2년 들어 북과 중은 정식으로 국경조약을 맺었다. 그 결과 국경선 1369㎞를 확정했고 강 안의 섬과 모래섬은 육지와 가까운 곳과 거주 주민의 비율에 따라 각기 자국의 영토를 결정짓기로 하고 국경의 강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6개월 동안 실측 조사를 한 끝에 백두산 천지는 북한 영유 54.5%-중국 영유 45.5%로 갈랐고, 모두 451개의 섬은 중국 영유 187개-북한 영유 264개로 확정했는데 면적으로는 북한이 6배 정도를 확보한 셈이었다. 또 요소요소에 경계비(국계비)를 세우고 출입국 관리소는 15곳을 두게 했다.
당시 북과 중은 토문강 논쟁을 접어두고 두만강 상류로 국경을 확정했다. 압록강 발원지와 그 아래 협곡을 국경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사실 이 조약은 김일성과 저우언라이가 중심이 되어 맺은 비밀조약이었으나 그 사실은 현실로 나타났기에 문화대혁명 시기 이를 주선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초대 주석 주덕해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72년 베이징감옥에서 옥사했다. 이 조약에서 문제로 떠오른 것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한 부분이었고 백두산(천지)의 반쪽을 넘겨주었다는 비난(주로 남쪽)이 퍼부어졌다. 과연 그럴까? 적어도 엉터리였던 간도신협약에 따른 국경선은 아니었다는 것, 한국전쟁 때 중국군의 지원에 은혜를 갚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또 한가지 풀어볼 얘기가 있다. 백두산 답사 때 나는 젊은이들과 안내를 해준 동포들 앞에서 몇가지 얘기를 했다. 장백산을 우리 기록에서는 옛적부터 백두산이라 부른다는 것, <삼국유사>에 나오는 태백산(太伯山)이 바로 백두산을 가리킨다는 것, 우리 민족의 국조인 단군이 강림한 곳이라는 것, 1960년대 초기 백두산과 천지를 국경으로 갈랐다는 것,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의미를 주는 백두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백두산은 우리땅’이라 외치거나 펼침막에 ‘고구려는 우리땅’이라 쓰고 다니는 행위는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짚어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행동들이 되풀이되면서 2000년대 들어 기어코 중국이 ‘동북공정’을 들고 나오게 됐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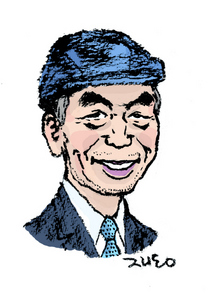
또 한가지, 나는 단군을 실체로 보지 않으나 초기 부족국가 시대 국가 형태를 갖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독립운동 시기에 단군이 민족사상의 정신적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때는 아직 동북공정 논란이 없던 까닭에 조선족 동포들도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귀국길에 마지막으로 상하이에 들르기로 했다. 나는 ‘상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황하에는 황토물이 넘실거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복작거렸으나 나는 그런 풍경을 감상하러 찾아온 게 아니었다. 상하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곳, 독립지사들의 발자취가 어린 곳,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던 곳이 아닌가?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또 한가지, 나는 단군을 실체로 보지 않으나 초기 부족국가 시대 국가 형태를 갖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독립운동 시기에 단군이 민족사상의 정신적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때는 아직 동북공정 논란이 없던 까닭에 조선족 동포들도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귀국길에 마지막으로 상하이에 들르기로 했다. 나는 ‘상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황하에는 황토물이 넘실거렸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복작거렸으나 나는 그런 풍경을 감상하러 찾아온 게 아니었다. 상하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곳, 독립지사들의 발자취가 어린 곳,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던 곳이 아닌가?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