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돌의 해를 맞아 첫번째 기념사업으로 2월26일 오후 전북 정읍 천변의 둔치에서 열린 ‘고부 봉기 역사맞이굿’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농민군과 관군의 전투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82
마침내 ‘동학 100돌’을 맞은 1994년, ‘동학농민전쟁 1백주년 기념사업단체 협의회’(동단협)는 지역단체와 손잡고 크게 세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첫째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으로 서막을 올렸다. 100년 전 그때, 고부봉기일에 맞춰 2월26일부터 이틀간 전북 정읍에서 첫 깃발을 올린 것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공동의장 염무웅 강연균)·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공동대표 한승헌 등 3명)·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대표 조광한)가 공동주관한 이 역사맞이굿에는 놀이패 한두레(서울), 극단 자갈치(부산), 극단 토박이(광주), 풍물패 살판, 고창 대산국교생 등 전국 각지의 문화패가 참여했다. 26일의 전야제 때는 정읍시내 일원에서 당시 동학농민군의 조련 모습을 재현하는 길놀이와 가장행렬을 했는데 전국에서 수만명이 몰려와서 지켜보았다.
개막열림굿을 비롯해 1948년 고창 명창대회에서 장원을 하며 이름을 얻은 공옥진의 창무극, 동학 관련 노래 모음 공연, 고부봉기를 재현한 마당극 공연 등도 펼쳐졌다. 전주 출신으로 당시 영화 <서편제>로 인기 절정이었던 배우 김명곤, 탤런트 유인촌 등 훗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유명인들도 특별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 정읍군 이평면 말목장터와 전봉준 장군의 고택, 고부초교 등지에서는 지신밟기와 제례의식, 말목장터 재현굿, 고부관아 재현굿, 거리굿, 대동굿 등이 이어졌는데 역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두번째 행사는 호남 농민군이 전북 부안 백산에서 총집결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한 날인 4월29일과 30일에 진행한 100돌 기념대회였다. 김도현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은 행사비 88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주선해 주었는데 이는 전례없는 일이었다. 전주시청 앞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북 도지사, 전주시장, 전북도 경찰국장 등 기관장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자 거리행진도 했는데, 특히 탐관오리의 징치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또 안숙선·김연 등 남도 명창 국악인들의 판소리로 흥을 돋워 한바탕 잔치판처럼 들썩였고 김용택·안도현 시인의 활기찬 시 낭송에는 학생들이 유달리 관심을 보였다.
세번째로는 10월29일과 30일에 충남 공주에서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예술제’를 진행했다. 공주는 작은 도시여서 참여 인원은 적었으나 행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초겨울에 이른 눈이 쌓인 속에서도 유족회원들이 앞장서 행렬을 이끌었다.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소동도 벌어졌다. 전주 행사에는 많은 기관장들이 참석해서인지 실무자들이 단상의 자리마다 이름표를 붙여 놓았다. 그런데 동단협 공동대표인 명노근 선생과 내가 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니 이름표가 보이지 않았다. 기관장 비서들이 자기 ‘상전’을 앉히려고 짐짓 떼버린 것이다. 명 선생이 내 귀에 대고 우리는 뒷자리에 앉자고 말해서 나는 웃으면서 뒤로 밀려났다. ‘상전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했다고나 할까.
또 공주의 기념식장에서는 현지 국회의원인 이아무개와 문화부 차관 김도현이 나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신 시절 민주인사를 고문했던 보안사 출신인 이아무개 의원은 축사에서 “농민군은 민중혁명을 추구했는데 이 정신을 이어 오늘에도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나는 체면을 보아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진풍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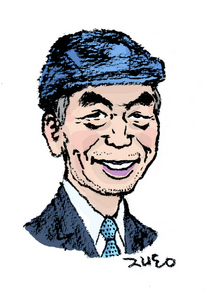 이들 동학 관련 단체의 행사나 모임 때면 나와 백추위에서는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격려사나 축사나 기념강연을 해주기도 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행사로 한창 분주하던 어느날 마침 우리 집에 와 계시던 장모님이 넌지시 내게 물었다. “자네, 요새 일감은 많이 들어오는가?” 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활할 만큼은 들어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나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내는 정도를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무렵 원고는 한 달에 원고지 100장 남짓만 썼다. 기념행사 때 강연 사례로 받은 쥐꼬리만한 강연료도 거의 현장에서 회비를 내거나 밥술을 사며 고스란히 쓰곤 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절이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들 동학 관련 단체의 행사나 모임 때면 나와 백추위에서는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격려사나 축사나 기념강연을 해주기도 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행사로 한창 분주하던 어느날 마침 우리 집에 와 계시던 장모님이 넌지시 내게 물었다. “자네, 요새 일감은 많이 들어오는가?” 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활할 만큼은 들어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나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내는 정도를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무렵 원고는 한 달에 원고지 100장 남짓만 썼다. 기념행사 때 강연 사례로 받은 쥐꼬리만한 강연료도 거의 현장에서 회비를 내거나 밥술을 사며 고스란히 쓰곤 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절이었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