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여름 중국기행에서 산시성 옌안 부근의 나가평촌을 방문한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의원들과 필자가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숙소였던 토굴 앞에서 함께했다. 왼쪽부터 정동영·신기남·이종걸·추미애·송영길·필자·임종석·천정배 의원.(위 사진) 1944년 당시 조선혁명군정학교의 항일 투사들이 토굴 앞에서 3·1운동 25돌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아래 사진)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92
2001년 여름 중국기행에 나선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소속 의원 일행을 이끌고 조선혁명군정학교 유적 답사에 나섰다. 나가평촌은 옌안 시내에서 교외로 10㎞쯤 벗어나 있었다. 생각보다 손쉽게 마을을 찾았다. 큰길에서 다리를 지나 조금 올라가니 언덕 아래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1937년생 왕계상(王啓祥) 노인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로는, 30여명이 들어와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가족은 데리고 오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은 군복을 입기도 하고 민간 옷을 입기도 했으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토마토를 심었고 주민들이 이를 본받아 지금도 토마토 농사를 짓는단다. 조선 사람들은 개고기를 잘 먹는 등 생활 풍습이 달랐으나 사이좋게 지냈는데 군사비밀을 지키고자 주민들이 군정학교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왕 노인은 뒤편 언덕의 토굴을 가리키며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일러주었다.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토굴은 두 개 정도였다. 한 토굴에는 중국인 가애화(53)가 살고 있었다. 토굴 안에 침대를 놓고 한쪽은 부엌으로 쓰고 있었는데 바깥은 찌는 더위인데도 서늘했다. 또 하나의 토굴은 돼지우리로 쓰고 있었다. 군정학교는 뒤편 산마루에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다고 해서 올라가 보지 않았다. 주민들도 당시 학교 건물에는 가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주민 장백당(71)은 이곳을 찾아왔던 국민대 조동걸 교수의 명함을 보여주며 해방 후 최초로 이 마을을 찾아온 조선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 일행은 두번째 방문한 셈이다.
마을 입구에는 조선군정학교를 소개하는 비석이 서 있었다. 1996년 옌안지구문물관리위원회에서 건립했는데 거기에는 교장 김백연, 부교장 박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백연은 바로 김두봉의 중국식 이름이었다. 필자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더불어 새삼 이들이 최후까지 일제에 항전했는데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거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싸우지 않았는가?
발길을 돌려 나오며 옌안에 스민 많은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이 정도나마 확인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일행들도 저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바른 정치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데 진시황릉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능 앞의 돌에 만리장성을 새겨 놓았는데 압록강 남쪽을 넘어 동해 쪽으로 끝까지 뻗어 있었다. 분명히 만리장성은 동쪽으로는 발해만 안쪽인 산하이관에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도 고려의 천리장성까지 포함해서 그린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판도를 넓히려는 의도가 아닐까? 아니면 무식의 소치일까? 이런 왜곡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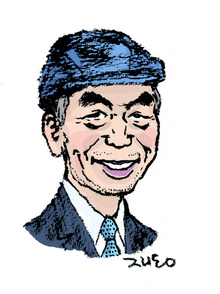 다음날 우리는 충칭에 도착했다. 청두, 우한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아궁이’라 불리는 충칭의 날씨는 견디기 어려운 더위였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기착지인 이곳의 청사를 돌아보려고 화로 속으로 찾아온 것이다. 임시정부 청사는 잘 꾸며져 있었다. 일제 침략군이 상하이와 난징을 공격하자 임시정부는 항저우~전장(진강)~창사(장사)~광둥~류저우~치장을 거쳐 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았고 해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정무를 보았다. 청사 건물은 언덕 아래 세 개의 건물로 짜여 있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보다 네댓배 정도 더 넓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의 배려로 세를 얻어 들었다 한다.
앞 오른쪽 건물에는 사진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다른 기념관에 비해 기록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해방을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건국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벌인 뒤 한마디씩 소감을 적어 놓은 큰 종이가 걸려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40년대 조국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의 유적을 찾아본 셈이다. 두 계열이 비록 노선은 달리했으나 조국 해방을 위한 마음은 하나이지 않았겠는가?
다음 상하이에 들러 윤봉길 의사의 유적과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다. 5박6일의 답사를 이렇게 마무리지으며 나는 초청 강사로서 피로가 쌓였으나 뿌듯한 보람도 느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득이 많은 여행이었다. 역사학자
다음날 우리는 충칭에 도착했다. 청두, 우한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아궁이’라 불리는 충칭의 날씨는 견디기 어려운 더위였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기착지인 이곳의 청사를 돌아보려고 화로 속으로 찾아온 것이다. 임시정부 청사는 잘 꾸며져 있었다. 일제 침략군이 상하이와 난징을 공격하자 임시정부는 항저우~전장(진강)~창사(장사)~광둥~류저우~치장을 거쳐 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았고 해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정무를 보았다. 청사 건물은 언덕 아래 세 개의 건물로 짜여 있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보다 네댓배 정도 더 넓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의 배려로 세를 얻어 들었다 한다.
앞 오른쪽 건물에는 사진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다른 기념관에 비해 기록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해방을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건국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벌인 뒤 한마디씩 소감을 적어 놓은 큰 종이가 걸려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40년대 조국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의 유적을 찾아본 셈이다. 두 계열이 비록 노선은 달리했으나 조국 해방을 위한 마음은 하나이지 않았겠는가?
다음 상하이에 들러 윤봉길 의사의 유적과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다. 5박6일의 답사를 이렇게 마무리지으며 나는 초청 강사로서 피로가 쌓였으나 뿌듯한 보람도 느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득이 많은 여행이었다. 역사학자
역사학자 이이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