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정민석의 해부하다 생긴 일
나는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 국사 과목이 싫었다. 사람과 숫자를 외우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누가 몇 년에 무엇을 했고, 또 누가 몇 년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외울 만했지만, 사람과 숫자는 도저히 외울 수 없었다. 그때 국사가 얼마나 싫었는지 방송에 나오는 역사극도 보기 싫었다.
의과대학 학생일 때에도 사람과 숫자를 외우느라 애먹었다. 병, 진단, 치료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았다. 이를테면 히르슈슈프룽(Hirschsprung)이 발견한 병은 히르슈슈프룽병이었다. “나는 날마다 보는 사람의 이름도 못 외우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외우란 말인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투덜거렸다. “히르슈슈프룽씨병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씨를 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의과대학에서는 외워야 할 숫자도 끊임없이 나왔다. 어느 약을 하루에 몇 그램씩 며칠 동안 먹어야 하고, 그러면 5년 생존율이 몇 퍼센트이고…. “숫자를 억지로 외우기도 힘들지만, 시험 치르고 나면 외운 숫자를 금방 잊어서 맥이 빠진다. 의사가 된 다음에 외워도 늦지 않을 텐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부학 선생이 되어서 알아챈 것이 있었다. 사람과 숫자는 시험 문제로 내기도 편하고 채점하기도 편하다는 것을. 적혈구에 관해서 쓰라고 문제 내면 정답이 여럿이지만, 적혈구의 지름을 쓰라고 문제 내면 정답이 하나뿐이었다. 특히 객관식 시험 문제는 사람과 숫자로 아주 편하게 낼 수 있었다. 나는 해부학 선생이 되었을 때 정의감이 가득하였기에 이렇게 다짐하였다. “나는 편하게 가르치려고 학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
다행히 해부학 용어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다. 유스타키오가 발견한 관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해부학 용어로는 귀관 또는 귀인두관이다. 귀에 있는 관 또는 귀와 인두를 잇는 관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을 잊어도 별명은 잊지 않는다. 이름과 달리 별명은 그 친구의 특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을 몰아낸 해부학 용어는 그 구조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외우기 쉽다.
해부학 선생이 나쁘게 마음먹으면, 숫자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각 기관의 크기, 무게에서 각 근육의 길이, 너비, 두께까지 숫자가 끝없이 나온다. 나는 이런 숫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해부학 책에 나오는 숫자도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말해서 학생을 안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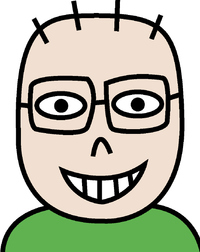 그래도 숫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 “모세혈관을 포함한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이다. 한 사람의 혈관이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다. 양쪽 허파의 허파꽈리 표면적을 더하면 150제곱방미터(45평)이다. 자기의 허파꽈리보다 좁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학생은 이 숫자를 보고, 사람 몸에 혈관과 허파꽈리가 많다고 이해하면 된다. 굳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외워야 할 숫자도 있다. “갈비뼈가 붙은 척추뼈를 등뼈라고 한다. 갈비뼈가 12쌍이므로 등뼈는 12개이다.” 이처럼 뜻있는 숫자 12는 외워야 하며, 시험에도 낸다. 그런데 뜻있는 숫자는 외우기 쉬워서 학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해부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선생과 학생은 다르게 생각한다.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깨닫는 과목으로 여기고, 학생은 자기가 배우는 과목을 외우는 과목으로 여긴다.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선생이 하기 나름이다. 즉 깨닫는 과목이 되게 하려면, 무턱대고 외우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빴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히 말한다. “국사 선생님과 의과대학 선생님은 이 글을 읽었습니까? 요즘에도 사람과 숫자를 외우게 합니까?”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그래도 숫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 “모세혈관을 포함한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이다. 한 사람의 혈관이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다. 양쪽 허파의 허파꽈리 표면적을 더하면 150제곱방미터(45평)이다. 자기의 허파꽈리보다 좁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학생은 이 숫자를 보고, 사람 몸에 혈관과 허파꽈리가 많다고 이해하면 된다. 굳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외워야 할 숫자도 있다. “갈비뼈가 붙은 척추뼈를 등뼈라고 한다. 갈비뼈가 12쌍이므로 등뼈는 12개이다.” 이처럼 뜻있는 숫자 12는 외워야 하며, 시험에도 낸다. 그런데 뜻있는 숫자는 외우기 쉬워서 학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해부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선생과 학생은 다르게 생각한다.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깨닫는 과목으로 여기고, 학생은 자기가 배우는 과목을 외우는 과목으로 여긴다.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선생이 하기 나름이다. 즉 깨닫는 과목이 되게 하려면, 무턱대고 외우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빴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히 말한다. “국사 선생님과 의과대학 선생님은 이 글을 읽었습니까? 요즘에도 사람과 숫자를 외우게 합니까?”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