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밭에 나가면 잘 자란 채소들이 방실방실 웃으며 우리를 맞는 듯했다. 보라색 뿌리가 화사한 콜라비. 신소윤 기자
어쩐지 마음이 느긋해졌다. 주말농장 누리집의 공지사항이 ‘가을 수확 작물 안내’에서 멈췄다. 땅도 농부도 쉬는 긴 겨울방학의 시작. 3평, 손바닥만한 텃밭이지만 생애 처음 누리는 농한기다.
기자란 무엇인가. 사전적 뜻만 보면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이다. 다른 훌륭한 기자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기자를 말할 땐 저기 어딘가에 ‘마감에 쫓겨’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그 뜻이 완성된다.
농사를 하면서도 때때로 ‘본캐’(본래 캐릭터)일 때와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 돌아서면 자라 있는 작물과 무성해진 잡초는 마치 기사 하나 마감하고 한숨 돌릴라치면 마주하는 산적한 일 더미와 같았다. 그런데 마감 노동이란 꽤 중독적이라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쓴 기사 한 꼭지 털고 마시는 맥주란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가. 작열하는 태양에 정수리가 타오르는 걸 느끼며 잡초를 쥐어뜯은 뒤, 말끔해진 밭을 봤을 때도 비슷한 쾌감을 느꼈던 것 같다. 지난해 난생처음 농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기시감이 들었던 건 아마도 자연이 재촉하는 마감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늘 쫓기며 사는 본캐 때문일까. 농사를 쉬고 있는 이 순간, 한가한 마음이 들면서도 무언가 다음 일을 도모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진짜 농부들은 농한기에도 바쁘다는데, 알량한 도시농부인 나는 주말농장 다음 계약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으니 이제 어쩐다. 베란다 텃밭을 열어볼까, 가정용 실내 식물 재배기를 들여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그냥 접어뒀다.
먼저 할 일이 있었다. 봄~가을 농사로 저장해놓은 것들을 긴 겨울 조금씩 꺼내 먹으며 지난 농사를 리뷰해보는 것. 지난해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져보며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지난해 농사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3평 텃밭을 함께 경작한 친구 케이(K)와 나의 한 줄 평은 “따뜻한 무관심”이다. 게으른 농부의 작태를 지나치게 포장한 것 아닌가 싶긴 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때때로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경험하지 않았나. 코로나19 이후 식물 기르기에 심취한 케이는 한두개로 시작한 화분을 1년 사이에 수십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식물을 하나만 기르는 것보다 여럿 기르는 게 더 잘 큰다던데 왜인지 알겠어. 화분이 몇개 없을 때는 만날 쳐다보면서 언제 크나, 얼마나 컸나, 안달복달하면서 물도 자주 주고, 그러다 뿌리가 썩어서 결국 망치게 되거든. 그런데 화분이 많아지면 돌봐야 할 게 많아서 과욕을 부릴 새가 없어.” 식물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물을 듬뿍 주는 것보다 때때로 물 주는 걸 잊고 흙을 말리는 게 오히려 식물에게 도움이 되더란 뜻이다.
더 확장해 아이를 기를 때도, 회사 생활로, 사적으로 엮이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한해 농사를 되돌아보며, 지난 2년 코로나19로 꼭 만날 사람만 만나며 지낸 협소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애정이랍시고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않았는지,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마음의 양식만 얻은 건 아니다. 좀 더 본질적인 양식들이 아직 냉장고에 쌓여 있다. 모종부터 김치까지 직행한 생애 첫 김장은 든든했고, 튼실한 셀러리로 만든 피클은 냉동 피자도 고급스럽게 만드는 빛나는 조연이다. 여름에 만들어 작은 통에 소분해 얼려둔 쑥갓 페스토는 재택근무 하다 급할 때 파스타에 비벼 먹고, 빵에 발라 먹곤 한다. 라면보다 빠르고, 배달 음식보다는 덜 처량하다.
따져보니 밭에선 얻은 것들뿐이다. 철없는 농부에겐 도대체 마이너스란 없다. 봄이 오기까지 한참 더 남았지만, 어서 빨리 흙을 만지고 싶다. 여리고 하찮은 새싹을 튼실하게 키워 올리며 마치 그게 다 내 덕인 양 의기양양해지고 싶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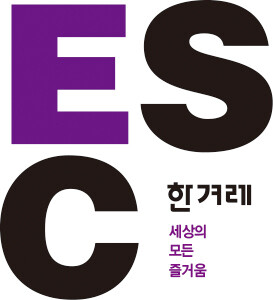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ESC] 초보 농부에게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ESC] 초보 농부에게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225/53_16457655662127_20220223504091.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