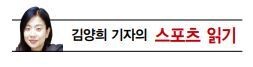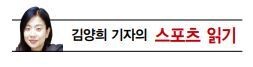초등학교 6학년 딸은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학교 체육 시간에 족구를 했단다. 그러면서 “우리 B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어!”라며 신났다. 다음날에는 럭비를 할 것이라며 “A조는 진짜 (개)사기야. 공 다 주고받은 다음 옆을 보면 A조 애들은 다 끝내고 자리에 앉아 놀고 있어”라고 구시렁댔다. A조에는 반에서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다고 했다. “그런데 C조에는 반장만 잘하는데 걔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인대를 다쳤다는 데도 혼자 펄펄 날아다녀.” 아이의 말은 끊이지 않았다.
딸은 체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 시간이 있는 날 아침이면 “오늘도 분명 족구를 할 거야”라면서 투덜댄다. 그런데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그날 체육 시간에 관해서만 얘기한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수업을 물으면 “괜찮았어”라고 단답형으로만 답한다.
체육이란 게 그렇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게 한다. 교실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의 뒤통수만 보다가 운동장(혹은 체육관)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나오면 오롯이 반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족구를 하든, 럭비를 하든 타인의 손끝, 발끝에 집중하게 된다. 세상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승패의 의미 또한 돌아보게 된다. 세상에는 절대 ‘글’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다.
팀 스포츠가 아이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이로울 수 있는지 조사 발표된 최근 논문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매트 호프만 운동학 박사 등이 6월 초 〈플로스 원〉 저널 온라인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농구, 축구 등 팀 스포츠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불안, 우울증, 사회성 및 주의력 결핍 징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만1000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9~13살)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됐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팀 스포츠를 한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와 비교해 불안 지수가 10%, 사회성 결핍 지수가 17%, 우울증 지수가 19% 낮았다. 흥미롭게도 팀 스포츠가 아닌 개인 스포츠를 하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불안 지수 등이 더 높게 나왔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줄리언 라고이 정신의학과 박사는 이에 대해 “팀 스포츠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점 중 하나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팀)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팀이 이기거나 지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하게 되니까 패배의 감정을 더 견딜 수 있고, 승리의 감정을 더 즐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포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팀 스포츠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이다.
‘학생 선수(엘리트 선수)는 학생인가, 선수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학습권’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간과된 게 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주장하면서 비 학생 선수(일반 학생)의 ‘운동권’은 외면한다. 운동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아닌 것일까.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빈곤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재 주당 2시간뿐인 고등학교 체육 시간마저 축소 움직임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whizzer4@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