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유로!
구멍가게 아이스크림 값이 아니다.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에서 팔리는 휴대폰 값이다. 11일 파리 시청 인근 백화점 베아슈베(BHV)의 이동전화 단말기 매장에는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인 1유로 짜리 ‘공짜폰’ 모델들이 수두룩했다.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사젬 같은 유럽 브랜드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명품 전략을 앞세운 한국 브랜드들도 1~9유로(약 1200원~1만원)에 팔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명품 전략을 상징했던 ‘블루블랙(D500)’도 출시 1년여가 지난 지금 119유로(약 14만원)에 팔린다.
세계 시장을 달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명품 전략’에도 최근 변화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저가폰 시장 공략을 지켜보는 태도였던 삼성전자가 최근 저가 시장 진입 채비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유럽지역 이동통신 책임자인 박주하 상무는 지난 9일 독일 하노버의 정보통신 전시회 ‘세빗’에서 “삼성은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저가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모토로라처럼 30~40달러 짜리 초저가 휴대폰보다는 다소 비싸고 몇가지 특별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들어 명품폰이나 고가폰 전략을 강조해왔던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한 변화다. 엘지전자는 이미 3주 전에 50~60달러의 저가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명품 전략이 싼 휴대폰을 찾는 인도 등 신흥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까닭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공짜폰 현상도 명품 전략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다. 공짜폰의 등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정책과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동전화 생산업체들의 납품가 인하 등에서 비롯했다. 실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자리잡은 프랑스 2위 통신사업자 에스에프아르(SFR) 대리점에서 만난 현지 직원 쟝 필립 라도는 “현재 19유로(2만2000원)의 가격표가 붙은 삼성 휴대폰을 지난해 프로모션 기간 중 한때 16상팀(30원)에 팔았다”면서 “휴대폰들의 싼 가격에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가 함께 기여한다”고 말했다. 대체로 출시 시점이 다소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삼성의 1년 반 전 모델은 통신사업자에 따라 1유로에서 199유로까지 팔린다. 이는 사업자들마다 시장 지배력이 달라 휴대폰 공급 업체와의 가격 협상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세계 이동전화 생산업계에서 부동의 1위인 노키아를 제치고 프랑스 휴대폰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시장조사 기관 지에프케이의 자료를 보면 삼성은 프리미엄 가격정책에 기반해 2005년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29.5%를 차지했다. 고가 전략인 탓에 수량 기준 시장점유율(21.2%)보다 비중이 더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주가 되겠지만 어차피 두 가지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파리/글·사진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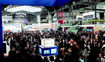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