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onomy |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보기
그래픽_김지야
1. TPA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상: 미국측은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와 달리 오는 6월말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협상 추진
2. 부분개정 전망: 이번 협상을 우리측은 개정협상, 미국측은 수정(modifications) 및 개정(amendments) 협상이라 부르고 양측은 전면개정보다 부분개정을 전망하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면개정 가능성도 언급
3. 미국측 관심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등 자동차 관련 모든 것
4. 우리측 관심사: 무역구제 남용 방지,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 메카니즘 조항 개선 등
5. 우리측 전략: 미국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개정수요를 발굴·제시하여 미국측의 개정범위의 축소·완화를 유도
6. 협상 난항 전망: 양측 모두 향후 이번 협상이 난항될 것으로 전망
7. 나프타 재협상 난항 중: 미국측은 NAFTA 재협상을 TPA하에 추진 중이나 최근 캐나다 당국자는 미국의 NAFTA 폐기를 확신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난항 중
이 중 ‘조약’은 연방헌법 2조에 의해 대통령이 체결하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상협정으로 국내에서 최고법 지위를 얻는다. 단 상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동으로 국내법이 되지 못하는 비자기집행조약(non-self-executing treaty)의 경우는 하원에서 이행법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상원 동의절차가 지연되거나 부결될 수 있고, 하원이 이행법률을 처리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의회 고유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 통상협정 체결이 더디어 지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반면 행정협정 중 ‘(순수)행정협정’은 의회개입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체결하는 것이라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협정 체결 및 이행 권한이 위임되는가를 둘러싸고 의회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조약부속행정협정’은 말 그대로 조약이 이행관련 세부사항을 행정협정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는 의회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별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행정부는 ‘조약’의 더딘 절차에, 의회는 ‘행정협정’의 대통령 권한에 각기 불만이 생겼다. 이에 양자의 요구를 절충한 의회와 행정부간 타협안인 ‘의회행정협정’ 이 만들어졌다. 즉 TPA하에서는 의회의 이행 절차가 일반적인 입법절차와 동일하게 하원과 상원 각각에서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대신 의회가 나머지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통상협정을 둘러싸고 권력을 나누게 된다. 2. 의회-행정협정, TPA의 역사적 기원과 작동 메카니즘 미국 의회는 연방헌법 1조 8절에 의거한 대외무역의 규제권한을 갖는 반면 대통령은 헌법 2조에 의거한 독점적인 협상권한을 갖는다(CRS, 2017). 얼핏 매우 모호한 역할분담인데, 이는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경우 좀 더 명쾌해 진다. 즉 미국에서는 조약이 자동으로 국내법 지위를 얻는 자기집행조약(self-executing treaty)과 그렇지 않은 비자기집행조약(non-self-executing treaty)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의회가 대통령의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국내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자기집행이 가능한 국내법이 되는데 이를 이행 절차라고 한다. 즉 협상은 행정부가 하되, 그 결과물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인 규제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34년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호혜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을 발효하기 전까지 150년간 대외무역의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은 미 의회의 역할이었다. 이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율 부과 관련 협상권은 수차례 연장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관세협정 체결 및 이행 권한은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상품 관세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서비스와 투자시장 자유화도 확대됨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무역장벽도 관세장벽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다. 배경으로 의회도 이전 대통령에 위임했던 협상권한의 대상을 후자에까지 확장하게 된다. 이는 비관세장벽이라는 기존 국내법의 철폐와 개정을 수반하는 커다란 변화를 뜻한다. 의회는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관세법 제정에서 이행법 체결로 변용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이행 과정에서 행정부가 애써 만든 협상결과를 의회가 바꾸거나 비준동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아울러 상하원 중 한 곳이 개정하면 나머지 한 곳에서 이를 개정 이전과 대조하며 수정하는 만만치 않은 일도 생기다 보니 왕왕 통상협상이 지체되게 된다. 결국 이 문제를 풀고자 1974년에 의회의 이행법 제정과정에서 행정부의 협상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1975년 1월 1일 처음 발효되었고 이후 1979년, 1988년, 2002년, 2015년에 4차례 연장되어 오늘에 이른다(1993년 단기 연장 1회). 이를 오늘날과 같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개명한 것은 2002년의 일이다. 현 TPA–2015는 2018년 7월 1일 만료된다. 만일 대통령이 연장을 원하면 동년 4월 1일까지 연장요청을 해 의회를 통과하면 2021년까지 연장된다. 1979년 이래 TPA 하에서 미국은 14건의 지역무역협정, 1건의 다자무역협정(WTO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양자간 FTA 중 이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FTA가 요르단과 맺은 것으로 이는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적고 논란의 소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주요 통상협정은 미-요르단 FTA를 제외하고 모두 TPA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은 발효된 FTA를 개정한 적이 있을까? 있다. 페루와의 무역촉진협정,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이후 미국은 노동(페루), 환경(콜롬비아) 조항 강화를 목적으로 재협상에 임해 개정의정서 형태로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입법조사처, 2017, 21p). 1994년 NAFTA 협상 발효 당시에는 이에 반발하는 의회에 승인조건으로 노동과 환경에 대한 부속협정(side agreement) 체결을 약속하여 각각 1994년 별도로 발효했으나 이는 FTA와 별개조약 형태로 간주되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입법조사처, 2017: 22~23pp). 즉 기발효 FTA를 개정한 적은 있으되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부속협정에 한해 개정했을 뿐이다. 이처럼 TPA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통상협정의 입법 관할권을 둘러싼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TPA에서 의회와 행정부간 권력분립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TPA 찬성론자는 이 덕분에 미 행정부와 서명한 협상결과가 미 의회에서 개정될 것을 우려하는 통상협상 상대국을 안심시켜 신속한 협상이 가능했다고 반긴다. 반면 TPA 회의론자는 통상협정이 점차 복잡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 이행법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타 입법절차와 같이 협상결과도 의회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념할 점은, TPA하에서도 의회는 여전히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단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TPA하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협상개시 90일 전, 협정서명 90일 전에 각각 의회에 그 의향을 통보하며, 서명 180일 전에 무역구제법 변경 여부 등을 통보하고, 서명 60일전에 협정문 공개, 서명 통보후 30일 내에 의회에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지닌다. 서명 후에도 105일간, 이행법이 제출된 후에도 최대 90일간 각 단계별로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비로소 의회는 일정기한 내에 행정부가 서명한 협정의 승인 또는 부결만 하고 협정문의 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TPA 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협상 목표를 주문하는데 이는 TPA 연장 때마다 그 때 그 때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진화해 왔다. 예컨대 TPA-2015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협상목표가 추가되었고 ‘전체 목표(overall objectives)’, ‘세부 목표(principal objectives)’, ‘상대국 역량강화 등(capacity building and other priorities)’의 세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3. 한미 FTA 개정협상의 미국내 절차와 협상전략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TPA의 역사적 기원 및 변천과정과 작동 메카니즘을 간략히 살펴봤다. 좀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나 최소한 이 정도 이해해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전망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제 2018년 시점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를 환기해 보자. 모두에서 언급한 일곱 개의 팩트 중 1번(TPA와 무관한 협상)과 2번(부분개정 전망)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들을 맞추면 얼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TPA 없이 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도, 한국경제연구소(KEI)의 선임 디렉터 트로이 스탠게론(Troy Stangarone)도 지적하듯 과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발효된 FTA을 개정하는 것은 한국을 위시해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미국의 경우 TPA를 거치지 않고 경제적 파장이 큰 FTA 개정에 나서는 것은 1934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그로 인해 여차하면 트럼프는 지난 1934년 이래 의회와 행정부간의 불안한 권력분점상태를 깨뜨려 분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상원위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블룸버그 1월6일자 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제치고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투명성을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는 또 2018년 1월 9일자 법률전문지 Law360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TPA를 거치지 않아 나프타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한미 FTA 개정협상이 ‘깜깜이 협상’이 되었다며 미 행정부가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TPA에 의거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보인다. Law360는 위 기사에서 그 이유를 행정부가 한국에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TPA를 밟아 협정문을 개정해봐야 실익이 별로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게 아닐까 유추해 본다. 또한 TPA 시한이 6월말이라 그 전에 NAFTA와 한미 FTA를 동시 추진하는 것은 버거워 후자의 속전속결을 원하되 여차하면 TPA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TPA 없는 본 협상의 전 과정에서 미국내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곧 우리측 요구사항의 수위 및 범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협상전략 수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술한 미국의 국제협정 유형 네 가지를 상기해 보자면, 이 중 미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의회-행정협정 즉 TPA를 제외한 세 개가 유력하다. 미국이 TPA 없는 한미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협상권한을 갖고 유의미한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나프타 재협상 수준의 요구조건을 한국에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공세가 아닌 수세에 처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Nicole Bivens Collinson(2017: 9p)는 나프타와 한미 FTA의 미국내 절차가 상이함을 다음의 표에서 잘 보여준다. 즉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 행정부가 이론적으로 개정 재량권은 발휘할 수 있으되 이렇게 되면 의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의회내 개정을 수반할 정도로 개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한 의회와의 길항작용 속에서 절차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난제를 지닌 조약을 피하려고 지금의 TPA를 만들었는데 애써 이를 다시 겪을 유인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는 거의 없다. 바꿔 말하면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의회통과가 필요할 정도로 자국 관련 협정문을 개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NAFTA vs 한미FTA 개정 절차
출처: Nicole Bivens Collinson(2017), Trade Policy: NAFTA Renegotiation & FTA Developments, Nov. 9, 2017,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국가분쟁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무역조약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을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등의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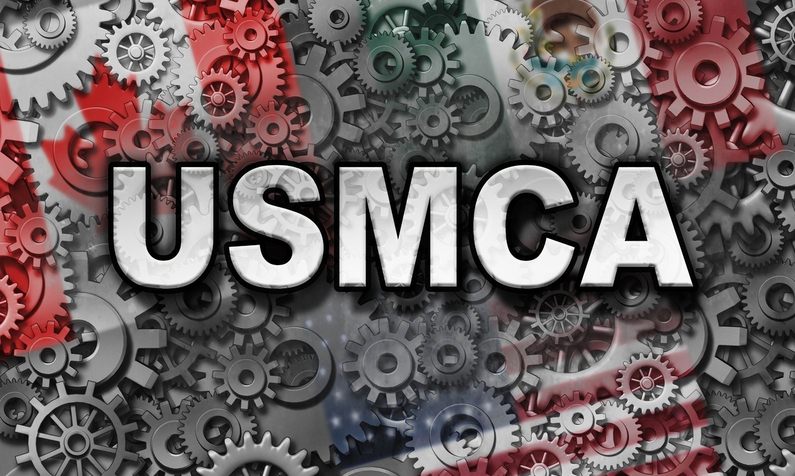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