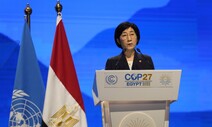2017년 9월 파키스탄에 쏟아진 폭우로 카라치 시내에서 시민들이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홍수가 잦아져 올해 여름에는 1700명 이상이 숨지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EPA/연합뉴스
마자 후세인 버하미(22)는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파키스탄에 사는 이 청년은 대학원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홍수가 덮친 후 그의 책은 젖어 못 쓰게 되었다. 수십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강둑이 무너졌고 성난 물살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먹을거리와 세간살이를 챙긴 그는 몇 시간 만에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파키스탄 국토 3분의 1이 이렇게 잠겼다. 젊은 청년의 꿈은 앞으로 기약이 없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여름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를 전하며, 이 나라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선진국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협상 그룹에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6일 개막한 기후변화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보상’(loss and damage)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파키스탄 홍수처럼 갑자기 닥친 재난에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후변화협약 틀 안에서는 주로 인도적 지원이나 나중에 갚아야 하는 자금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값싼 화석연료로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은 파키스탄 등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손실과 보상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부르키나파소의 대표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지난 9월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를 위해 1억30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이슈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수석 기후대사인 무니르 아크람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지난 150년간의 선진국의 (화석연료 남용) 정책 때문에 개도국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기후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저개발국가에 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과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다. 미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손실과 보상’이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인도와 바누아투 등 개도국들은 손실과 보상 기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니르 아크람 대사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을 바꾸길 꺼리는 글로벌 노스(선진국)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4% 미만을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 홍수에서 1700명 이상 숨지고 200만명이 집을 잃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