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
[난이도 수준-고2~고3] 36. ‘아메리칸드림’ 대 ‘유러피언드림’ 성공과 공생의 이중주
37. 주관적인 과학과 객관적인 예술은 가능할까? - ‘통섭’에게 묻다.
38. “나는 왜 나쁜 습관을 못 버릴까?” 프로이트에게 묻는다면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유동범 옮김.인디북 <통섭>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장대익 옮김.사이언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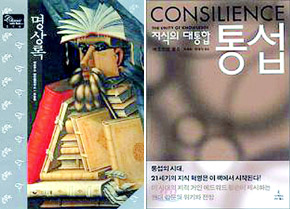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의 황제였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소리 지르며 슬퍼하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자신을 다독였을 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가? 그러면 신에게 ‘죽은 아이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직,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라고만 물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이란 연극과 같다고 했다. 연극에서는 왕 역할을 하는 배우도, 노예 역을 맡은 배우도 있다. 노예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충 연기해도 될까? 사람들은 단지 왕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를 우러러보지는 않는다. 노예를 연기해도 최선을 다하면 박수가 쏟아지는 법이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무리 없는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했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주의 섭리(攝理, Logos)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겠다. 나아가, 우리는 우주가 이루어지는 대로 삶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 자연 탐구는 인생의 정답을 알아내는 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세상에는 신의 뜻을 담은 책이 두 권 있다고 믿었다. 하나는 성경(Book of Bible)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Book of Nature)이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성경에서 신의 섭리를 깨치려 하듯, 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똑같은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생각했다. 우주의 움직임을 살피던 코페르니쿠스도,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신의 뜻을 깨치려고 노력했던 셈이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책’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심지어 다윈은 인간은 좀더 나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세월이 갈수록, 과학과 도덕윤리, 신앙은 곳곳에서 부딪히며 갈등을 낳았다.
마침내 세상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서로 다른 분야로 여기게 되었다. 도덕윤리, 신, 종교 등을 살피는 연구는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 탐구와는 완전히 다른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다시 연결 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consilience)을 내세운다. 그가 말하는 통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여러 문제를 자연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학은 살림살이를 가꾸는 방법을 일러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못하다. 경제 흐름을 제대로 짚으려면 인간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 살림살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는 학문은 무엇일까? 심리학이다.
심리학은 생물학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예전에는 정신이 이상한 자들을 대화로 고치려 했다. 지금은 두뇌 엠아르아이(MRI) 사진을 찍으며 감기약 짓듯 정신과 약을 처방하곤 한다. 경제학의 뿌리가 두뇌를 연구하는 생물학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또한 심리학이 제대로 되려면 진화생물학의 연구도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유전적으로 갖추어진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잘 알고 있으면 마음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터다.
윌슨의 <통섭>에 따르면 예술도 객관적일 수 있을 듯하다. 두뇌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원리를 ‘객관적으로’ 밝힌다면, ‘예술 창작 공식(?)’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광고홍보 등의 연구물에는 두뇌생리학의 연구결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과학은 이제 인문학이 해결해준다고 믿었던 과제들에까지 해답을 주려 한다.
옛날에는 인문학이 자연과학이 풀어야 할 영역까지 달려들어 문제가 되곤 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예(禮)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미를 보는 족족 죽였단다. 어미 거미는 자기 뱃속에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속살을 갉아먹고 세상에 나온다.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선비들에게 거미는 세상의 몹쓸 곤충이었을 테다. 그러나 거미에 대한 이런 ‘인문학’ 평가가 과연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
반면 자연과학이 인문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치주의자들은 우생학(優生學)을 내세워 유대인과 집시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나치는 인간 세계에서도 열등한 민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과학적’인 연구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 앞에 양심적인 논리들은 꼬리를 내렸다.
물론 나치가 앞세웠던 우생학은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은 생각만큼 객관적이지 않다. 동물성 지방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영어 조기 교육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등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시시때때로 뒤집어지지 않던가.
생활 속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느덧 ‘옳고 이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학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설명은 되레 위험하다.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윌슨의 <통섭>이 인문학자들에게 결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까닭이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의 황제였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소리 지르며 슬퍼하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자신을 다독였을 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가? 그러면 신에게 ‘죽은 아이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직,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라고만 물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이란 연극과 같다고 했다. 연극에서는 왕 역할을 하는 배우도, 노예 역을 맡은 배우도 있다. 노예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충 연기해도 될까? 사람들은 단지 왕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를 우러러보지는 않는다. 노예를 연기해도 최선을 다하면 박수가 쏟아지는 법이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무리 없는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했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주의 섭리(攝理, Logos)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겠다. 나아가, 우리는 우주가 이루어지는 대로 삶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들에게 자연 탐구는 인생의 정답을 알아내는 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세상에는 신의 뜻을 담은 책이 두 권 있다고 믿었다. 하나는 성경(Book of Bible)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Book of Nature)이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성경에서 신의 섭리를 깨치려 하듯, 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똑같은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생각했다. 우주의 움직임을 살피던 코페르니쿠스도,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신의 뜻을 깨치려고 노력했던 셈이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책’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심지어 다윈은 인간은 좀더 나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세월이 갈수록, 과학과 도덕윤리, 신앙은 곳곳에서 부딪히며 갈등을 낳았다.
마침내 세상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서로 다른 분야로 여기게 되었다. 도덕윤리, 신, 종교 등을 살피는 연구는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 탐구와는 완전히 다른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다시 연결 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consilience)을 내세운다. 그가 말하는 통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여러 문제를 자연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학은 살림살이를 가꾸는 방법을 일러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못하다. 경제 흐름을 제대로 짚으려면 인간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 살림살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는 학문은 무엇일까? 심리학이다.
심리학은 생물학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예전에는 정신이 이상한 자들을 대화로 고치려 했다. 지금은 두뇌 엠아르아이(MRI) 사진을 찍으며 감기약 짓듯 정신과 약을 처방하곤 한다. 경제학의 뿌리가 두뇌를 연구하는 생물학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또한 심리학이 제대로 되려면 진화생물학의 연구도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유전적으로 갖추어진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잘 알고 있으면 마음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터다.
윌슨의 <통섭>에 따르면 예술도 객관적일 수 있을 듯하다. 두뇌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원리를 ‘객관적으로’ 밝힌다면, ‘예술 창작 공식(?)’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광고홍보 등의 연구물에는 두뇌생리학의 연구결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과학은 이제 인문학이 해결해준다고 믿었던 과제들에까지 해답을 주려 한다.
옛날에는 인문학이 자연과학이 풀어야 할 영역까지 달려들어 문제가 되곤 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예(禮)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미를 보는 족족 죽였단다. 어미 거미는 자기 뱃속에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속살을 갉아먹고 세상에 나온다.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선비들에게 거미는 세상의 몹쓸 곤충이었을 테다. 그러나 거미에 대한 이런 ‘인문학’ 평가가 과연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
반면 자연과학이 인문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치주의자들은 우생학(優生學)을 내세워 유대인과 집시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나치는 인간 세계에서도 열등한 민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과학적’인 연구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 앞에 양심적인 논리들은 꼬리를 내렸다.
물론 나치가 앞세웠던 우생학은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은 생각만큼 객관적이지 않다. 동물성 지방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영어 조기 교육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등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시시때때로 뒤집어지지 않던가.
생활 속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느덧 ‘옳고 이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학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설명은 되레 위험하다.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윌슨의 <통섭>이 인문학자들에게 결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까닭이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난이도 수준-고2~고3] 36. ‘아메리칸드림’ 대 ‘유러피언드림’ 성공과 공생의 이중주
37. 주관적인 과학과 객관적인 예술은 가능할까? - ‘통섭’에게 묻다.
38. “나는 왜 나쁜 습관을 못 버릴까?” 프로이트에게 묻는다면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유동범 옮김.인디북 <통섭>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장대익 옮김.사이언스북스
왼쪽부터 〈명상록〉, 〈통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