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난이도 수준-고2~고3] 46. 잡식동물의 딜레마, 튼실한 영혼을 만드는 건강한 식사법
47. 선현들의 독서법으로 진단한 문자문명의 위기
48. 절약은 왜 ‘경제의 적’이 되었을까? -쇼핑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책읽는 소리>정민 지음 마음산책,
<독서의 기술> 모티머 J. 애들러 지음, 민병덕 옮김 범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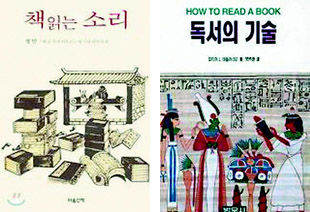 “사내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시인 두보(杜甫)의 말이다. 다섯 수레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 장자(莊子)가 지혜롭다고 여긴 친구가 갖고 있던 책이 꼭 그만큼이었다. 사실, ‘다섯 수레의 책’은 많은 분량이 아니다. 당시의 책은 대나무(竹簡)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아주 컸다. 다섯 수레에 가득 채웠다고 해도, 내용만 따지면 종이 책 몇 백 권 정도였을 테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은 평생 책을 오십 수레 넘게 읽는다. 학생 때 봤던 교과서만 쌓아도 수레 열 칸은 가득 채울 듯싶다. 어디 그뿐인가. 정보는 늘 차고 넘친다. 인터넷 등으로 한 달에 읽게 되는 지식의 양만 해도 다섯 수레는 넘을 듯싶다.
“사내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시인 두보(杜甫)의 말이다. 다섯 수레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 장자(莊子)가 지혜롭다고 여긴 친구가 갖고 있던 책이 꼭 그만큼이었다. 사실, ‘다섯 수레의 책’은 많은 분량이 아니다. 당시의 책은 대나무(竹簡)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아주 컸다. 다섯 수레에 가득 채웠다고 해도, 내용만 따지면 종이 책 몇 백 권 정도였을 테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은 평생 책을 오십 수레 넘게 읽는다. 학생 때 봤던 교과서만 쌓아도 수레 열 칸은 가득 채울 듯싶다. 어디 그뿐인가. 정보는 늘 차고 넘친다. 인터넷 등으로 한 달에 읽게 되는 지식의 양만 해도 다섯 수레는 넘을 듯싶다.
반면, 10년만 책을 읽으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고 믿던 시절도 있었다. <허생전>의 허생이 10년을 작정하고 책을 읽으려 했던 이유다. 장자 시대만 해도, 세상에 나왔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다섯 수레를 넘지 못했단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옛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해졌다고 보아야 할까? 이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옛사람들이 책을 읽는 목적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선비들은 성현들의 책을 소리 내어 읽곤 했다. 그것도 수백 번씩 되풀이해서 거듭 읽었다. 집집마다 읽은 횟수를 재는 서산(書算)이 있을 정도였다. 옛 조상들은 현명한 분들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야 ‘내 것’이 된다고 믿었다. 깊은 가르침이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마음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는 서양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천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에서는 리듬에 맞추어 책의 낱말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읽었다. 한마디로 독서의 목적은 인격을 다듬는 데 있었던 셈이다. 지금도 종교에는 불경, 성경 등의 종교 경전을 소리 내어 거듭 읽는 전통이 남아 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책을 많이 본 사람이 꼭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독서량으로 치자면 수험생과 고시생을 넘어설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입시와 출세를 위한 공부에 찌든 영혼이 튼실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겠는가. 꿰지 못하는 보배는 집 안만 어지럽히는 쓰레기 신세일 테다. 정보도 마찬가지다. 많은 정보보다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정보를 제대로 잡아내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다. 이 점에서 모티머 J.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은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애들러는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을 일러준다. 그는 책장을 넘기기 전에 먼저 ‘점검 독서’부터 하라고 말한다. 점검 독서란 책의 큰 틀을 훑어보는 일이다. 제목은 무엇인가? 광고 문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며 책을 가늠해 보라. 목차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지은이들은 목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책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목차만 확실하게 짚어도 책이 말하려는 바는 대충 들어올 테다. 다음은 마지막 2~3페이지를 읽어볼 차례다. 결론에는 책의 핵심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빠뜨리지 말고 책의 끝부분을 챙겨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훑었다면 다시 책의 주된 부분일 듯한 장(章) 몇 개를 추려 읽어본다. 책장에 코를 묻기 전에 하는 ‘점검 독서’의 과정은 이처럼 철저해야 한다. 점검 독서를 마쳤으면 내용의 줄기를 4~5줄 정도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혹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없다”며 한숨이 절로 튀어나오지 않는가? 그러면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아도 좋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자기표현으로 정리해 말하게 되는 법이다. 본격적인 책읽기는 ‘분석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읽기는 지은이와 나누는 대화와 같다. 왜 이런 주장을 펴는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곁다리 내용은 왜 소개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지며 읽어 보라. 책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하여, 둘 째 부분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중략) 또한,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한마디로 책의 전체를 철저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독자들은 애들러의 가르침이 당혹스럽기만 할 테다. ‘쿼터리즘’(Quarterism)은 요새 독자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무엇이건 읽는 시간이 15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읽어야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넘친다. 그러니 끈질기게 활자에 주의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15분은 생각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독자는 호기심에 끌려 휘둘리기만 할 뿐이다. 애들러가 일러주는 독서의 기술은 장황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독서기술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을 먼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알게 된 사실을 곱씹어보며,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곤 할 테다. 이 정도의 ‘지적(知的) 지구력’은 애들러처럼 우직하게 책을 읽지 않고서는 기르기 어렵다. 공자는 책을 묶는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거듭 읽었단다. 지혜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권의 책과 옹골차게 씨름해본 경험이 지혜의 싹을 틔운다. 정보 과잉의 시대, 선현들의 독서 충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난이도 수준-고2~고3] 46. 잡식동물의 딜레마, 튼실한 영혼을 만드는 건강한 식사법
47. 선현들의 독서법으로 진단한 문자문명의 위기
48. 절약은 왜 ‘경제의 적’이 되었을까? -쇼핑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책읽는 소리>정민 지음 마음산책,
<독서의 기술> 모티머 J. 애들러 지음, 민병덕 옮김 범우사
〈책읽는 소리〉 정민 지음, 마음산책, 〈독서의 기술〉 모티머 J. 애들러 지음, 민병덕 옮김, 범우사
반면, 10년만 책을 읽으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고 믿던 시절도 있었다. <허생전>의 허생이 10년을 작정하고 책을 읽으려 했던 이유다. 장자 시대만 해도, 세상에 나왔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다섯 수레를 넘지 못했단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옛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해졌다고 보아야 할까? 이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옛사람들이 책을 읽는 목적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선비들은 성현들의 책을 소리 내어 읽곤 했다. 그것도 수백 번씩 되풀이해서 거듭 읽었다. 집집마다 읽은 횟수를 재는 서산(書算)이 있을 정도였다. 옛 조상들은 현명한 분들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야 ‘내 것’이 된다고 믿었다. 깊은 가르침이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마음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는 서양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천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에서는 리듬에 맞추어 책의 낱말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읽었다. 한마디로 독서의 목적은 인격을 다듬는 데 있었던 셈이다. 지금도 종교에는 불경, 성경 등의 종교 경전을 소리 내어 거듭 읽는 전통이 남아 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책을 많이 본 사람이 꼭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독서량으로 치자면 수험생과 고시생을 넘어설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입시와 출세를 위한 공부에 찌든 영혼이 튼실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겠는가. 꿰지 못하는 보배는 집 안만 어지럽히는 쓰레기 신세일 테다. 정보도 마찬가지다. 많은 정보보다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정보를 제대로 잡아내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다. 이 점에서 모티머 J.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은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애들러는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을 일러준다. 그는 책장을 넘기기 전에 먼저 ‘점검 독서’부터 하라고 말한다. 점검 독서란 책의 큰 틀을 훑어보는 일이다. 제목은 무엇인가? 광고 문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며 책을 가늠해 보라. 목차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지은이들은 목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책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목차만 확실하게 짚어도 책이 말하려는 바는 대충 들어올 테다. 다음은 마지막 2~3페이지를 읽어볼 차례다. 결론에는 책의 핵심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빠뜨리지 말고 책의 끝부분을 챙겨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훑었다면 다시 책의 주된 부분일 듯한 장(章) 몇 개를 추려 읽어본다. 책장에 코를 묻기 전에 하는 ‘점검 독서’의 과정은 이처럼 철저해야 한다. 점검 독서를 마쳤으면 내용의 줄기를 4~5줄 정도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혹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없다”며 한숨이 절로 튀어나오지 않는가? 그러면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아도 좋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자기표현으로 정리해 말하게 되는 법이다. 본격적인 책읽기는 ‘분석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읽기는 지은이와 나누는 대화와 같다. 왜 이런 주장을 펴는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곁다리 내용은 왜 소개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지며 읽어 보라. 책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하여, 둘 째 부분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중략) 또한,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한마디로 책의 전체를 철저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독자들은 애들러의 가르침이 당혹스럽기만 할 테다. ‘쿼터리즘’(Quarterism)은 요새 독자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무엇이건 읽는 시간이 15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읽어야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넘친다. 그러니 끈질기게 활자에 주의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15분은 생각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독자는 호기심에 끌려 휘둘리기만 할 뿐이다. 애들러가 일러주는 독서의 기술은 장황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독서기술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을 먼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알게 된 사실을 곱씹어보며,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곤 할 테다. 이 정도의 ‘지적(知的) 지구력’은 애들러처럼 우직하게 책을 읽지 않고서는 기르기 어렵다. 공자는 책을 묶는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거듭 읽었단다. 지혜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권의 책과 옹골차게 씨름해본 경험이 지혜의 싹을 틔운다. 정보 과잉의 시대, 선현들의 독서 충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