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인문학 올드 앤 뉴/
[난이도 수준-고2~고3] 47. 선현들의 독서법으로 진단한 문자문명의 위기
48. 절약은 왜 ‘경제의 적’이 되었을까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49. 기계의 일과 인간의 일, 감정노동의 딜레마 옷장 안에는 옷들이 그득하다. 그런데도 늘 무엇을 입을지 마뜩잖기만 하다. 음식도 그렇다. 냉장고에는 냉동된 식품들이 한가득이지만,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하는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욕구는 새롭게 자꾸만 생겨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하지만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 까닭을 이렇게 풀어준다.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남들보다 잘살기를 바랄 뿐이다.” 욕심은 끝없이 자라는 나무와 같다. 사람은 등 뜨습고 배불러도 만족을 모른다. 살 만해지면, 살림살이가 기죽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생길 테다. 그러나 자신과 견주게 되는 ‘이웃’의 수준도 점점 올라간다. 처음에는 옆집, 옆 동네에 눈길을 주다가, 눈높이는 마침내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들 수준까지 나아가 버린다. 재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가난한가. 재벌들도 헛헛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늘 자기보다 잘 나가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왜 사람들은 만족을 모를까? 소비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이다. “신용은 존경받을 만하다는 뜻이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어른이라는 의미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주디스 러바인의 말이다. 자신감은 무엇을 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샘솟는다. 텅 빈 지갑에서 오는 불안감을 떠올리면, 러바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게다가 소비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다. 히피의 옷차림새, 깔끔한 정장, 찢어진 청바지 등등, 옷차림새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관심을 내비친다. 산악자전거, 절벽 타기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고 싶은가? 그러면 멋진 자전거와 몸에 딱 붙는 스포츠의류를 갖추어 보라. 마음은 어느덧 극한 운동을 좇는 사람 무리에 들어가 있다. SUV는 거친 산길을 달리기 위한 차다. 그러나 아스팔트만 줄곧 달리는 SUV들도 적지 않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도 끊지도 못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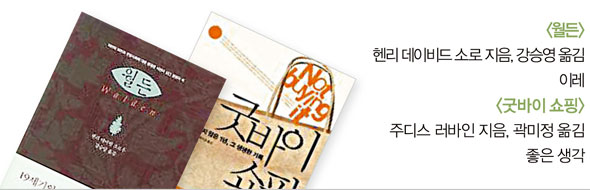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은 결국 탈이 나는 법이다. 색다른 소스와 조미료를 바라는 마음은 전쟁에까지 이어진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던지는 경고다. 황당한 듯해도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욕심은 점점 커나가기만 한다. 향수, 케이크를 알게 되면, 금방 더 좋은 향수, 더 많은 케이크를 바라기 마련이다. 필요를 채우려면 더 많은 땅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의 땅을 넘보는 일까지 생긴다. 소스와 조미료에 대한 욕심이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뺏으려는 전쟁에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다가는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9·11테러가 났을 때,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를 돕고 싶다면 이곳 뉴욕에 와서 돈을 쓰십시오.”
예전에는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려면’ 주머니를 풀라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탐욕과 과소비가 판을 칠 때 경제는 활기차게 돌아간다. 과연 허리띠를 늦추고 마음껏 호기를 부려도 아무 문제없을까?
이 물음에 선뜻 ‘그렇다’는 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읽어보자.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지었다. 그곳에서 그는 2년 2개월을 홀로 살았다. 소로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땀 흘려 해야 했다.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로만 살았던 셈이다.
우리는 과연 시장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비누에서 휴지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얻어야 하는 물품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소로는 ‘생활필수품’이란 거짓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생필품이란 너무 오랫동안 써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일 뿐이다. 신발 깔개가 없으면 풀잎에 신발을 문지르면 된다. 마른 풀짚은 이불만큼이나 훌륭한 덮을 거리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간단한 생활을 했다.” 욕구는 채워질수록 점점 커나가기만 한다. 뱃구레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음식을 바라게 될 테다. 커진 뱃구레를 가득 채우면 건강은 되레 나빠지기만 한다. 바람직한 해결은 식탐(食貪)을 다스려서 튀어나온 배를 집어넣는 데 있다.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생활의 필수품을 갖춘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생계를 해결했다면 욕심을 뛰어넘어 정신을 가꾸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힌두교 인들에게는 잘 갖추어진 ‘인생진도표’가 있다. 26살에서 50살까지는 ‘가주기’(家住期)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 이 시기에 힌두교인들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 모은다. 50살이 되면, 잘 닦여진 생계와 가정을 내려놓고 숲에 들어가 명상에 잠긴다. 이렇게 75살까지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는 임서기(林捿期)를 보낸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도는 경지, ‘산야신’(Sannyasin)에 이를 수 있다. 산야신들은 오직 탁발(동냥)로만 생활을 이어간다.
소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힌두교 문화를 비웃는다. 수천 년 동안 전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았다고 말이다. 하지만 힌두교인들의 문화는 수천 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들이 사는 곳의 자연과 환경도 변함이 없다.
지금의 소비문화는 어떤가? 지금처럼 하마같이 석유와 자원을 삼켜버리는 문화가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까? 현대 문명은 늘 ‘위기’ 상태이다. 욕망을 키워야만 버틸 수 있는 문화가 건강할 리 없다. 다스리지 못한 욕망은 재앙을 낳는다. 경제를 걱정하기에 앞서 한없이 커져만 가는 우리의 욕심부터 경계할 일이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은 결국 탈이 나는 법이다. 색다른 소스와 조미료를 바라는 마음은 전쟁에까지 이어진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던지는 경고다. 황당한 듯해도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욕심은 점점 커나가기만 한다. 향수, 케이크를 알게 되면, 금방 더 좋은 향수, 더 많은 케이크를 바라기 마련이다. 필요를 채우려면 더 많은 땅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의 땅을 넘보는 일까지 생긴다. 소스와 조미료에 대한 욕심이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뺏으려는 전쟁에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다가는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9·11테러가 났을 때,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를 돕고 싶다면 이곳 뉴욕에 와서 돈을 쓰십시오.”
예전에는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려면’ 주머니를 풀라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탐욕과 과소비가 판을 칠 때 경제는 활기차게 돌아간다. 과연 허리띠를 늦추고 마음껏 호기를 부려도 아무 문제없을까?
이 물음에 선뜻 ‘그렇다’는 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읽어보자.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지었다. 그곳에서 그는 2년 2개월을 홀로 살았다. 소로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땀 흘려 해야 했다.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로만 살았던 셈이다.
우리는 과연 시장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비누에서 휴지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얻어야 하는 물품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소로는 ‘생활필수품’이란 거짓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생필품이란 너무 오랫동안 써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일 뿐이다. 신발 깔개가 없으면 풀잎에 신발을 문지르면 된다. 마른 풀짚은 이불만큼이나 훌륭한 덮을 거리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간단한 생활을 했다.” 욕구는 채워질수록 점점 커나가기만 한다. 뱃구레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음식을 바라게 될 테다. 커진 뱃구레를 가득 채우면 건강은 되레 나빠지기만 한다. 바람직한 해결은 식탐(食貪)을 다스려서 튀어나온 배를 집어넣는 데 있다.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생활의 필수품을 갖춘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생계를 해결했다면 욕심을 뛰어넘어 정신을 가꾸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힌두교 인들에게는 잘 갖추어진 ‘인생진도표’가 있다. 26살에서 50살까지는 ‘가주기’(家住期)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 이 시기에 힌두교인들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 모은다. 50살이 되면, 잘 닦여진 생계와 가정을 내려놓고 숲에 들어가 명상에 잠긴다. 이렇게 75살까지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는 임서기(林捿期)를 보낸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도는 경지, ‘산야신’(Sannyasin)에 이를 수 있다. 산야신들은 오직 탁발(동냥)로만 생활을 이어간다.
소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힌두교 문화를 비웃는다. 수천 년 동안 전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았다고 말이다. 하지만 힌두교인들의 문화는 수천 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들이 사는 곳의 자연과 환경도 변함이 없다.
지금의 소비문화는 어떤가? 지금처럼 하마같이 석유와 자원을 삼켜버리는 문화가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까? 현대 문명은 늘 ‘위기’ 상태이다. 욕망을 키워야만 버틸 수 있는 문화가 건강할 리 없다. 다스리지 못한 욕망은 재앙을 낳는다. 경제를 걱정하기에 앞서 한없이 커져만 가는 우리의 욕심부터 경계할 일이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난이도 수준-고2~고3] 47. 선현들의 독서법으로 진단한 문자문명의 위기
48. 절약은 왜 ‘경제의 적’이 되었을까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49. 기계의 일과 인간의 일, 감정노동의 딜레마 옷장 안에는 옷들이 그득하다. 그런데도 늘 무엇을 입을지 마뜩잖기만 하다. 음식도 그렇다. 냉장고에는 냉동된 식품들이 한가득이지만,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하는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욕구는 새롭게 자꾸만 생겨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하지만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 까닭을 이렇게 풀어준다.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남들보다 잘살기를 바랄 뿐이다.” 욕심은 끝없이 자라는 나무와 같다. 사람은 등 뜨습고 배불러도 만족을 모른다. 살 만해지면, 살림살이가 기죽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생길 테다. 그러나 자신과 견주게 되는 ‘이웃’의 수준도 점점 올라간다. 처음에는 옆집, 옆 동네에 눈길을 주다가, 눈높이는 마침내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들 수준까지 나아가 버린다. 재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가난한가. 재벌들도 헛헛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늘 자기보다 잘 나가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왜 사람들은 만족을 모를까? 소비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이다. “신용은 존경받을 만하다는 뜻이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어른이라는 의미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주디스 러바인의 말이다. 자신감은 무엇을 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샘솟는다. 텅 빈 지갑에서 오는 불안감을 떠올리면, 러바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게다가 소비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다. 히피의 옷차림새, 깔끔한 정장, 찢어진 청바지 등등, 옷차림새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관심을 내비친다. 산악자전거, 절벽 타기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고 싶은가? 그러면 멋진 자전거와 몸에 딱 붙는 스포츠의류를 갖추어 보라. 마음은 어느덧 극한 운동을 좇는 사람 무리에 들어가 있다. SUV는 거친 산길을 달리기 위한 차다. 그러나 아스팔트만 줄곧 달리는 SUV들도 적지 않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도 끊지도 못하는 이유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