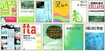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앞에 자리잡은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과 김동운 대표(위), 아래는 서점 내부 풍경. 박종식 기자anaki@hani.co.kr
삭풍에도 꿋꿋이 버텨준 마지막 인문서점
커버스토리 /
석과불식(碩果不食).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즐겨 쓰는 말이다. <주역>에 등장하는 이 말은 ‘씨과일은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세상 초록빛이 다 사라지고 삭풍한파만 몰아치는 곤궁하고도 험난한 때가 ‘석과불식’의 때이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마지막 씨앗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굶주린다고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내일을, 새 봄을 기약할 수 없다. 석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희망의 씨앗이다.
석과불식의 지혜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다. 인문적 가치, 다심 말해 인간적 가치가 상품가치에 패퇴당해 끝없이 벼랑으로 밀려나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씨과일과도 같은 운명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00여 곳에 이르렀던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사회변혁 전망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진군에 일대 타격을 받아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는 온 나라를 통틀어 대여섯 곳만이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다.
성균관대 앞의 풀무질, 건국대 앞의 인서점, 동국대 앞의 녹두 같은 서점들이 지난 시절의 영광을 흔적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서점들도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채 명맥만 지키고 있다. 수험서나 실용서를 팔지 않고 오직 인문사회과학 서적만으로 서가를 채운 곳은 ‘그날이 오면’뿐이다.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씨과일인 셈이다.
지난 1일 저녁 서울대 법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는 ‘그날이 오면’ 후원 행사로 신영복 교수의 강연회가 열렸다. ‘그날이 오면’ 후원회(회장 장경욱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가 ‘그날이 오면’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연 이날 강연회에는 250여명의 청중이 모였다.
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듬해 새싹으로 자라날 석과’의 뜻에 빗대 ‘그날이 오면’을 지키자고 말했다. ‘그날이 오면’을 지키는 것은 꿈을, 소망을,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날이 오면’은 첫 문을 연 1988년부터 치면 19년, 지금의 주인 김동운씨가 서점을 이어받은 1990년부터 치면 17년을 꿋꿋이 버텼다. ‘전야’를 비롯해 서울대 앞 다른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이 가을 낙엽처럼 흩어질 때도 김동운씨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날이 오면’은 진보와 희망의 거점이었다. 학생들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였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꿈꾸는 장소였다. ‘그날이 오면’이 가장 성황을 이루던 때는 1996년께였다고 한다. 월 매출액이 4500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여유로운 서점 운영이 가능했다. 10년 사이 매출액은 그때의 40% 아래로 떨어졌다. 책 종수로 치면 30% 미만이 되었다. 가장 먼저 온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학생들이 책을 사지 않게 되었고 취직을 걱정하며 입사 시험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의 급속한 퇴조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인터넷 서점은 책방을 찾던 남은 발길마저 돌려세웠다. 3년 전부터 ‘그날이 오면’은 극심한 운영 압박에 시달렸고 김동운씨는 한푼의 생활비도 집에 가져가지 못했다. 적자는 늘어가는데, 타개책은 보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생태운동가인 부인 유정희씨가 관악구의회 의원(무소속)으로서 적은 액수나마 활동비를 받아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지난 6월 지방의회선거에서 한나라당 싹쓸이 광풍이 불어 낙선하고 말았다. 월세 227만원에 서점 관리비만으로도 아득한 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몇 달씩 월세를 내지 못했고 1억5000만원이 넘는 빚은 이자만 불렸다. 지난 6월 말 ‘그날이 오면’ 후원회를 만들자는 작은 운동이 벌어진 건 이런 절박한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마지막 남은 씨앗마저 먹혀선 안 된다. 재학 시절 ‘그날이 오면’을 자주 찾았던 졸업생들과 ‘그날이 오면’을 아끼고 걱정하는 학부생·대학원생들 100여명이 모여 9월 말 발족식을 열었다. 적으면 5000원에서 많으면 10만원까지 매달 약정한 금액을 내기로 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한 달 100만원 정도가 이 서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서점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신영복 강연회를 연 것도 사정을 좀더 널리 알려 후원자를 구하자는 뜻이었다. 김동운씨는 “월세와 관리비만이라도 후원회에서 해결해준다면 어떻게든 서점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회에서 신영복 교수는 ‘엽락분본(葉落糞本)’이라는 말도 했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키우는 거름이 된다’는 뜻이다. 본(뿌리)이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인간적 가치고 그것을 밝히고 기르는 인문학적 가치며, 그 가치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날이 오면’과 같은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다. 신영복 교수의 강연은 낙엽이 쌓여 뿌리를 보호하고 그 뿌리에 영영분을 주듯이 작은 손길들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무를 키우는 낙엽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는 당부였다. 후원 문의 (02)885-8290.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듬해 새싹으로 자라날 석과’의 뜻에 빗대 ‘그날이 오면’을 지키자고 말했다. ‘그날이 오면’을 지키는 것은 꿈을, 소망을,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날이 오면’은 첫 문을 연 1988년부터 치면 19년, 지금의 주인 김동운씨가 서점을 이어받은 1990년부터 치면 17년을 꿋꿋이 버텼다. ‘전야’를 비롯해 서울대 앞 다른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이 가을 낙엽처럼 흩어질 때도 김동운씨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날이 오면’은 진보와 희망의 거점이었다. 학생들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였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꿈꾸는 장소였다. ‘그날이 오면’이 가장 성황을 이루던 때는 1996년께였다고 한다. 월 매출액이 4500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여유로운 서점 운영이 가능했다. 10년 사이 매출액은 그때의 40% 아래로 떨어졌다. 책 종수로 치면 30% 미만이 되었다. 가장 먼저 온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학생들이 책을 사지 않게 되었고 취직을 걱정하며 입사 시험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의 급속한 퇴조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인터넷 서점은 책방을 찾던 남은 발길마저 돌려세웠다. 3년 전부터 ‘그날이 오면’은 극심한 운영 압박에 시달렸고 김동운씨는 한푼의 생활비도 집에 가져가지 못했다. 적자는 늘어가는데, 타개책은 보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생태운동가인 부인 유정희씨가 관악구의회 의원(무소속)으로서 적은 액수나마 활동비를 받아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지난 6월 지방의회선거에서 한나라당 싹쓸이 광풍이 불어 낙선하고 말았다. 월세 227만원에 서점 관리비만으로도 아득한 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몇 달씩 월세를 내지 못했고 1억5000만원이 넘는 빚은 이자만 불렸다. 지난 6월 말 ‘그날이 오면’ 후원회를 만들자는 작은 운동이 벌어진 건 이런 절박한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마지막 남은 씨앗마저 먹혀선 안 된다. 재학 시절 ‘그날이 오면’을 자주 찾았던 졸업생들과 ‘그날이 오면’을 아끼고 걱정하는 학부생·대학원생들 100여명이 모여 9월 말 발족식을 열었다. 적으면 5000원에서 많으면 10만원까지 매달 약정한 금액을 내기로 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한 달 100만원 정도가 이 서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서점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신영복 강연회를 연 것도 사정을 좀더 널리 알려 후원자를 구하자는 뜻이었다. 김동운씨는 “월세와 관리비만이라도 후원회에서 해결해준다면 어떻게든 서점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회에서 신영복 교수는 ‘엽락분본(葉落糞本)’이라는 말도 했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키우는 거름이 된다’는 뜻이다. 본(뿌리)이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인간적 가치고 그것을 밝히고 기르는 인문학적 가치며, 그 가치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날이 오면’과 같은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다. 신영복 교수의 강연은 낙엽이 쌓여 뿌리를 보호하고 그 뿌리에 영영분을 주듯이 작은 손길들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무를 키우는 낙엽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는 당부였다. 후원 문의 (02)885-8290.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 |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