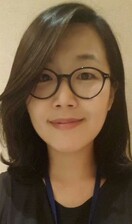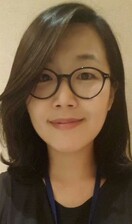이정애 ㅣ 국제뉴스팀장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오래전 영화 <포레스트 검프>(1994)를 다시 봤다. “도망쳐, 포레스트. 도망쳐.” 첫사랑 제니의 외침을 신호탄 삼아 미국 남부 숲길을 질주하는 소년 포레스트, 그 뒤를 쫓는 한 대의 트럭. 남들보다 살짝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레스트를 괴롭히던 백인 악당들이 몰던 그 트럭엔 ‘남부연합기’가 걸려 있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시시피주를 마지막으로 미국 50개 주 깃발에서 완전히 퇴출됐다는, 바로 그 문양이었다.
5월28일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로 시작하는 첫 문장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숨 쉴 수 없다”는 호소를 외면한 백인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에 전세계가 분노했다. 6월20일까지 내리 24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플로이드 사망 후속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그사이, 미국에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시위에 1500만~2600만명이 참가했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란 기록을 새로 썼다.
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 금지 및 경찰 폭력 근절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종을 넘어 성별, 국적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런 기세대로라면, 인종차별 완전 철폐의 새 세상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만 같았다.
늘 그렇듯 더 새로운 ‘뉴스’가 ‘뉴스’를 밀어낸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진위 공방,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사람들의 눈길이 몰려갔다. 그사이, 평화 시위 현장에선 총격 등 각종 사건·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시대적 맥락이 제거된, 무차별적 위인 동상 파괴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너무 과격하잖아.” 오랜 투쟁에 따라붙는 피로 섞인 탄식. 집회도, 관련 보도도 조금씩 줄어든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정치적 견해 표출”을 말라며 출연자들에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적힌 배지를 달지 못하게 했다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불의에 맞선 하나 된 함성 → 연대가 만들어낸 작은 승리 → 크고 작은 소음과 분쟁 → 열기가 식은 광장에 나부끼는 냉소와 환멸’이라는 순환 곡선 위, 미국은 또 세계는 어디쯤 있을까. 벌써부터 2011년 ‘월가 점령 시위’의 데자뷔를 예견하는 현자들이 보인다. 이번 시위도 단일한 목표와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뜨거웠던 ‘2020 여름날의 추억’으로 사그라들게 될까.
아직까진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더 큰 듯하다. 넉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진검승부처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낙관론의 불쏘시개다. 인종차별적 편 가르기로 일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 역사의 퇴행을 막고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 기대는 온당하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단박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인권운동으로 뜨거웠던 1960년대를 ‘지나간 역사’로 풀어낸 영화 <포레스트 검프>마저 26년의 세월이 흘러 ‘추억의 명화’가 됐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남부연합기 문양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미시시피주 깃발 속에 휘날렸다는 사실을 곱씹어본다. 그리고, 마침내 문양이 지워졌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더딘 변화를 불변과 혼동하지 않는 이성, ‘이러자고 촛불 들었나’ 쉽사리 탄식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가다 서다 할지언정 역사는 앞으로 간다고 꾸역꾸역 되새겨본다.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