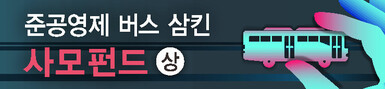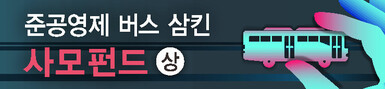인천의 한 차고지에 세워진 다른 버스회사 소속 버스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준공영제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18일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보유한 버스 대수만 1690대다. 서울 시내버스의 13%, 인천은 30%, 대전은 14%에 이른다. <한겨레>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을 통해 입수한 차파트너스의 사모펀드 투자 제안서를 보면, 차파트너스는 2024년 말까지 버스 대수를 5천대까지 늘리고, 서울의 버스회사도 13곳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차파트너스가 이렇게 버스회사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건, 2004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이윤 추구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승객 수와 무관하게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 게다가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직접비는 실비로 정산해주고, 타이어비와 정비비, 차량 보험료, 차고지비,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등 간접비는 전체 사업자의 평균치를 책정한 뒤 버스 1대당 지급한다. 이를 ‘표준운송원가’라고 한다. 버스회사와 버스 대수를 많이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로 간접비 비용을 쥐어짜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버스회사가 소유한 차고지도 무더기 인수의 이유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버스 차고지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점점 알짜배기 땅이 되고 있다. 버스회사를 사들인 뒤 차고지를 팔거나 민간 개발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밑천이 된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는 차고지가 없으면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차파트너스가 공영·민영 차고지를 빌린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고지를 팔아도 버스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상근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의 대표간사는 “
회사를 인수한 뒤 돈이 될 수 있는 건 모두 매각하고 필요한 건 임차해서 쓰는 ‘리스백’ 방식이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운송 원가 등을 협상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사 1표제로 운영되는 점도 무더기 인수의 이유가 된다.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가 많아지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입김이 커지게 되면서, 노선 감축과 회사 매각 등을 매개로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주식들을 다 잠식해 거대 조직이 돼, 우월한 협상력으로 파업·노선 조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라며 “관련 조례나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이에 인천은 최근 ‘준공영제 진입 뒤 일정 기간(5년) 재매각 금지’ 등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자의 책임 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윤숙진 인천시 버스기획팀장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너무 많이 인수해 지자체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여서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매각하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사모펀드가 특정 지역의 버스회사를 독점하면 더 이상 지자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며 “어느 선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